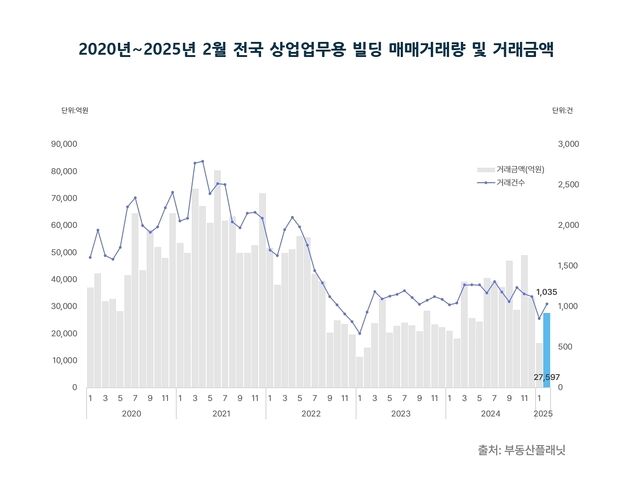(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는 등 최근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용하고 있는 싱크홀 담당 인력은 4개 팀, 12명에 불과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지반탐사 장비 또한 9대(도로용 차량 3대, 협소용 6대)에 불과해 매년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를 대비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 따라 굴착 깊이 10m 이상의 지하개발공사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도로나 노후지역에 대한 지반 공동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싱크홀 등 지하안전관리 사업을 전담하며, 지자체의 요청 시 지반공동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재해 탐사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요청 후 점검까지는 평균 22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지반침하 점검 여력이 없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점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 △울산 △대전 △전북 등 대다수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현행 제도의 한계도 꾸준히 지적됐다. 지하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GPR을 활용한 공동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어, 조사 주기 자체가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1회 이상 의무로 시행해야 하는 육안조사는 레이더를 활용한 조사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공동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지역별 육안조사(1만 8560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마저도 법이 시행된 2018년으로부터 5년을 앞둔 2022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한계가 뚜렷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새로 수립하며 향후 5년간의 지하안전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5년에 한 번 시행되던 GPR 공동 조사 빈도를 연 2회로 대폭 상향한다. 여기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 공동 조사 규모도 확대해 5년간 총 2만㎞에 달하는 구간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착공 후 GPR 탐사를 월 1회(기존 연 1회)로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사전 조사를 '낭비'가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닌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항상 뒷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의 규모를 키우고, 공동 조사 횟수도 늘려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결국은 마련된 특별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냐의 문제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GPR 기술 개발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방법이 없다"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에 재정을 투입해 지하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