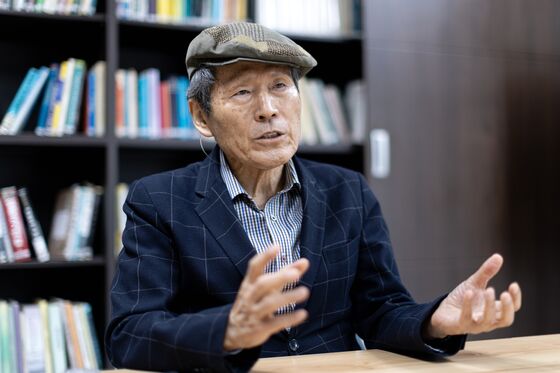(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5년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중국 시장이 트렌드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명과학 분야 기업들이 신흥 AI 분야와 중국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을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글로벌 헬스케어 AI 인수합병(M&A) 거래 가치는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대부분의 선두 기업은 AI 협력을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지난해에는 거래 건수에 있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AI 분야와 거래 건수를 보면 2020년 41건(50억 달러), 2021년 54건(164억 달러), 2022년 77건(155억 달러), 2023년 55건(139억 달러), 2024년 87건(136억 달러)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동안 AI 파트너십 및 인수가 급증한 것은 AI가 생명과학 기업에 제공하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최대 바이오 투자 심포지엄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도 트럼프 2.0 정책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회계컨설팅기업 언스트영(EY) CEO 신뢰 지수에 따르면 생명과학 분야의 CEO들은 인재 확보와 함께 AI를 포함한 신흥 기술을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큰 파괴적 혁신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AI 기업 또는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진단 AI 솔루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루닛(328130)은 자사가 개발한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가 전 세계 의료기관 3800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루닛은 지난해 글로벌 유방암 검진 플랫폼 기업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합병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남미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유로파마(Eurofarma)와 미국 내 조인트 벤처(JV)를 설립해 북미 시장에서 AI 기반 뇌전증 관리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 AI 1호 상장기업 제이엘케이(322510)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가 개발한 의료 AI 허브 플랫폼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병리 전문 기업 딥바이오도 지난해 전립선암 AI 분석 솔루션인 딥디엑스 프로스테이트(DeepDx Prostate)를 선보이며 FDA 인허가 없이 '클리아 랩'(CLIA Lab)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은 AI 성과 예측 솔루션 기업 아이디바인과 신약 개발 임상 개발 차별화를 위한 AI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텍뿐 아니라 전통 제약사인 대웅제약도 올해 신년 계획 발표를 통해 AI의 발전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의약품 중심 치료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포괄적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AI와 함께 올해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이 주목하는 분야는 중국 시장이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평가를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 속 활발한 M&A와 중국 바이오텍의 기술 거래 증가가 예고된다"며 "중국에 기술을 이전한 국내사의 제3자 기술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제약시장은 올해까지 연평균 7% 성장률을 기록하며 33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 단위 산업정책인 '헬시 차이나 2030'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로슈,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 중국 기업 간 거래도 증가 추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 그라셀 바이오텍(Gracell Biotech)을 인수하는데 12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글로벌 다국적제약사가 혁신 중국기업을 인수한 최초 사례로 꼽힌다.
바이오협회는 다만 "새로운 중국 생명과학 혁신 경제의 성장에 대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미국에서 추진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으로, 이는 기업이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며 "2025년 미국 신정부에서도 생명과학 업계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백현동 발언' 처벌 못해…골프 사진 조작"](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5/3/26/7201545/no_water.jpg/dims/crop/560x560/quality/80/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