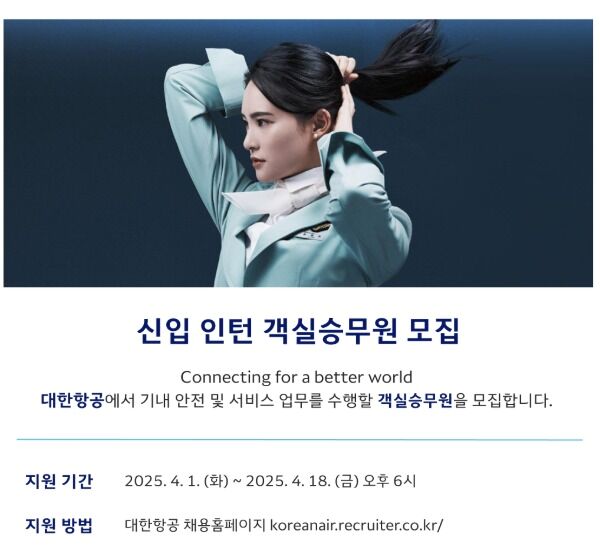(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법원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자동차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자 업계와 법조계는 해당 판결이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수입차 관세와 중국 전기차 추격으로 국내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불법 파업이 만연해질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을 가속할 것이란 지적이다.
2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생산 경쟁력 향상 과제'를 주제로 산학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민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손실 회복 노력을 가해자의 손해배상 면책 사유로 인정했다"며 이마저도 "법원이 노조 측의 얘기만 듣고 파업 이후 생산을 통해 손실 회복이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서 흔히 사용했던 게 기업의 고정비였는데 일부 인정이 안 됐다"며 앞으로 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해선 "자동차별 마진이 얼마인지 등 기업의 영업 비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파업행위로 비롯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속노조 지회는 2010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약 한 달간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을 멈춰 세웠다.
법원은 해당 기간 초래된 매출 감소 및 고정 비용은 파업 이후 기업이 추가 생산을 통해 회복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노조원들은 해당 점거를 포함해 여러 차례 공장을 점거한 혐의로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고정비용은 헛되이 소모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가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불법 쟁의행위의 손해를 피해자가 만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한 손해를 없애지 못한다"며 "불법행위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한 노력이 불법 행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국내 생산 여건 악화로 주요 기업들은 추가적인 공장 건설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 자동차 생산 순위는 2022년 5위에서 지난해 7위로 하락했다"고 짚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면책 판결이 불법 파업 확산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