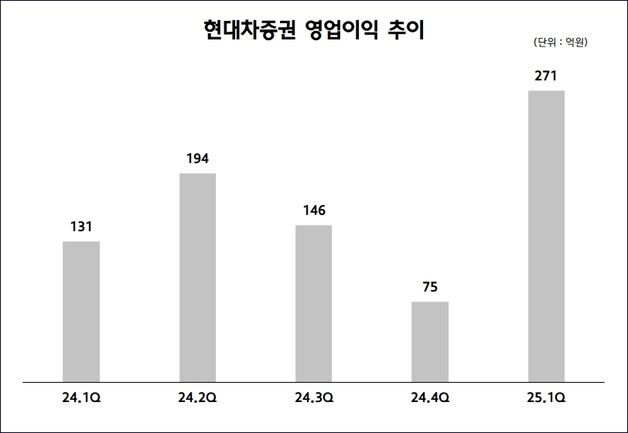(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상호관세 정책에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 투자자 매도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만 보고 있다. 투자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의 양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 국채 안정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15일 금융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7일 3.83%에서 8일 장중 4.2%까지 뛰더니 9일 4.47%까지 상승했다. 이틀 만에 0.6%포인트 이상 오른 것이다. 2001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11일에는 장중 4.54%를 넘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과 같다. 또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팔아치웠다는 의미기도 하다.
국채 금리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다. 미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증하는 만큼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미 은행의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리스 금리에도 연동돼 미국 가계에도 영향이 크다.
시장에서는 미 국채 가격 하락에 대해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봤다. 미 국채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오히려 자금이 모여 금리가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관세 전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월가 안팎에선 불안감이 커졌다. 미 국채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안전자산 지위 박탈은 물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 감세 정책은 물론 재정 정책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영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에게 필요한 중간선거 승리 스케줄을 위해서는 주식시장 살리기도 필요하겠지만 채권시장 안정 이후 감세 정책 드라이브까지 필요하다"며 "채권금리가 안정돼야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채 금리 급등, 즉 금리 발작 현상은 결코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긍정적 현상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상호관세 시행을 90일 연기한 것 역시 물가 우려에 따른 국채 금리 발작 현상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미 국채 금리 상승의 원인이 트럼프에게 있다고 봤다. 관세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미 국채를 매도했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 과도한 금리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딩(Treasury Long-IRS Short)의 강제 청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일부에서는 관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미 국채 매도(보복 대응)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 2018년 미-중 간 무역분쟁이 심화됐을 때도 해외 공적기관의 미 국채 보유잔고가 낮아진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7590억 달러(약 1077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금융시장 주가 급락에 따른 대규모 마진콜 대응 및 은행들이 단기 대출을 위해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관건은 국채 금리가 언제 안정되느냐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로 흘러가면서 단기 안정은 어렵다는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가 섣불리 금리 인하 재개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도 국채 금리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상호관세발 물가 리스크가 커지면서 관망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높은 미 국채 변동성과 위축된 미 국채 유동성 여건은 당분간 미국 자산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치적 불안으로 야기된 금리 변동성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여전하며 미 국채의 투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포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