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진단과 동시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치료 여정을 시작하는 혈액암 환자는 항암 치료보다 더 강력한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받곤 한다. 그러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10명 가운데 5명은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돼 환자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식편대숙주병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기증받은 건강한 면역세포가 환자의 몸, 즉 숙주를 '적'으로 인식해 주요 장기를 공격하는 중증질환이다. 혈액암 환자 중 암이 재발하지 않고 사망한 10명 중 4명(37.8%)이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편대숙주병은 자가면역질환처럼 환자의 전신에 걸쳐 심각한 염증과 섬유화를 유발해, 환자는 온몸을 뒤덮는 붉은 발진, 가려움증, 구역, 구토, 설사, 안구 건조, 시력 저하 등 다양한 숙주 반응을 겪게 된다.
특히 만성화될수록 주요 장기가 손상된다. 환자의 42%는 진단 당시 이미 폐, 입, 눈 등 4개 이상의 장기에서 숙주 반응을 겪는다. 근막, 관절 등에 섬유화가 진행될 때 환자들은 몸을 똑바로 펴지도 못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
폐가 섬유화되면 환자의 숨통은 좁혀진다. 기본적인 호흡조차 어려워져 장기 입원이나 폐 이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은 혈액암 환자들에게 내려지는 두 번째 사망선고와도 같다고 한다.
장준호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환자들은 혈액암 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면역치료인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마친 뒤에도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숙주 반응으로 인해 계속해서 생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폐나 간에 숙주 반응이 오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그 외에도 온몸의 살갗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의 피부 숙주 반응,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맵고 쓰라린 안구 숙주 반응, 물에 씻은 김치조차도 먹지 못하는 구강 숙주 반응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장 교수는 "환자들은 강한 치료 후에 나타나는 숙주 반응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암 치료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좌절감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은 그동안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일차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스테로이드 치료제, 면역조절제 등이 쓰였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는 여러 장기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미 신체가 쇠약해진 혈액암 환자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스테로이드가 들지 않는 환자는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JAK(야누스 키나아제) 저해제로 2차 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나 49.7%의 환자만 이 약으로 치료 효과를 보는 데다 합병증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장 교수는 "환자는 높은 확률로 1차 치료, 2차 치료 후에도 여전히 3차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기존 치료에 실패하는 환자가 절반에 달한 반면,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었으니 미충족 수요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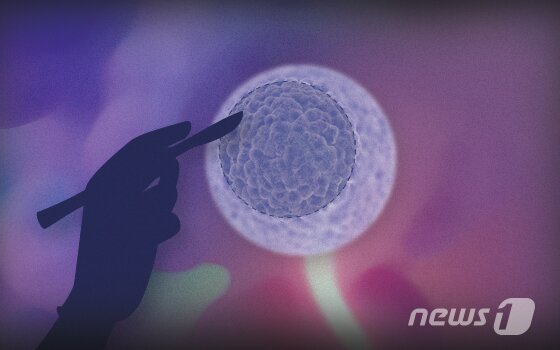
그런데 최근 만성 이식편대숙주병만 표적으로 삼는 3차 치료제 '레주록'(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미분화))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속 승인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허가를 받았다.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의 염증과 섬유화 유발 물질로 알려진 'ROCK2'(Rho 관련 코일드 코일 함유 단백질 키나아제2) 신호전달 경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가진 치료제는 장기 숙주 반응을 감소시키고, 기존 치료 실패 환자들의 치료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최근 혈액암 환자들이 고통받는 섬유화를 조절하고, 합병증을 벗어나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는 혁신 신약이 등장했지만, 건강보험 급여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국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인 문제로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혈액암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ksj@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