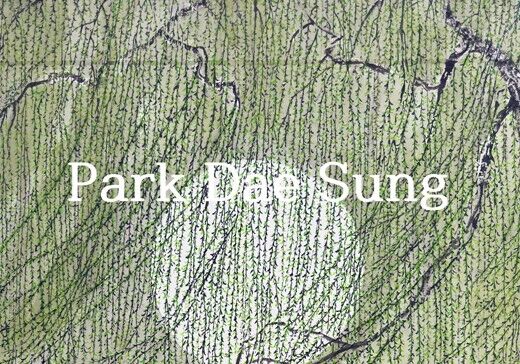(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958년 4월 16일,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개인의 능력과 학문적 성취를 평가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고려는 학문 연구를 장려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중용하는 사회로 점차 변화해 나갔다.
광종 9년 시행된 과거제는 후주의 귀화인이자 뛰어난 학자였던 쌍기의 건의로 도입됐다. 이는 낡은 신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학문적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던 고려 왕실의 혁신적인 시도였다.
신라 말 골품제라는 폐쇄적인 신분 제도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건국 이후부터 고려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인재 등용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과거제였다.
고려 시대의 과거는 크게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와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로 나뉘어 시행됐다. 문과는 유교 경전과 문학적 재능을 평가하는 명경과와 제술과로 구분됐다. 잡과는 의학, 역학, 율학, 산학 등 실용적인 기술 분야의 인재를 선발했다. 초기에는 무과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던 고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과거제 시행은 단순한 시험 제도의 변화를 넘어, 고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출신 가문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 호족 세력의 견제 속에서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광종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과거제가 시행 초기부터 완벽한 제도였던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귀족 자제들의 특혜나 부정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제의 시행은 고려가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는 고려 문화의 융성과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됐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