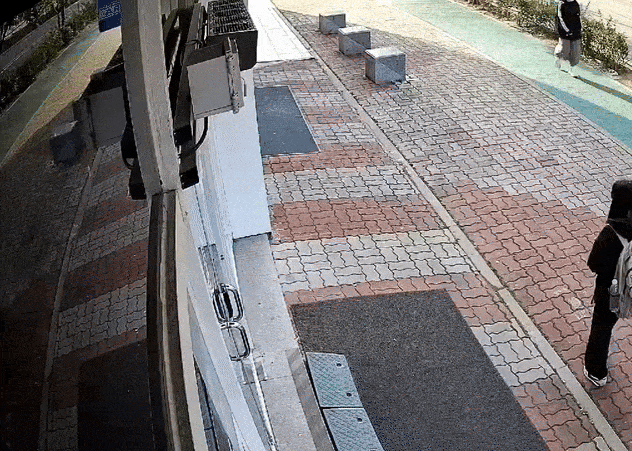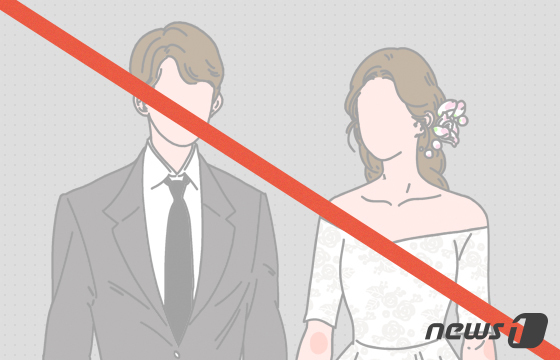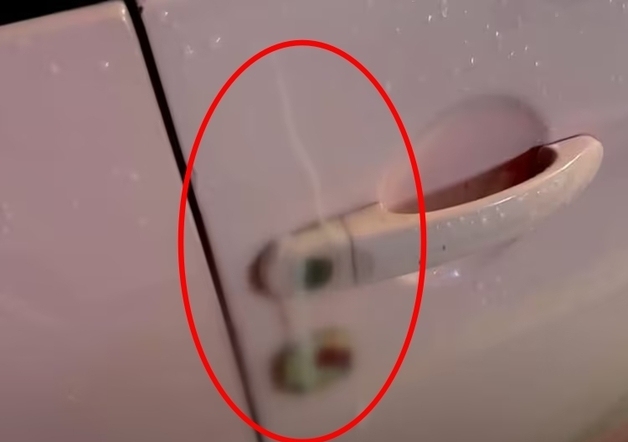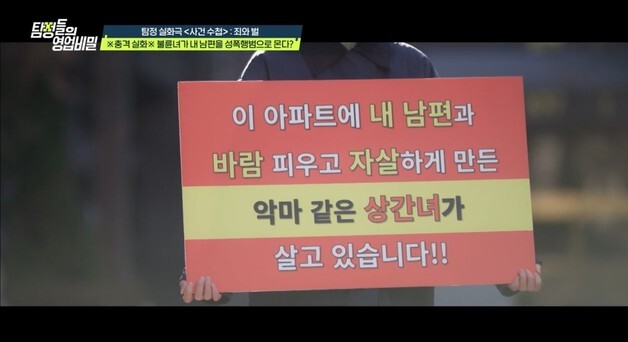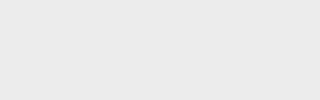
[전호제의 먹거리 이야기] '칠면조 고기와 호스텔'

(서울=뉴스1) 전호제 셰프 =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다. 나는 한국이 매해 이날을 평일처럼 지내는 것이 아쉽다. 미국에서 몇 년의 추억 때문이기도 하다. 그때 느꼈던 풍요로움은 매해 이맘때 다시 생각난다.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추수감사절은 집으로 가는 명절이다. 귀향 행렬이 생기는 때이기도 하다. 이때 미국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가 칠면조 고기다. 우리에게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음식이다.
벌써 10년도 넘었지만 내겐 잊히지 않는 추수 감사절의 추억이 있다. 필라델피아 호스텔에 묵으면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때였다. 숙소를 구하기 어려워 호스텔을 집 삼아 지냈다. 덕분에 퇴근하면 매일 새로운 투숙객을 만날 수 있었다.
호스텔의 오너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파티할 수 있는 돈을 제공했다. 우리 호스텔에는 근처 대학교에 유학 중인 케냐 유학생, 가끔 출장 오는 직장인을 비롯해 장기 투숙객도 몇 명 있었다. 이들이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지 않게 후원을 해준 것이다.
음식은 내가 총대를 메고 준비했다. 간단한 샐러드, 파스타를 준비하기로 했다. 추수감사절이니 칠면조가 빠질 수 없었다. 당일에 마트에서 냉동 칠면조를 구입했다. 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결국 가슴살 다리살을 다 나누어서 구웠다.
영화에서처럼 노릇노릇한 멋진 통구이는 아니었지만 함께 식사를 나누며 타향살이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얼굴도 모르는 호스텔의 오너는 세계 각국의 투숙객에게 필라델피아의 추억을 남겨 준 셈이다.
뉴욕의 식당에서는 추수감사절 전날 특별 메뉴를 만들었다. 프랑스풍으로 칠면조 가슴살에 각종 야채와 칠면조 부속 재료로 만든 부드러운 스터핑을 채웠다. 그날의 메뉴를 준비하면서 셰프는 조금 넉넉하게 음식을 만들었다.
서비스 분위기는 약간 들떠 있었다. 대부분이 뉴욕의 타향살이였지만 명절 분위기는 절로 콧노래가 나오게 했다.
손님들 식사가 끝나자 남은 칠면조 요리 재료는 직원들 몫이었다. 식당은 이틀 정도 휴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깨끗하게 주방 정리를 한 후에 나도 진공으로 포장된 칠면조 가슴살 요리를 하나 받았다.
마침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모두 내가 묶던 숙소로 모이게 되었다. 칠면조요리를 데우고 크랜베리 소스와 야채도 곁들였다. 좁은 거실이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먹었던 칠면조요리는 내게 최고의 추수감사절 음식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칠면조 고기를 구하기 쉽지 않다. 한 마리로는 냉동 유통으로 구할 수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다. 한번 써보았지만 품질이 좋지 않아 실망한 적이 있다.
칠면조는 약 4~11㎏이다. 주로 미국에서 생산되니 우리나라로 오려면 냉동이 필수적이다. 사이즈가 큰 만큼 닭과는 매우 다른 힘줄도 많고 고기 색도 진한 편이다.
칠면조의 맛은 닭고기보다는 진한 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커다란 칠면조를 큰 오븐에 넣으면 가슴살은 매우 건조해지고 전체적으로 육즙이 말라버릴 수도 있다. 미국 남부에서는 기름에 통째로 튀겨낸다. 튀기기 전에 밋밋한 고기를 남부식 향신료로 맛을 돋우기도 한다.
가끔은 미국에서 맛보던 칠면조의 맛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음식은 그 맛의 기억을 찾아 만들어 내는 것이란 말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게 마련이지만 음식은 그렇지 않다. 내 앞에 칠면조 한 마리가 생긴다면 상상해 보기도 한다. 그러면 그 음식을 나누었던 사람들도 연달아 기억이 되살아난다.
추억 삼아 내가 머물렀던 필라델피아의 호스텔을 찾아보니 아직 영업하고 있었다. 업로드된 내부 사진을 보니 그 당시 파티를 하던 지하 주방도 더욱 말끔해 보였다.
지난 몇 주간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거렸다.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미국에서 좀 더 밝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shef73@daum.ne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