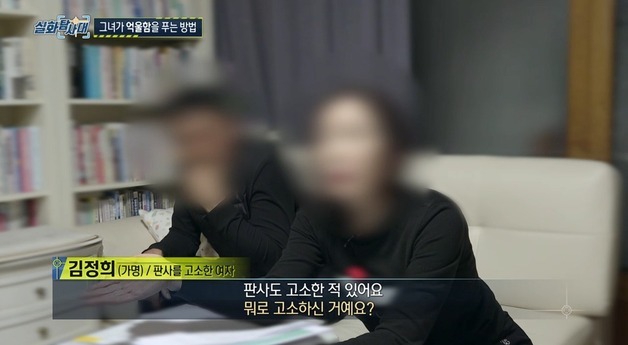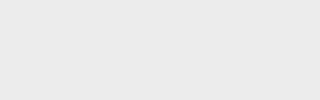
[기자의 눈] 축구장 잔디 논란…땜질식 처방보다 인식부터 바꿔라
서울-김천전 '빙상 잔디'로 큰 논란
최고의 경기장 환경이 당연하다는 인식 필요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잔디 문제가 불거지면서 축구계가 시끌시끌하다.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리그 일정 조율, 잔디 관리 인력 투입, 재정 확보 등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정작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축구 경기장 환경에 대한 '후진적 인식'이다.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라운드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맞대결은 경기 자체보다 잔디가 더 시선을 끌었다.
체감 온도가 영하인 날씨에도 구름 관중 2만4889명이 모였는데, 두 팀은 엉망인 잔디 환경 속에서 90분 내내 답답한 경기를 하다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라운드 위 선수들 못지않게 기대 이하의 경기를 관전해야 하는 펜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경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정도로 잔디 상태가 엉망인 건 서울월드컵경기장뿐만이 아니다.
올해 K리그는 클럽월드컵과 동아시안컵 등 여파로 예년보다 2~3주 정도 일찍 개막했는데 3월 초까지도 추위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2)를 치르는 전북 현대는 잔디 상태가 부적합하다는 AFC 판단에 따라 6일 홈 경기를 약 170㎞ 떨어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른다.
이 밖에 경기장들도 잔디가 얼어붙어 미끄럽고, 뿌리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금방 파인다. 김기동 서울 감독의 말처럼 잔디 상태가 안 좋은데 경기를 계속 치르니 훼손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되풀이다.
평소보다 이른 개막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올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과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아시안컵 등의 일정을 고려했고, 그동안 비판 받았던 한여름 주중 경기 최소화를 꾀하는 등 복합적 이유로 개막을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2~3월 한국의 기후 데이터 조사까지 실시했다.
그보다 근본적 문제는 추위라는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잔디 제반 시설과 관리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유럽처럼 잔디 바닥에 스팀이 깔려 온도를 유지하는 인프라나 일본처럼 체계화된 잔디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구단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등이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 현실적으로 잔디 관리에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는 K리그 전체 시장의 한계 등 복합적인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
이에 앞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하는 건 바로 잔디를 포함한 경기장 환경을 대하는 축구계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잔디 문제가 자주 불거지자 '정상적 경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그라운드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할 경우 프로축구연맹이 홈과 원정 경기장을 바꾸거나, 홈 팀에 제3 경기장을 찾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새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규정의 효과는 미미하다. 경기 감독관이 킥오프 3~4시간 전 잔디 상태를 체크하고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문제가 된 서울-김천전도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결과는 참혹했다. 정정용 김천 감독은 "준비했던 후방 빌드업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두 팀 모두가 피해자"라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서울 정승원은 "양쪽 발목이 다 돌아가 있다. 선수들 모두 하프타임 때 제대로 된 축구 작전을 짜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차자고만 했다"고 고백했다. 경기가 열리면 안 되는 잔디 위에서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 경기가 치러진 셈이다.
특정 감독관의 판단을 '마녀사냥'하겠다는 게 아니다. 한국 축구 전체가 경기장 환경을 대하는 시선이 선진국 수준은 고사하고 국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실제로 AFC는 그동안 전주월드컵경기장 잔디를 향해 꾸준히 비판한 AFC 감독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ACL2 8강 1차전 홈 경기 개최의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똑같은 경기장에서 K리그1은 2월 16일 전북-김천 상무, 23일 전북-광주FC의 경기가 그대로 열렸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이 FIFA 월드컵 3차 예선 3연전 개최지에서는 빠졌지만 같은 잔디 위에서 K리그는 버젓이 치러지는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잔디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곧바로 '비상사태'임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축구가 열릴 수 있도록 필사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좋으면 최고지만, 안 좋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자위해 왔다.
골문 앞 잔디가 다 파헤쳐 흙이 보여도 "축구 특성상 골키퍼가 다이빙을 자주 뛰는 골문 앞은 어쩔 수가 없지" 하는 식이다.
반면 해외 축구 선진국들의 잔디는 '당연히' 최상이다. 골키퍼가 다이빙을 많이 뛴다는 골대 앞은 골과 직결되는 중요한 스팟이라 더 신경 써서 관리한다.
이제는 우리도 잔디가 축구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판단, 좋은 잔디가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춰야 한다.
호펜하임(독일)과 알나스르(사우디) 등 해외 무대에서 뛰었던 김진수는 "해외에서는 경기장이든 훈련장이든 잔디가 최상인 건 기본이다. 그 이외의 상황은 상상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린가드(서울)는 "영국에서는 공이 올 때 다음 동작을 미리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 잔디에서는 (울퉁불퉁한 그라운드 탓에) 공이 워낙 통통 튀어와 '이걸 잘 잡아놔야지' 하는 생각만 하기에 바쁘다"고 했다.
잔디는 더 나아가 축구산업 전체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다. 잔디가 안 좋으면 제대로 된 경기가 나올 수 없다. 선수들이 다치고 팬들은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즐기지 못한다. 서울-김천전을 지켜본 한 축구계 관계자는 "오늘 경기장에 온 팬들은 축구에 대해 오해를 제대로 하고 갔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엉망인 잔디는 선수와 팬 모두를 잃는 셈이어서 결국은 축구계 전반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잔디를 토양으로 삼고 뛰는 축구대표팀의 성적도 좋을 수 없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역시 "국제대회에서 한국 클럽과 국가대표팀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경기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잔디는 좋아도 되고 안 좋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 축구에서 축구공이 당연히 필요한 것처럼, 최상의 잔디 컨디션 역시 축구 발전을 위해 필요조건인 셈이다.
축구가 좋은 잔디 위에서 열려야 한다는 인식이 우선 절실하다. AFC가 축구를 할 수 없다고 느낀 잔디 위에선 K리그 경기도 열리지 않는 게 당연해야 한다.
tr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