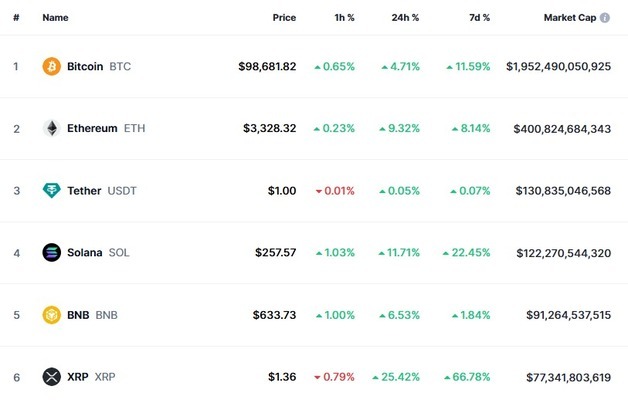[딥포커스]G7 성평등 수준 꼴찌 일본, 이번엔 '부부별성제' 도입할까
“성씨도 이름의 일부” “정체성 느끼는 요소” ‘별성’ 요구 목소리↑
2015·2021년 법원 부부‘동성’이 ‘합헌'이라 판시…법감정에 뒤떨어져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축하해! 그래서 새 이름은 뭐야?”
일본에서 결혼을 앞둔 여성이라면 으레 받게 되는 질문이다. 결혼 후 부부 중 한쪽의 성을 골라 통일해야 하는 ‘부부 동성(同性) 제도’ 때문이다.
대개 일본인들은 결혼 후 관습적으로 남편 성을 따른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이름을 쓸 수 있다”며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한평생 불린 모태 성씨에 애착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국회에서 “가치관과 마음에 관한 문제로 의논할 필요가 있다”며 부부 동성 제도 개정에 불씨를 지폈다.
이번에야 말로 일본은 ‘부부 별성(別性) 제도’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90년대 법무성이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제안 그러나…
시민단체 ‘별성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데라하라 마키코 단장(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부 별성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민법이 제정된 1947년 직후부터였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서야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추진하는 모임’ 등 관련 단체가 만들어지며 본격적 움직임이 일어났다.
1996년에는 법무성이 나서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법안을 제출하는 등 논의가 물살을 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후 지금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민당 내 일부 반대파 세력이 잔존하는 까닭이다.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문턱도 높았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겸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5년 판결과 2021년 결정에서 각각 ‘부부 동성’을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기 힘든 이유는 한마디로 '급하지 않아서'다. 동성혼처럼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당장 결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의 성’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상 차별의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의 중요도를 떨어뜨린다.
◇원래 이름을 지키고 싶은 부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 ‘사실혼’
현재 일본에서 결혼 전과 같은 이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부는 반강제로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고 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유족연금 수급·생명보험 수취인·불임치료비 조성 등 각종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이용 시 일정 조건을 맞춰야만 한다. 통신비·자동차보험 가족 할인 등도 조건부다.
상속할 때에도 유언을 미리 작성하거나 살아있을 때 증여해놔야만 한다. 단, 상속세·증여세 감세 혜택은 볼 수 없다.
특히 자녀가 태어날 경우 법률혼은 공동친권을 갖지만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엄마에게 친권이 있다.
사회적 혜택의 차이는 실제로 별성·동성제를 선택할 경우 영향을 미친다. 전직 기자 마이씨는 “성을 남기는 것보다 국가 제도와 혜택을 우선하기 때문에 현행법 아래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동성·법률혼을 고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현실적 불편함을 감안하고서라도 자신이 살아온 이름을 지키고자 사실혼을 고르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성을 바꾸고 싶지 않아 사실혼을 선택했다는 조각가 모로오카 아유미는 “남편이 내 성으로 바꾸는 선택지도 있었다” “하지만 내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상대에게 같은 것을 강요하기는 싫었다”고 고백했다.
모로오카가 성을 바꾸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정체성 때문이었다. 학창시절부터 ‘모로’라고 불리며 주로 이름보다는 성을 활용한 별명으로 지인들에게 알려졌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모로 씨"라고 불린다. 그는 "(성이) 바뀐다는 것은 이름을 잃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모로오카는 95% 이상이 암묵적으로 남편의 성을 선택하는 세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만화를 통해 “한쪽 성으로만 통일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이 뿌리깊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비율은 1995년 97.4%, 2015년 96.0%, 2019년 95.5%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제는 사회적 관습이 부부별성, 사실혼을 선택하는 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는 “별성·사실혼을 주장하는 커플에는 ‘까다로운 사람’ ‘망할 페미(니스트)’라는 딱지 붙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일각에서는 별성을 사용하게 되면 일본의 문화와 전통이 무너진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그런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사법부는 “국회서 논의”하라는데 총리는 “반대한 적 없다”…미루기의 결말은?
앞서 2015·2021년 최고재판소는 부부 동성제에 합헌 판결을 하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 판단돼야 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정치권에서 먼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지난 15일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서 “한 번도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다”고 말하며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관련 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데라하라 단장은 “총리가 개인적으로 찬성한 거라면 자민당 중 반대파의 영향력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집권당의 당론으로 정리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단장은 “국회가 자발적으로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별로 기대할 수 없다”며 “최고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헌법소송사를 언급하며, “합헌 판결을 거듭 반복한 끝에 결국 위헌 결정에 이르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라고 짚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에게 공을 떠미는 사이 사회적 합의는 상당히 진전됐다. 2021년 내각부가 2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별성제를 도입해야 한다’와 ‘동성제와 별성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답한 국민이 71.1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성혼과 별성제 논의에 갑작스럽게 뛰어들었다. G7 중 꼴찌이자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는 성평등 수준(116위)을 의식한 이미지 개선 노력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번에도 G7용 반짝 안건으로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부부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