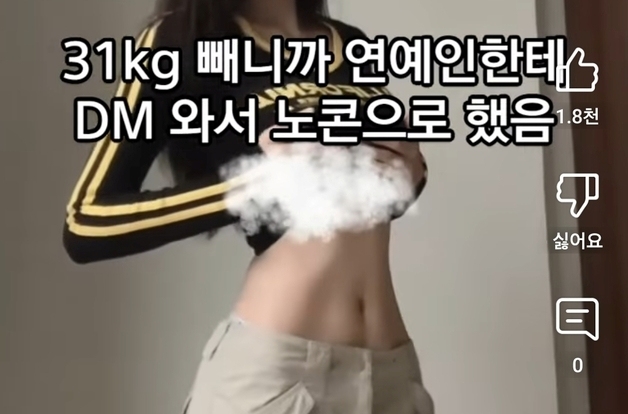양육비 안준 '나쁜 아빠' 첫 실형…"동생 친구 통장 쓰고 꼼수"
[양육비 선지급-上]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개정 후 최초 실형
'감치 명령' 피하려 500만원 지급…'양육비 선지급제' 주목
- 오현주 기자
#. 2014년 이혼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운 김 모 씨(45)에게 지난날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야간 일을 다녔다. 다행히 전 남편은 3월 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2021년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020년부터 김 모 씨를 지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측은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그간 굴착기 기사로 일한 비양육자는 2021년 감치재판 인용 결정이 난 뒤 감치를 모면하려고 양육비 500만 원을 준 게 전부였다"며 "재산 조회를 피하려고 여동생 친구 명의 통장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전 시아버지 근무지에서 양육비 지급 관련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도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남편이 실형 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0년이다. 당시 김 씨는 남편으로부터 2013년 4~7월분 월 40만 원에 이어 2030년 8월까지 매달 80만 원, 2032년 7월까지 월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판결 받았다.
김 씨의 통장에 매달 양육비가 들어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 비양육자가 경제 활동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비양육자의 경우 굴착가 기사로 경제활동이 가능했지만, (추심을 막고자)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했다"며 "또 본인 자동차는 일부러 어머니 명의, 살고 있는 집은 친누나 명의로 돌려놨다"고 전했다.
김 씨는 홀로 투쟁하다 2020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족진흥원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존재를 알고 문을 두드렸다.
이후에도 빠른 진전은 없었다. 한국에서 소송으로 양육비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이다. 양육비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전이다.
김 씨가 '양육비 본안 소송'인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2020년 6월 인용이 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이행관리원 측은 "보통 6개월이 걸리기도 해 이 정도는 빨리 이행명령 결정이 난 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전 남편은 이행 의무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 씨는 약 1년 뒤인 2021년 5월 감치 신청을 했고, 7개월 뒤 감치 명령이 결정됐다.
감치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을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치소 등에 최대 30일 동안 가두는 조치다.
10일 감치 명령 결정이 내려졌지만, 전 남편은 결국 감치가 되지 않았다. 이행관리원 측은 "당시 경찰이 6개월 동안 비양육자를 잡으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갔는데 상대방이 없었고, 신청인에 따르면 이 주소는 비양육자 부모의 주소였다"며 "(감치 명령 전) 전 남편은 감치를 피하려고 급한 대로 500만 원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던 비양육자는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는 선임했다"며 "이후 (양육자가)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제재가 이뤄졌지만 양육비는 계속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등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가능성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1년 뒤 전 남편을 고소했고,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비양육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도 그동안 밀린 양육비 1억 원가량을 빠른 시간 내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김 씨가 양육비를 모두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실형 선고 이후 (출소한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감치 명령 신청, 형사 고소' 같은 모든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런 제도적 한계를 막고자 '한시적 긴급 지원제'의 확장판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 독립할 이행관리원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도 추진한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