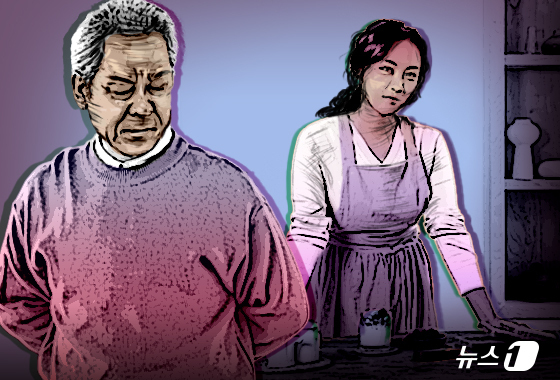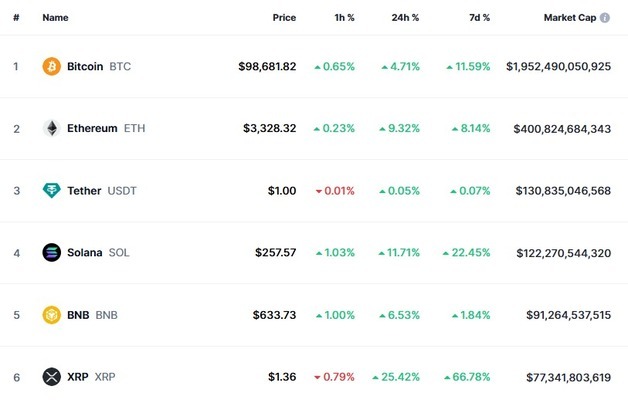"사망 열흘 지났는데 기다리란 말만 반복"…프랑스 여행객 유족 '눈물'
한국인 여행객 유족, 신원 확인 절차도 못 밟아…"충분한 설명 없어" 분통
A씨 추적도 유족이 직접 진행…사망 경위 확인도 '난관'
- 서상혁 기자,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송상현 기자 = 한국인 여행객이 프랑스 지하철 선로에서 사망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유족은 고인의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의 사망원인 조사는 물론 시신 인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기다려 달라"는 말 뿐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국인 여행객 A씨(36세·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지하철 역사 선로에서 전기에 감전돼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스스로 플랫폼(승강장)에서 내려와 지하철 선로를 횡단하려다 전기에 감전됐다고 잠정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일 한국인 관광객과 유람선을 탈 예정이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연락이 닿질 않자 유족은 지난 14일 한국 경찰에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한국시간으로 17일 오후 10시경 대사관으로부터 A씨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24일 유족 측에 따르면 아직 A씨의 유해를 수습하기는커녕 DNA 대조 등 기초적인 신원 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사관이나 외교부로부터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히 듣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유족 B씨는 "대사관 측에서는 프랑스 수사당국에서 먼저 결론을 내줘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며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직접 간다고해도 '와도 소용이 없다'고 해서 계속 한국에서 기다리고만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답답해서 한국 경찰에도 문의했지만,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며 "어서 종결을 지어줘야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든 말든 할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실종된 A씨에 대한 추적도 유족이 직접 나섰다. 유족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실종신고 이후 A씨를 찾기 위해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다. 유족은 평소 고인이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조합해 SNS 계정에 접속하는데 성공, A씨의 스마트워치 위치 정보를 알아내 대사관에 전달했다.
유족은 "사실상 스마트워치 위치가 고인을 찾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다"며 "현지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A씨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등 도움도 많이 줬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유족은 A씨가 스스로 지하철 선로에 내려갔다는 현지 경찰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A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씨는 "다 큰 성인이 지하철 선로를 횡단하려고 내려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 대사관을 통해 CCTV 화면을 요청했지만 대사관 측에선 '경찰에 면담 신청을 했으니 계속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에 대해선 현지 대사관이 주무 기관이 돼 해결에 나선다. 대사관에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현지 수사 당국에 협조를 구하는 식이다. 현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사관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사례처럼 지연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공통된 평가다. 과거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은 "통상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사망하면 유족을 불러 시신 인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번 사례같은 경우는 좀처럼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현지 경찰의 수사는 최근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전 A씨가 사망한 당시의 CCTV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건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수사 당국은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대사관을 통해 이르면 다음주 유족에 시신을 인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