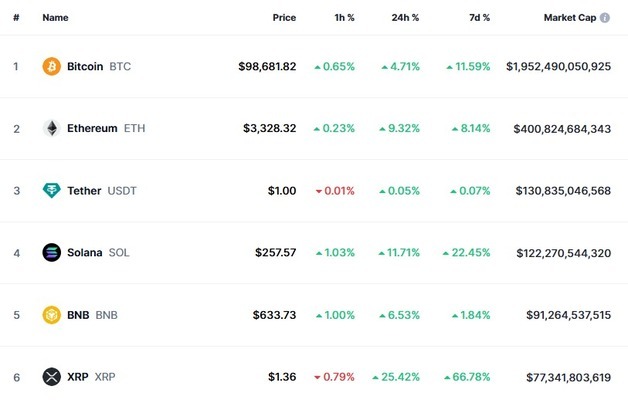"동사무소 가서 처음 내 이름 석자 썼어" 한글 까막눈 뜬 만학도들 열정
9일 한글날…광산구 송정학당 문해교실 가보니
뽀글머리에 돋보기 안경 2시간 내내 눈빛 반짝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
'만들어 줬어요'를 써보세요." 라는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은 하나같이 연필을 들고 받아쓰기를 시작했다.
교실을 돌며 확인하던 선생님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나란히 앉은 두 학생이 각각 '만드러 줬어요', '만들 주어서요'라고 쓴 후 선생님이 지나가자 눈치를 살폈다.
선생님은 웃으며 실수를 바로잡아주었고 학생들은 모두 '엄마가 직접 만들어 줬어요'라는 문장을 쓰는 데 성공했다.
초등학생 수업 같지만 교실을 가득 채운 건 15명의 뽀글 파마머리와 돋보기를 착용한 일흔이 넘은 만학도들이다.
578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광주 광산구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4층 강의실에서 열린 송정학당 문해교실.
수강생들은 교재와 연필을 책상에 가지런히 두고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해 공부의 열정을 꽃 피웠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예순이 넘은 나이에 늦깎이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학업 열정은 젊은 학생 못지 않다.
수업은 2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수업 내내 어르신들은 행여나 선생님의 말을 놓칠세라 두 눈을 반짝였다. 받아쓰기가 끝나자 쉬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답을 확인하고 나서야 화장실으로 향했다.
수업 시작 30분 전부터 맨 앞줄에 앉아 지난주에 배운 것을 복습하던 김유자 씨(81·여)는 시를 쓰는 게 최종 목표다.
김 씨는 "6살에 전쟁이 터지면서 공책이고 연필이고 구경조차 어려운 시대였다"며 "글을 쓰고 싶어서 나뭇가지를 아궁이에 넣은 후 나온 재로 흙바닥에 글을 쓰곤 했다"고 회상했다.
한글 공부 3년째인 이겨란 씨(80·여)는 이 수업의 최고 연장자다. 불과 3년전만 해도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지만 송정학당을 다니면서 까막눈 신세를 면했다.
이 씨의 노트는 빨간색과 파란색 펜으로 한글을 써내려간 흔적이 빼곡하다. '띄다'와 같이 어려운 맞춤법은 외우기 쉽게 빨간색으로, 헷갈리기 쉬운 받아쓰기는 파란색으로 칠해뒀다.
어르신들은 "뒤돌면 까먹는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헷갈리는 문장을 공책에 거듭 받아적으며 배움의 꿈을 펼친다.
이 모 할머니는 한글을 배운 후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내 이름 석자를 쓰고, 은행에 가도 숫자를 글로 쓸 수 있어서 자신만만하고 좋다"고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할머니들에게는 마음에 품은 배움의 꿈을 펼치고 한 글자 한 글자 알아가는 오늘이 행복한 날로 꼽힌다.
만학도들의 선생님인 최나미 씨는 3년 넘게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최 씨는 "배움에 대한 한을 가진 어르신들인 만큼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한글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며 오히려 제가 배울 때도 많다"고 전했다.
광주 광산구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노년층의 한글교육 수요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한글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