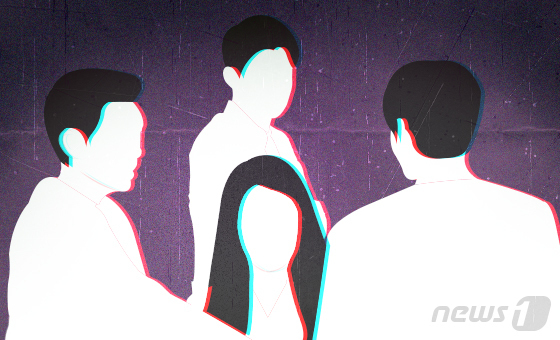[전호제의 먹거리 이야기] '배고픔과 사과'

(서울=뉴스1) 전호제 셰프 = 다음 달에 자신의 고향 베트남에 방문한다는 서연에게 궁금증이 생겼다. "고향에 가면 무슨 음식을 제일 먹고 싶니?" 한참 생각하더니 한마디 뱉는다. "과일이 가장 먹고 싶어" 이 대답에 특별한 별미 음식을 기대했었는데 고작 과일이라고 하니 진심으로 의아했다. 잠깐 있다 설명을 덧붙인다. "베트남은 과일이 싸고 맛있어, 다른 음식은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사과를 보면 나도 서연이 말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든다. 싸고 맛있었던 사과는 이제 구입을 주저하게 될 정도다. 몇 달전만 해도 인터넷에서 저렴한 과일을 검색해 구입했다. 요즘은 주스용 사과, 못난이 사과도 개당 1000원이 넘기 시작했다.
사과는 다른 과일이 비쌀 때도 연중 가격이 일정한 편이었다. 가격이 쌀 때는 주스, 쨈, 술 등으로 만들 정도로 부담이 없었다.
예전 인도 여행 중에 만난 비구니 스님 두 분과 국내 일정을 같이 한 적이 있었다. 대구의 한 사찰에서 오셨는데 간식 시간에 말린 사과 한 꾸러미를 꺼내셨다. 도톰하게 잘라서 햇빛에 잘 말려 부드럽고 먹기 좋았다. 함께 도착한 여행지에서 식당을 찾지 못했을 때도 말린 사과를 먹으며 허기를 참을 수 있었다.
여행을 위해 정성 들여 만든 엄지손가락만 한 사과 말림은 새하얬다. 아마도 사과를 자르고 나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말린 것이 아닌가 싶다. 너무 빨리 헤어지는 바람에 만드는 법을 물어보지 못 한게 아쉽다.
요즘처럼 추위가 한창일 때는 사과를 끓여 만드는 음료인 애플 사이다가 제격이다. 이른 아침 뉴욕시의 유니온스퀘어 광장에서 열리는 파머스 마켓에 가면 따뜻하게 데운 애플 사이다를 마실 수 있었다. 이 한잔을 마시면 추위도 가시고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다. 가격도 부담 없어서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여행자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직접 기른 사과도 판매하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애플 사이다를 따라주던 농부의 손길이 잊히지 않는다.
일본의 베이커리 카페에서도 직접 만든 애플 사이다를 맛본 적이 있다. 이번에는 차게 식힌 스타일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병입 제품이 아니었다. 사과를 통째로 넣고 계피 등 향신료를 넣어 끓인다. 그리고 사과를 국자 등으로 남은 과즙까지 최대한 짜주면 된다. 음료메뉴 하나에 많은 정성과 수고가 들어간다. 함께 나온 뜨거운 더치 펜케익과 시원한 애플 사이다를 마셨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다.
사과가 허기를 채워주는 이유는 식이섬유와 펙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사과 1/2개만 먹어도 아침 활동을 시작할 포만감을 준다.
어릴 적 집에 간식이 부족할 때 나의 어머니는 사과 1~2개를 강판에 갈아서 밀가루, 설탕, 우유를 넣어 사과 펜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 프라이팬에 사과 반죽을 부치고 설탕을 뿌려 먹었다. 하얀 사과가 강판에 갈려서 누렇게 변하는 것과 부엌에 있던 난로 위에서 손을 녹이며 펜케이크를 기다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이렇게 사과는 배고픔을 채워 주는 과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사과 가격은 꽤 가파른 인상을 보여준다. 도매가 기준으로 지난해 10㎏ 특 5만2000원에서 올해는 10만6000원이 되었다. 요즘은 장을 보다 보면 사과를 사기 위해서는 다른 식품이나 반찬 구입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게 될 정도이다.
이러다 보니 예전 사과를 먹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항상 평범해서 특별한 먹거리라고 할 수 없었던 사과를 발견한 것이 수확이랄까? 과일을 가장 먹고 싶다는 서연의 대답처럼 나도 싸고 맛있는 사과가 그립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웠던 것이 주식인 쌀과 고기만이 아니었다. 사과의 재발견을 하게 된 요즘 사과 한 알의 소중함을 느낀다.
shef73@daum.ne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