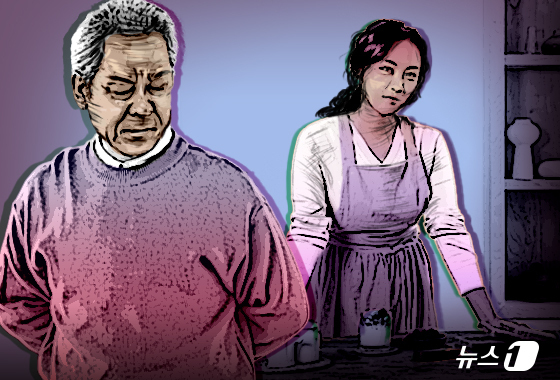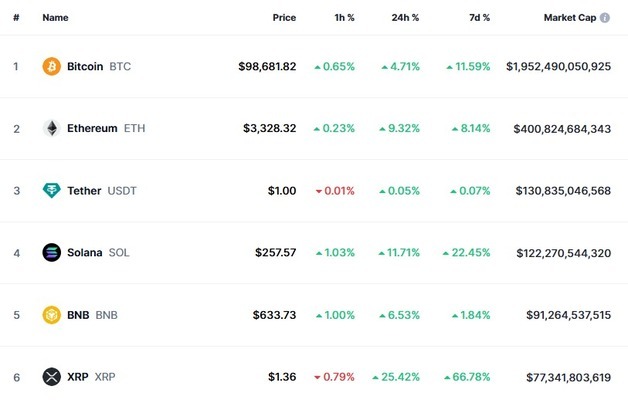상반기 저축은행 총자산 6.5조 증발…"아직 망할 곳은 없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여파 순손실 3800억 원
금감원 "인위적 인수합병 고려할 수준 아냐"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내 저축은행의 총자산이 6개월 사이 6조 원 넘게 증발했다. 순손실이 크게 확대되고 건정성지표도 악화됐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의 여파인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만한 위기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은 6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총자산이 전년 말 126조 6000억 원 대비 6조 5000억 원 감소한 120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총자산 영업실적 악화 등에 따른 보수적인 영업전략 등으로 기업 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것이 총자산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신은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6조 3000억 원 줄어든 100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자기자본도 계속되는 적자 지속으로 전년 말 대비 3000억 원 감소한 14조 4000억 원에 머물렀다.
상반기 저축은행은 380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965억원 손실을 봤던 것에 비해 적자 폭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저축은행의 적자 폭이 확대에는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연체 증가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으로 인한 대손 비용 증가가 영향을 줬다.
자산건전성지표도 하나같이 악화됐다.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81%포인트(p) 상승한 8.36%를 기록했고 이 중 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3.90%p 상승하며 11.92%까지 치솟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3.77%p 오르며 11.52%로 뛰어올랐다.
그간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에 따른 손실 처리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실제 금감원의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 수준인 21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정리 대상'으로 꼽혔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7조 8000억원이고, 토지담보대출액은 8조 8000억원이다. 연체율은 각각 12.52%, 18.66%인데 각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강제 구조조정을 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금융담당 부원장보는 "최저 자금뿐만 아니라 예보(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최소 자본에서 버퍼(완충)를 두는 부분까지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자본비중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부원장보는 "인수합병이 인위적인 조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현황을 보면 자기자본비율은 15.04%로 전년 말 대비 0.69% 상승했다. 여전히 규제비율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말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744조 원으로 전년 말 726조5000억 원 대비 2.4% 증가했고, 순이익은 1조6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감소했다. 역시 PF 대출 예상 손실에 대비판 충당금 적립이 순이익 감소의 주원인이었다.
연체율은 4.38%로 전년 말 대비 1.41%p 상승했고, 같은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81%로 1.40%p 높아졌다.
다만 또 순자본비율은 8.01%로 전년 말 대비 0.12%p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적립률(115.9%) 역시 전년 말과 견줘 12.8% 하락했으나 요적립률(100%)을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PF 대출 연착륙 방안 등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다소 불가피할 측면이 있다"며 “과거 위기 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실적 악화에도 자본 확충 등으로 자본 비율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