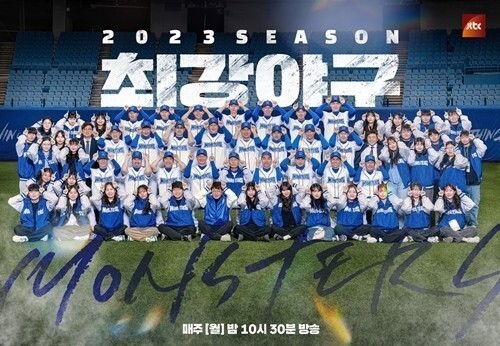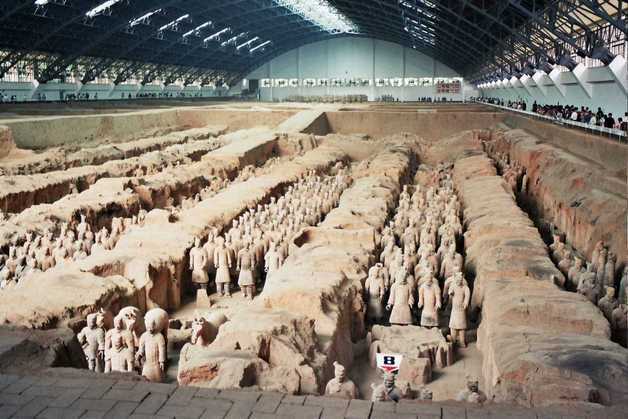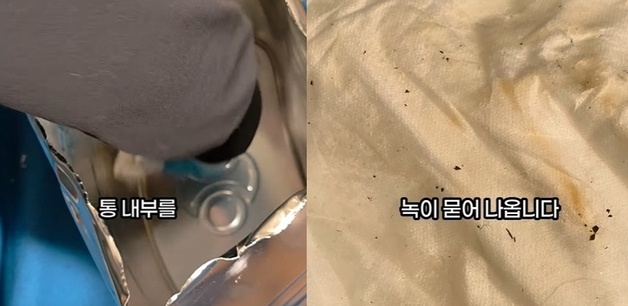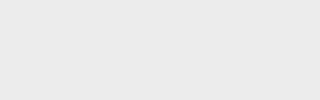
[특별기고] 간호교육 체계 개편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하얀거탑’ ‘병원선’ ‘슬기로운 의사생활’ ‘닥터스’ ‘닥터 차정숙’ ‘낭만닥터 김사부’ ‘중증외상센터’….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인기 의료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병원이 주무대라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환자, 의사, 간호사가 등장하지만, 주인공은 대부분 의사다.
정작 환자를 24시간 곁에서 돌보는 간호사는 언제나 조연에 머문다.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간호사는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간호사는 언제나 '조연'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로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근대 의료가 도입된 이후,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진료를 총괄하고 간호사가 이를 보조하는 역할로 설계됐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사가 의료의 중심이며 간호사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또 법적 제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간호사는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적으로도 간호사는 의사의 결정에 따르는 역할로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곧 직업적 가치 평가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 과정의 차이도 있다. 의사가 되려면 6년제 의과대학 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최소 4년의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간호사는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곧바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사회적으로 '의사는 전문직, 간호사는 보조직'이라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적 의료 행위’가 아니라 '돌봄 노동'으로 여겨지면서, 의사는 의료의 리더로, 간호사는 조력자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급여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간호사의 낮은 직업 만족도와 높은 이직률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간호사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의사가 긴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후속 교육을 통해 의료의 리더로 자리 잡듯, 간호사도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 선진국처럼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욱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교육의 질과 양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 직군을 세분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간호사는 '일반간호사'(GN, General Nurse)라는 한 가지 직군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이를 일반 간호사, '전담간호사'(CN, Clinical Nurse), '전문간호사'(CNS/NP, Clinical Nurse Specialist/Nurse Practitioner) 등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전담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과정에서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실기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우리는 간호사가 의료 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간호사가 법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의사의 영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능한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아래에서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화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사가 독립적인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교육이 바뀌면, 역할이 바뀌고, 사회적 인식도 바뀐다. 간호사들이 더 이상 '조연'이 아니라, 의료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