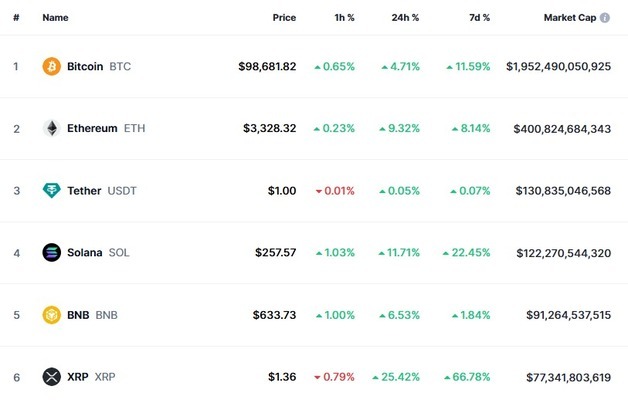"혜택 준다고 애낳고 싶지 않아"…유럽 저출산 정책 효과 없었다
저출산 대책에 가장 적극적인 헝가리와 노르웨이도 어려워
"단순한 돈 문제 아니라 근본적인 문화의 변화일 수도"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전 세계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가장 적극적인 유럽조차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자 기사에서 유럽에서도 가장 출산 혜택이 많은 헝가리와 노르웨이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다자녀를 둔 이들은 혜택이 없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았을 것이라고 하고, 자녀가 많지 않은 이들은 혜택이 많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아이를 갖기 주저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화적 변화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헝가리 인구는 1980년대부터 계속 감소해 지금은 10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2010년까지 출산율이 1.25명으로 떨어졌다.
헝가리는 가족 정책에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투입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이상이다.
'출산 유도'는 극우성향 빅토르 오르반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부 성향상 전통적인 가족 형태 안에서 인구 증가를 꾀하는 게 최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출산 가구에 혜택을 퍼붓는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다. 주택을 구매하는 부부들에게 보조금과 대출금리 혜택을 제공했다. 지금은 종료됐지만 미니밴 구입 시 보조금까지 지원했었다. 4명 이상을 낳은 여성은 평생 개인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오르반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출산율도 2021년 기준 1.6명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진전은 거기서 멈췄다. 헝가리의 출산율은 지난 2년간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헝가리에서는 약 5만1500명이 태어났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숫자다.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도 출산을 원치 않는 부부들이 존재한다고 WSJ는 전했다.
부다페스트에 사는 기혼녀 오르솔리아(28)는 "애가 두 명이라고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새 집을 사겠지만, 집을 사고 싶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 생명을 하나 더 낳는 건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헝가리 여성들은 출산을 주저하는 배경으로 공중 보건과 교육 체계의 부족,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을 꼽는다. 또 보조금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와 신용 등급, 꾸준한 고용 기록이 필요하기에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맹점도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노르웨이는 수십 년 동안 육아휴직과 보조금을 지급하며 여성의 출산을 장려해 왔다. 아이를 낳으면 14개월 동안 기존 급여의 80% 받는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아이 아버지도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받는다.
트루드 라피가드 오슬로대 교수는 노르웨이의 가족 정책이 여성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2009년까지만 해도 2에 가까웠지만 꾸준히 감소해 지금은 1.4명이다. 연구자들은 주거비가 급증하고 경력을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부 수당이 물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나 에크홀트(39)는 34세 때 딸을 낳았고, 매달 160달러의 수당을 받지만 한달에 드는 보육비(190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인 면에서 진전이 없는데, 하나 더 낳으려고 노력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past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