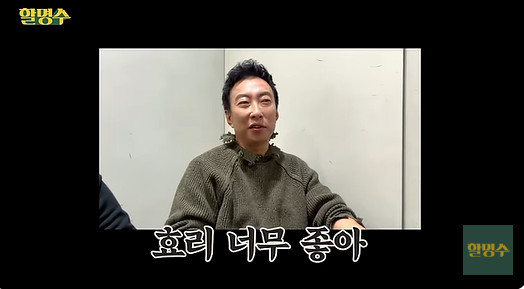서울로 간 김기동 이야기, 김기동 감독과 나눈 '감독' 이야기
[FC서울 신임 사령탑 김기동 인터뷰①]
- 임성일 기자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여럿이 힘을 모아야하는 단체 스포츠에서 팀은 흔히 배로 표현된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마음 합쳐 노를 저어야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 팀을 일컬을 때는 주로 감독을 앞으로 빼 'OOO호'라 칭한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열풍을 일킨 벤투호가 그렇고 호기롭게 2023 아시안컵 우승을 자신했다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퇴장한 클린스만호가 그렇다.
감독의 이름에 연결해 '호'를 붙이는 것은 그만큼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치화하기 힘들지만 배를 끌고 나가는 감독의 몫은 확실히 큰데, 안타깝지만 아주 좋은 예를 최근 축구대표팀이 보여주고 있다.
막연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능력'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은 역시 성적이다. 유소년이나 아마추어 팀을 이끄는 지도자는 우선 순위가 달라야겠으나 적어도 프로 감독이라면 성적이 첫 번째 잣대여야 마땅하다.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다고 여기저기서 말해도 맡고 있는 팀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를 따르라…구슬을 하나로 엮는 장인좋은 선수가 좋은 성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도 팀으로 묶지 못하는 리더를 만나면 말레이시아나 요르단에게도 혼쭐나는 게 축구다.
반면 그리 화려하지 않은 구슬들을 기막히게 엮어 가치를 바꿔버리는 지도자도 있다. 좋은 자원들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멤버로는 어렵다'는 주위의 평가를 비웃고 결실을 맺는 감독을 보면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라는 명제는 탄력을 받는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 지도자들 중 후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김기동 감독이다.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김기동과 함께 했던 포항 스틸러스의 지난 5년은 분명 기대 이상의 성적이었다.
김기동 감독이 지휘봉을 처음 잡은 2019년 정규리그 4위를 시작으로 지난 시즌 2위까지, 5시즌 동안 K리그에서 포항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은 전북현대와 울산HD뿐이다. 2023년에는 FA컵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랐다.
전북과 울산은 K리그 팬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호화 군단이다. 하지만 포항은 다르다. 김기동 감독 자신도 뿌듯해야하는 부분이다.
"감독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성적이다. 김기동이 좋게 평가받는 것은 결국 포항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 시즌 반짝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속성이 있어야한다. 만약 결과물이 좋지 않았다면, 내가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쏟아 부었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성적이 나니까, 그러니까 나와 포항을 들여다보더라. 내가 선수들하고 어떻게 교감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지도하는지 관심을 갖더라."
그런 세간의 관심이 쌓이고 커진 김기동 감독은 2024년부터 수도 서울을 연고로 하는 빅클럽 FC서울을 이끌게 됐다. 가장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최고 인기 구단이지만 근래 수년 동안 '성적'으로는 떳떳하지 못했던 FC서울이 김기동 감독을 택한 것은 그가 '결과를 가져다 줄 선장'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FC서울 선수단이 일본 가고시마로의 2차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 구리에 위치한 GS챔피언스파크에서 만난 김기동 감독은 긴 인터뷰 내내 자신이 넘쳤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독의 무덤인 FC서울을 왜 가느냐 했다. 하지만 부담보단 설렘이 크다. 찬란했던 FC서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고 잘 할 자신도 있다. 서울이 가장 바뀌어야할 것은 성적이다. 최근 몇 년간 좋은 성적을 못 냈기에 선수들의 자존감도 떨어져 있을 것이다. 김기동은 다르다는 것 보여주겠다. 감독인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자신에게 더 엄격한 잣대…'육각형 지도자'
</strong>올해 초 FC선수들과의 첫 상견례부터, 미디어를 앞에 두고 진행한 취임 회견 때부터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보는 맛은 없겠으나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류의 뻔한 대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다. 처음 지휘봉을 잡으면서 '성적'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도망갈 곳 하나를 없애는 일이기도 하다. 근데 김기동 감독은 부러 그 길을 막았다.
김 감독은 "여기서 도망가 봤자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우는 소리, 죽는 소리 해봤자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리더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 선수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며 단호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기동 감독이 추구하는 리더십이나 감독상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기준이 혹독하다.
"감독은 '육각형'이 돼야 한다. 다 잘해야 한다는 말이다. 풍부한 축구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술가적 능력부터 선수들과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까지 두루 갖춰야한다. 강압 없이도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핵심은 균형이다. 치우치면 안 된다. 너무 가르치고 끌고 가려는 모습이 강하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너무 다정하게, 편하게만 다가가면 어느 순간 선이 무너진다. 필요한 것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어려운 자격 조건들을 말하면서도 얼굴은 환했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후하다.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말로 그치지 않는 노력을 동반하는 까닭이다.
김기동 감독은 "나와 생활한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동소이하다. 감독님 너무 좋고 농담도 잘하고 먼저 접근하시니 좋다. 하지만 어렵고 무섭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멀고도 가까운 사이, 스스럼없는 존경심. 말이 쉽지 이상적이다.
지금 당장 '감독 김기동'을 완벽한 지도자라고는 말할 순 없다. 하지만 좋은 축구를 펼치는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 좋은 감독이 되는 고행길을 가고 있으니 저런 당당함도 나온다. 자신보다 축구 선수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 자신보다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이는 없다는 신념에서 기인한다.
김기동 감독은 선수 때부터 자신에게 먼저 냉정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했다. 그게 21년이나 필드를 누빌 수 있었던 롱런의 비결이다.
함께 뛴 동료 선후배와 지도자로 변신한 이후 접한 제자까지 통틀어 축구에 가장 진심인 축구인을 꼽으라면 누가 떠오르느냐 물었다. 김기동의 답은 "김기동"이었다.
임성일 스포츠부장
-2편에서 계속
lastuncl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