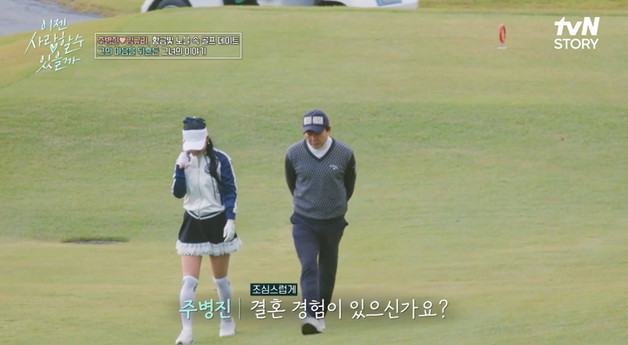양팔 없이 철인3종 마친 김황태 "센강 헤엄친 최초의 한국인"[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 11명 중 10위 마감…"살아남는 게 목표였다"
"패럴림픽 도전은 마지막…한국서 삼겹살에 소주 먹고파"
"센강을 헤엄친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양팔 없이도 센강을 건넌 장애인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김황태(47)가 활짝 웃었다. 그는 오로지 도전과 의지로 패럴림픽을 빛냈다.
김황태는 지난 2일(한국시간)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 PTS3 등급 경기에서 1시간 24분 01초를 기록, 11명 중 10위를 차지했다.
수영 750m, 사이클 20㎞, 육상 5㎞ 코스를 달린 그에게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센강을 헤엄쳐 나오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이뤘기 때문이다.
김황태는 "사전 연습 때는 유속이 느렸는데, 본 경기 때는 더 빨랐다. 모든 영법을 써봤는데 답은 배영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형과 평영에 비해 느리고, 힘도 많이 드는 배영을 많이 쓰다 보니 근육에도 무리가 갔다. 사이클과 육상 기록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는 "살아남는 게 목표였다. 지난해 사전대회까지 두 번이나 센강에서 살아남았으니 만족한다"면서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물이 생각보다 맑고 투명했다"며 웃었다.
김황태는 2000년 8월 전선 가설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돼 양팔을 잃었다. 1년 동안 절망에 빠져 있다 일어선 그는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육상, 노르딕스키,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을 섭렵했다. 그러다 트라이애슬론이 정식 종목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다.
그에게 가장 큰 힘을 준 사람은 아내 김진희 씨다. 김 씨는 김황태의 핸들러(경기 보조인)다. 종목과 종목 사이 경기복 환복과 장비 착용 등을 돕는다. 트랜지션(다음 종목 준비 과정) 시간도 경기에 포함된다.
김진희 씨는 "자연스럽게 보호자로 같이 지내면서 핸들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받았다. 같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황태는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하루에 열댓 번 다툴 때도 있다. 하지만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화해한다"고 했다.
김황태가 사고를 당한 건 양가 상견례를 불과 한 달 앞둔 때였다. 그는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아내가 오가며 나를 수발했다. 지금도 힘들고, 고맙다"고 했다. 친구 소개로 7년간 만난 두 사람은 끝까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부부가 됐다.
김진희 씨는 "잘 헤쳐 나가는 사람이니까 둘이 같이 잘 버텼다"고 했다.
김황태의 바람이 있다면 한국 트라이애슬론 패럴림픽의 역사가 그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다.
김황태는 "태권도 주정훈 선수가 도쿄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뒤 선수가 많이 유입됐다"면서 "대한장애인트라이애슬론연맹은 올 5월 창립됐는데 아직 정가맹단체가 아니다. 나를 보면서 많은 선수들이 도전했으면 한다. 지원도 늘어났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를 마친 뒤 김황태는 눈물을 보였다. 그는 "아내가 부모님이 고생하신 얘기를 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삶이 이기적이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내는 항상 희생했다. 2007년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항상 주말에 나는 집을 비웠다. 딸에게도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패럴림픽 도전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릴 계획이다.
김황태는 패럴림픽 기간 경기에 집중하느라 선수촌에서만 지냈다. 출국을 앞두고서야 아내와 스태프들과 함께 간단하게 파리 시내를 둘러봤다. 그는 "한국에 돌아가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싶다"며 웃었다.
starbury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