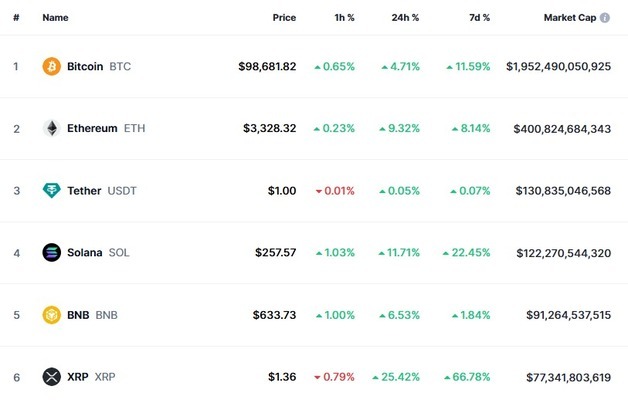지하철 선전전, 우리의 불편함은 왜 길이 되지 못했나[기자의 눈]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시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에는 이같은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도 장애인 이동권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탑승 시위 및 침묵 선전전을 진행한 까닭이다.
이 시간대의 혜화역 풍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대강'이다. '서울교통공사'라고 쓰인 검은색 조끼를 입은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이동권 투쟁' 등의 글귀가 적힌 종이를 든 전장연 회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충돌한다. 부딪힘이 격화되면 활동가 일부는 경찰에 연행되기도 한다.
전장연이 처음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출퇴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한 건 2021년 12월3일.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를 계기로 20년 넘게 이동권 보장을 외쳤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가 시작되자 일반 시민들도, 국회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장애인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이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되는 성과도 거뒀다. 장애인 이동권의 공론화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문제는 2년 가까이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는 시위 방식이 이어지면서 전장연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지하철 불편이 일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메시지가 아닌 현상으로 옮겨갔다.
당장 온라인에 지하철 탑승권 시위를 검색해 봐도 그렇다. '열차 지연 시간', '체포 여부'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전장연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예산 증액', '발달 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는 찾기 힘들다.
시위가 불편함을 동반하는 건 당연하다. 그 불편함이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는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 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국 등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된 나라들도 누군가가 버스를 막아서고 기차역에 매달리는 과정을 거쳤다.
다른 것은 시민들이 묵묵하게 그 불편함을 참아내는 동안 우리는 바뀐 게 없다는 점이다. 움직여야 할 이들이, 귀를 열어야 할 이들이 '행동'했느냐에 따라 180도 다른 결과를 낳았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인내하기 보다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불편함의 책임이 온전히 시위하는 이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전장연이 시위 방식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