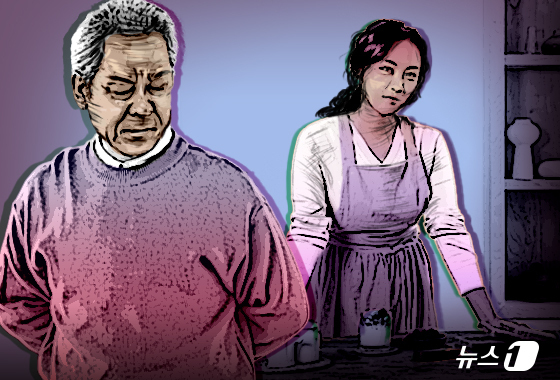구색만 맞춘 '사도광산 추도식'…한일 갈길 아직 멀다[기자의 눈]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사도광산 추도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해진 것은 장소뿐. 추도식을 주최한다는 실행위원회가 무엇인지,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일본 중앙정부 관계자의 급은 어느 정도인지, 추도사 내용은 무엇인지 현재로서 구체적인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가족들마저 우리 국비로 '알아서' 오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면, 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었던 나가사키현 하시마(군함도) 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시센터는 현장에서 1200㎞ 이상 떨어진 도쿄에 설치됐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역사 왜곡도 곁들인 채 개관됐다.
그렇게 9년이 흘렀고,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7~8월쯤 사도섬에서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당시 외교부는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추도식 개최, 전시물 설치를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추도식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추도식 개최 사흘을 앞둔 시점에서야 일정이 정식으로 언론에 공지됐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내용, 특히 일본 측의 '성의'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은 최종 조율된 게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개최 시기가 미뤄진 것을 차치하고도 '사도광산 추도식'이라는 추도식의 공식 명칭에서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다. 또 유가족을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모셔야 한다는 점, 추도사에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을 넣을지를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점은 일본 측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들게 하고 정부의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정부는 지난해 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결심'을 처음 발표하면서 물컵에 절반의 물을 채웠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반은 일본의 몫이라며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했지만, 첫 결심 후 2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물컵의 물이 조금씩 증발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