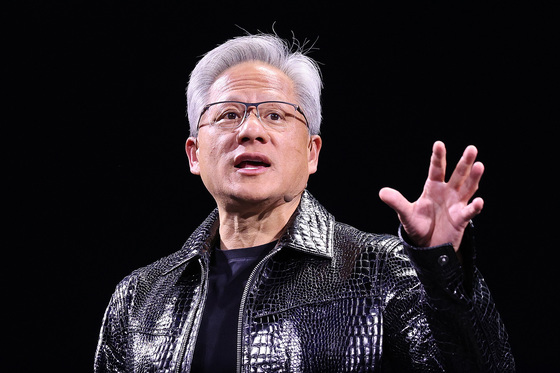"정부가 판 깔아야 한국판 스페이스X 나온다"
'국방 위성 전담' 등 민간 발사 수요 확보 필요성↑
"정부 사업 참여 시 수익 보장해야 재투자 가능"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방 위성 발사 등 정부 수요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우주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길을 더 열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주 산업 패러다임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곤 있으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기엔 발사체 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의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우주 기업 400여곳 중 90%는 방위산업, 정보통신(IT) 산업 등을 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ASP) 사무국장은 "우주 산업으로만 수익을 내는 기업은 20~30여곳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다수 기업은 우주 산업을 기술 홍보 차원에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ASP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등 국내 90여개 우주 산업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우주산업은 수요가 급증하는 일반 민간사업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사업 모델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정부는 2022년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2045년까지 우리 우주산업의 글로벌 매출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2020년 기준 우리의 글로벌 점유율은 1%대 수준에 불과하다. 우여곡절 끝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힘을 쏟게 될 과제다.
이달 1일 우주항공청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국회 간담회에서도 "정부부터 발사체 수요를 늘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선 기술적 혁신 못지않게 발사 수요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우주사업부장은 나아가 기업들이 국방 위성 발사를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장은 "국내 우주 산업이 견고하게 성장하려면 민간 수요만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방 위성을 국내 기업 기술로 쏘아 올리게 하는 등 정부에서 초기 수요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 부장은 "발사체를 4~5회 정도는 쏘아 올려야 해외에서 의뢰도 들어온다"고 부연했다. 발사장 인프라 확대에도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은 기업 몫으로 보장해야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우주청 내 산업 육성 기능이 있고, 계약방식 개선 등을 법제화 했다"며 "우주청이 출범하면 이를 이어받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