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50대로 보이는 택배기사가 지강남구 도곡동 A주상복합아파트 안내데스크에서 배송 상자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소지를 작성하고 있다.2018.07.31 © News1이승환 기자 |
"몸이 후덕한 택배기사 봤나요? 거의 다 나뭇가지처럼 앙상하지."
택배기사 15년차 임철수씨(가명·50)의 말이다. 이내 임씨는 땀범벅이 된 웃옷을 벗어던졌다. 땀방울이 바닥에 선명히 찍혔다. '나뭇가지' 같은 임씨의 팔뚝이 군데군데 그을려 있었다. 물류 단지 건물 위로 해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난 31일 오전 7시께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 주변 실외 기온은 이미 30도에 육박했다. 서늘함 같은 '새벽 기운'은 아예 느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연일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매년 겪는 여름이지만 올해 유난히 지독하다는 게 이곳 기사들의 얘기다. 임씨는 "매일 땀을 비 오듯이 쏟아내는데 살이 찔 수가 없다"며 "'폭염 수당'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 업체 한곳당 하루 30만 상자 처리…기사 휴게실 '0곳'
택배기사들은 폭염을 피할 수 없다. 잠시 쉴 곳을 '찾아' 숨을 뿐이다. 작업장 실내 화장실 입구 옆 바닥에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는 기사들이 보였다. 김지훈씨(가명‧24)는 작동이 중단된 컨베이어벨트 위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앉아 있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12시간 가까이 분류 작업 끝에 생긴 '짬'이다. 그의 주변에는 택배 상자들이 레고 조각처럼 켜켜이 쌓이고 있었다. 김씨는 "이렇게 더운 날에 기사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오죽하면 컨베이어벨트 위에 앉아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이 단지 입주 업체 한 곳마다 하루 평균 30만건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택배 업무는 크게 상·하차 작업과 배송으로 구분된다. 하차 업무란 발송인이 보내 물류단지로 들어온 택배 상자를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리는 것이다. 이후 컨베이어벨트 자동화기기가 구단위 지역으로 상자들을 분류하고 다시 세부 주소별로 나눈다.
택배기사들이 '진심 배송'이라고 쓰인 1톤(t) 규모 차량에 이 상자들을 싣는 작업이 상차다. 차량 시동이 걸리면 배송이 시작된다. 작업장에선 '분실, 파손 ZERO(제로)'라고 적힌 펼침막이 눈에 띄었다.
최근 자동화기기 덕분에 분류 작업은 그나마 수월해졌다는 게 기사들의 얘기다. 분류 작업장 개선 문제를 놓고 주요 택배회사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기사들은 "정작 개선해야 할 것은 배송 환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요즘 같은 뙤약볕 속에서 배송 수량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 2018.07.31© News1이승환 기자 |
◇ 얼마나 버틸까…"진상 고객만 없어도 할 만할 것"
수량이 많으면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적으면 임금이 줄어 고달프긴 마찬가지다. 보통 기사들은 배송 수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배송 한 건당 수수료는 850원 정도다. 주5일, 하루 200~300 상자를 배송하면 한 달에 약 400만원을 번다는 게 윤모씨(39)의 전언이다.
택배기사 7년째인 윤씨는 "아무리 노하우가 있어도 택배 업무는 해가 갈수록 힘이 들 수밖에 없다"며 "기사들도 나이를 먹으니까 체력이 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최대 복지는 임금 인상"이라며 수수료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택배기사들의 고된 노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택배였다. '기피 1순위 업종'이라 일감을 구하기 쉽고 임금 수준도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엊그제 택배 일을 처음 시작했다는 안모씨(24)는 "백수로만 살 수 없어 결국 택배 기사를 하게 됐다"면서도 "혹독한 업무 강도에 폭염까지 기승을 부려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지었다.
고된 노동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상처'다. 노동 과정에서 생긴 흉터는 결국 지워졌지만 고객이 할퀴고 간 기억의 상처는 계속 남아 있었다. "배송이 늦으면 늦는다고, 빠르면 빠르다고 항의한다", "관리실에 맡겨둔 택배 상자가 없어지면 왜 기사를 의심하냐", "다른 건 다 참아도 아들뻘 되는 젊은 사람 욕설은 못참겠다."
현장에서 만난 택배기사들은 저마다 겪은 '진상 고객'들을 털어놨다. 털어놨으나, 털어내기는 힘들어 보였다. 임철수씨는 "올해 고3이 된 딸 생각을 하며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에 오른다"며 "최소한의 예의를 고객들에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직장 정년퇴직 후 택배 기사 일을 시작했다는 심모씨(69)는 "기사 임금 떼먹는 대리점주, 막말하는 진상 고객만 없어도 일은 훨씬 할 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r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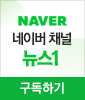









![뉴진스 해린, 신비로운 눈빛…독보적 고양이상 비주얼 [N화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5/3/6630837/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