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P)에 이은 세번째 제4이동통신 도전자다. 특히 KMI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6번이나 제4이동통신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재무건전성'과 '사업지속성'에서 정부의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매번 문턱에서 주저앉았다.KMI가 6번이나 실패한 제4이동통신에 도전하는 KFT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분할(LTE-FDD) 방식이 아닌 시분할(LTE-TDD) 방식으로 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LTE-FDD는 업로드 주파수와 다운로드 주파수가 구분돼 있지만 LTE-TDD는 같은 주파수에서 시간차를 두고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처리한다. 중국과 인도가 이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KFT는 LTE-TDD 통신기술로 망을 구축하면 '이동전화 반값 요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음성통신보다 데이터통신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통신 중심의 LTE-TDD를 구축하면 그만큼 요금이 저렴해진다는 논리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데이터 트래픽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통사들이 주파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KFT의 계획은 일견 타당하게 다가온다.
문제는 비용이다. KFT는 "자유총연맹 소속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본금 1조원 조성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밝혔다. 사업허가를 받으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2조원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2조원으로 LTE-TDD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 통상 이통사들이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6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비하면 KFT의 2조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존 이통사와 비슷한 속도를 내기 위한 주파수 대역 2개, 망을 구축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FT가 제시한 주주 구성비율은 중견기업 P사 15%, 대기업 10%, 연기금 10%, 소상공인 20%, 150개 중소기업 15%, 사업단 관계회사 10%, 단말기·LED·부품소재 등 전문업체 컨소시엄 5%, 개발·창설 등 특수기여자 무상배정 10%다. 1대 주주로 이름을 올린 P사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표현돼 있고 그 외 주주들도 '사실상 확정' 또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으로 봐서, 주주 대부분이 사업투자를 확정지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KMI가 6번이나 제4이통 도전에 실패한 이유는 실체없는 최대주주, 해외를 통한 자본조달, 이통3사 대비 떨어지는 경쟁력 때문이었다. KFT는 자금조달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주주구성이나 자금확보 진척에서 KMI와 비교우위를 발견하기 힘들다.
KFT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기전인 10월에 제4이통 사업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KFT가 사업권 신청전까지 주주구성은 물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출범식이라는 거창한 행사를 빌미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sy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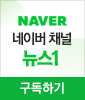










![코드쿤스트도 AOMG서 나온다…줄줄이 계약 종료 [공식]](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2/21/6492492/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뉴진스 하니, 몽환·러블리 오가는 매력...깜찍 처피뱅 [N화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26/6618937/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이민정, 이탈리아서 뽐낸 우아한 분위기...미모에 각선미까지 [N화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25/6616416/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