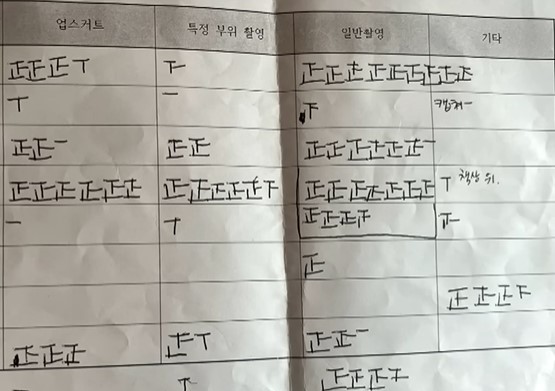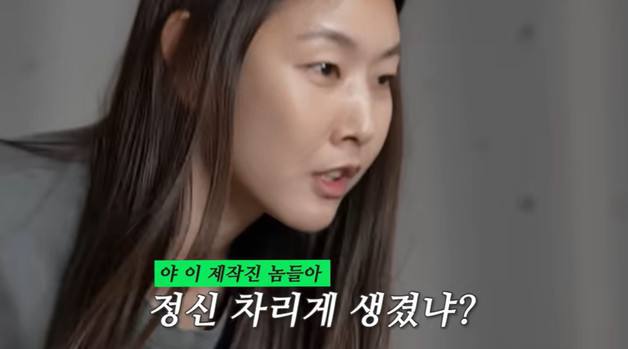'캐나다도 봄이 오나 봄' 집집마다 정원 가꾸기 한창[통신One]
꽃 심고, 야채 심고, 토마토 심고…급등하는 물가에 생계형 텃밭 열풍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에서 5월 24일은 빅토리아 여왕의 탄생일로, 주요 국경일 중 하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보통 전주 금요일부터 휴가를 시작하며, 봄을 맞아 짧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겨진다.
빅토리아 데이는 여왕의 탄생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캐나다는 진정한 봄을 맞이한다고 생각한다. 신기하게도 이날이 지나면 서리가 내리는 날도 없고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날들이 이어진다.
이 짧은 휴가 동안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집들이 봄맞이를 한다. 집 꾸미기에 진심인 캐나다인들은 봄이 되면 정원에 꽃을 심고, 흙을 갈아 새 잔디를 심거나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
그러나 최우선 과제는 민들레와의 전쟁이다. 캐나다에 꽃나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잔디에 핀 민들레를 보고 예쁘다고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는지 모른다. 하지만 알고 보니 민들레는 주택 살이의 최악의 적이었다. 주체할 수 없는 홀씨 때문이다.
겨우내 눈에 짓눌려 생기 없던 잔디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할 때, 민들레도 그 틈을 비집고 슬금슬금 나타나, 잠깐 따뜻해진 틈을 타서 마구마구 피어난다. 눈치 없는 이 녀석들 때문에 기다리던 봄을 짜증으로 맞이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민들레 홀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이웃집에까지 번식해 민폐를 일으킨다. 그래서 민들레를 방치하는 것은 큰 실례로 여겨지며, 봄이 오면 민들레부터 없애는 게 일이다.
민들레를 소탕하고 나면 잔디를 새로 심고, 튤립과 장미 등 꽃을 심으며 정원을 가꾸기에 바쁘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마트마다 공간을 확장해 꽃과 나무, 각종 씨앗과 모종, 다양한 종류의 흙을 파는 코너가 따로 마련되며,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특히 빅토리아 데이를 기점으로 하는 나흘 동안의 휴가에는 정원 판매대 수익이 전체 마트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정원수뿐만 아니라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도 심는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식품 비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직접 집에서 야채와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후로 5년 동안 사람들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팬데믹 현상에 대한 불안함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봄이 되면 전통적으로 꽃을 심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집 한쪽에 잔디를 파서 텃밭으로 변모시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각종 허브와 당근, 오이, 토마토, 상추 같은 야채를 심는다.
이러한 변화는 원예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온실, 잔디 및 종묘 산업의 총매출이 47억 달러(약 4조 7천억 원)로 2020년보다 7.5% 증가했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봄이 되면 한인 마트에서 팔고 있는 씨앗들을 사다가 텃밭을 가꾸기에 바쁘다. 캐나다의 대형 마트에서 파는 '호미'로 흙을 일구고 씨앗을 심기가 편해졌다. 한국인들의 텃밭에는 주로 상추, 열무, 고추, 토마토 등이 자라난다.
한국에서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나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농사의 '농' 자도 모르지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캐나다는 농사에 최적화된 나라이다. 강렬한 태양 빛과 적절한 바람, 적당한 시기에 내려주는 비 덕분에 그냥 씨만 뿌려 놓아도 식물들이 알아서 쑥쑥 자란다. 원예 경험의 초보자인 나 같은 사람도 토양 깊숙이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아야 하듯,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다. 신기하게 외국에 나가면 깻잎을 그리워하는 한국 사람이 많아진다. 나 역시 평소에 그렇게 즐겨 먹지 않았는데, 캐나다에 오니 흔히 볼 수 없어서 그런지 그 향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그런데 또 얼마나 다행인지 그 구하기 힘든 깻잎 씨앗과 미나리도 주변에 씨앗을 나눠주는 한국 사람을 꼭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나도 올해는 깻잎도 심고 미나리도 뿌리를 얻어다 심어놓았다.
캐나다는 고깃값이 비교적 저렴해 요리할 때 고기는 아낌없이 팍팍 넣지만, 야채값이 비싸서 파나 고추를 양껏 넣어 볼 수가 없다. 또 한국과 비슷한 재료를 애써 찾아도 똑같진 않다 보니 늘 요리의 완성도가 10% 떨어진다.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제는 '야채값이 몇 %로 올랐다'는 뉴스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마트에 가서 파 한 단을 시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의 음식 맛을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대체품을 넣어보지 않아도 요리의 완성도 100%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민들레와 끊임없는 사투가 계속되겠지만, 6개월의 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봄은 캐나다에 사는 모두에게 선물 같은 계절이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