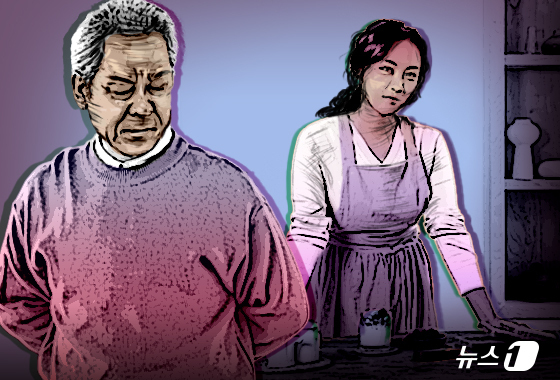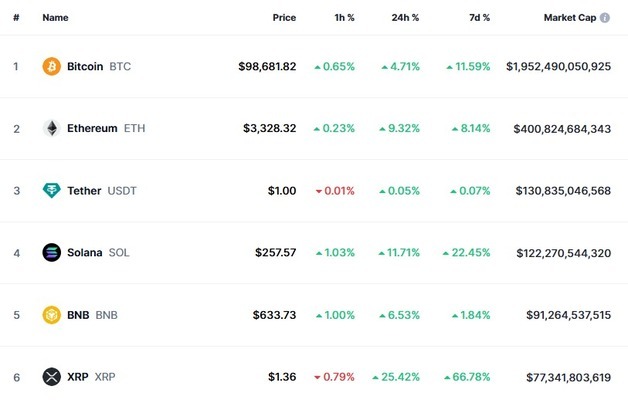성탄절 이브 美 강타한 폭설…70만 가구 정전·17명 사망
항공편 2700편 취소·6400편 지연
성탄절 당일까지 눈 최대 182㎝ 적설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전역을 강타한 혹한과 눈보라를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 등으로 인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7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폭탄 사이클론은 대서양의 습한 공기와 북극의 차가운 기류가 만나 만들어진 저기압 폭풍을 말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전 집계 전문 사이트 파워아웃티지에 따르면 이날 정전된 가구는 70만을 웃돌았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 180만 가구가 정전됐는데, 그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뉴욕의 버팔로 지역에서는 60㎝ 이상 폭설과 시속 70마일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다. 버팔로 지역 에리 카운티 보안관실의 특별 작전 책임자는 "1977년 눈보라보다 지금이 더 나쁘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처럼 미 전역을 덮친 한파와 눈보라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빙판길과 눈길에 발이 묶였다.
오하이오주(州)에서는 폭설로 4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고, 캔자스주에서도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미주리주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지며 1명이 숨지는 등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는 이날 27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6400편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25일까지 121~182㎝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NWS의 애쉬튼 로빈슨 쿡 기상학자는 "크리스마스까지 한파가 계속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아침 가장 추운 지역은 노스다코타주의 파고이며,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강타한 극강의 한파 발생 이유는 '폴라 보텍스'다. 폴라 보텍스란 북극과 남극 등 극지방 성층권에 형성되는 한랭 기류다. 보통 극지방에 머물고 있지만, 폴라 보텍스를 감싸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소용돌이가 중위도까지 내려온다. 주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오지만, 폴라 보텍스 일부가 떨어져 나와 북미 대륙에 이상 한파를 몰고 오기도 한다.
이러한 폴라 보텍스의 남하는 201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일부 기상학자나 과학자들은 폴라 보텍스가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북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 데는 지구온난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상 위험 평가회사인 대기 및 환경 연구소의 기후 과학자인 유다 코헨은 "더 따뜻한 날씨는 제트기류를 더 물결 모양으로 만들고, 이는 북극 소용돌이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NYT에 전했다.
그러면서 "팽이에 비유하자면 팽이가 물건에 부딪히며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한 것과 같다"며 "원형의 소용돌이를 잃고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며 움직이는 범위가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영국 레딩 대학교의 기후과학자인 테드 셰퍼드도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제트기류와 북극 기단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한파의 원인도 폴라 보텍스의 붕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코헨 박사의 설명처럼 폴라 보텍스가 강한 소용돌이를 만들수록 원형을 유지하며 북극에 머무는데, 폴라 보텍스가 물결 모양처럼 구불구불해진 제트기류를 따라 내려오다 보니 북극의 찬 바람이 한반도가 위치한 중위도까지 내려왔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몰아친 폭설에 정부 차원에서도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현재 날씨가 위험하고 위협적"이라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눈 오는 날과는 다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외출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yese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