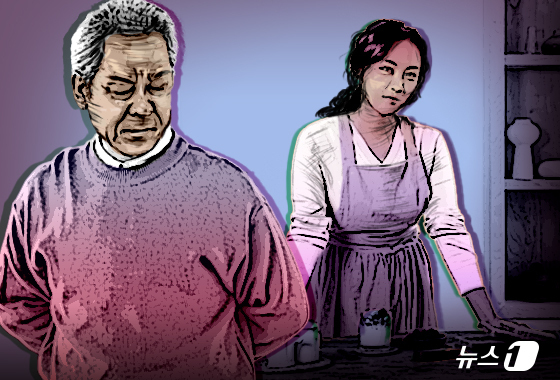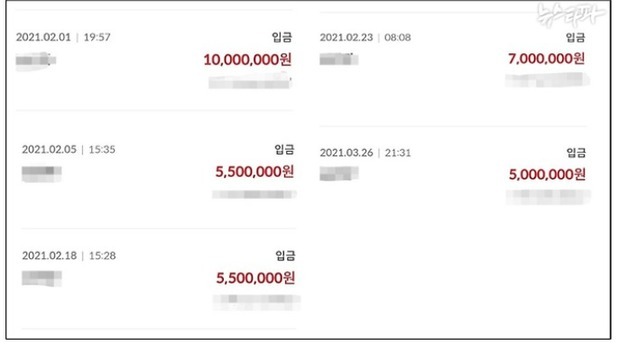'국빈으로 모셨는데'…케냐 시위에 미국-아프리카 외교 '안개 속'
미국, 아프리카 영향력 높이려 일대일로로 빚진 케냐 극진 대접
루토 대통령, 증세로 국내 인기 떨어져…시위중 5명 사망자 발생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5일(현지시간) 케냐 정부의 증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사망자까지 5명 이상 발생하면서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에게 공을 들여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지난달 20~23일 루토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성대한 대접을 받았고 이때 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케냐는 바로 전날(24일)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미국의 이 모든 노력의 성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루토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아프리카 지도자로서는 16년 만에 처음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열어주었고 예외적으로 군대 사열까지 하도록 했다. 바이든이 이처럼 부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 대통령을 환대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케냐는 당초 다른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친중·친러 국가였다. 그런데 케냐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중국 돈을 빌려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부채에 시달리게 됐다. 막대한 빚을 지면서 철도를 건설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애물단지가 됐고 빚을 갚기 위해 열차 운임을 크게 인상해야만 했다.
이에 더해 철도 사업을 계기로 중국 상인들이 들어와 케냐 상권을 위협하면서 중국에 대한 케냐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져 갔다. 미국은 이 상황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넓힐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선 케냐를 친미로 돌려 아프리카의 발판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케냐를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한 것은 케냐와 미국이 더 큰 안보 협력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었다. 루토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에서 케냐인 아버지를 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유명 인사들과 국빈 만찬을 즐기는 데서 미국의 환대는 절정을 이뤘다.
루토 대통령은 전직 미국 기업 임원인 멕 휘트먼 케냐 주재 미국 대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휘트먼은 지난해 여름 구글·애플·인텔 방문을 포함한 실리콘밸리 투어에 루토 대통령과 동행했다. 케냐는 '아프리카의 실리콘 사바나'를 꿈꾸며 점차 기술 스타트업과 혁신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휘트먼은 케냐에 미국 기업이 설립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었다.
미국과 케냐 관리들은 루토 대통령과 휘트먼 미국 대사가 종종 비공식적으로, 때로는 별다른 공지도 없이 서로 전화해 대화를 나눈다고 말했다. 케냐 야당 지도자들은 휘트먼 대사가 루토 대통령에게 지나친 호의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해 왔다. 2022년 선거에서 루토에게 패한 베테랑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딩가가 지난해 8월 “악덕 대사(휘트먼)에게 케냐인들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루토와 미국과의 관계는 각별했다.
하지만 서방에서의 인기와 미국의 비호가 국내의 인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루토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케냐의 비정상적인 국가 재정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며 일련의 강력한 경제 조처를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케냐 정부를 괴롭혀온 최고 수준의 부패를 단속할 생각은 없이 국민의 고혈만 쥐어짠다며 불만이었다. 지난해 케냐 정부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석유 제품 부가가치세를 두배로 인상했다. 이에 전국적인 증세 반대 시위가 일어나 경찰의 강경 진압에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또 증세 법안이 가결되어 대규모 시위가 다시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케냐 주재 미국 대사관은 다른 12개 서방 대사관과 함께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케냐 의회 주변의 장면에 "충격"을 받았으며 일부 시위대가 보안군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성명서는 "양측의 자제”를 요구했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