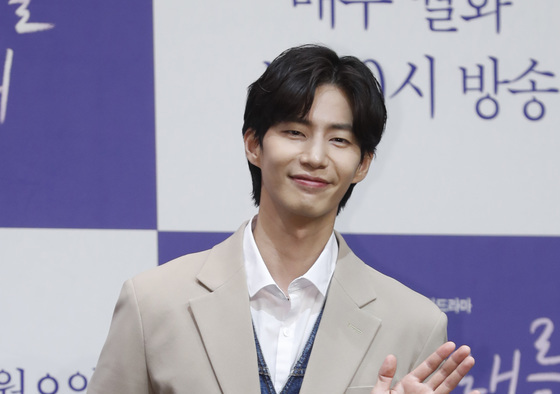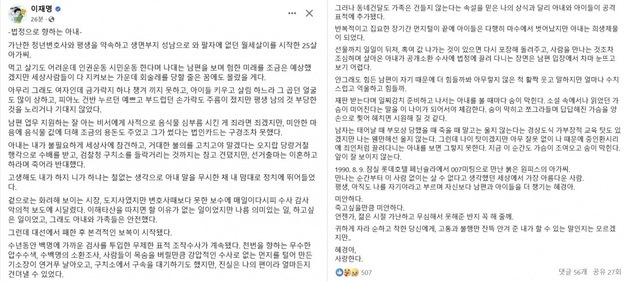'공포 여전한데'…英 경찰 사칭 범죄 1년간 부실 수사[통신One]
사건 이관받은 관할 경찰 "시간 없어서"…조사 착수 장기간 미뤄
피해자에 사과 서한 보내고도 대면 조사 안 해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에서 최근 수년간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가운데 경찰을 사칭해 여성을 위협한 사건이 부실 수사로 1년간 지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 조직의 총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국민적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영국인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잉글랜드 중부 레스터셔의 M1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시속은 80마일(시속 약 128km)에 달했다.
바깥 차선에서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를 탄 한 남성이 따라왔고 운전석 밖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왕실 문양이 새겨진 검은색 지갑을 흔들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 남성은 경찰 신분증으로 흔히 사용되는 왕실 문양이 새겨진 지갑을 흔들면서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A씨는 처음에 과속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경찰관 지위를 이용해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웨인 쿠전스와 데이비드 캐릭이 떠올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고 BBC방송에 전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한 A씨는 "차를 바로 옆에서 따라오면서 세우라고 화를 냈다"며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렸다"고 말했다.
A씨는 차를 세우는 대신 2차선에서 계속 직진했고 해당 남성은 A씨가 계속 차를 멈추지 않자 속도를 줄이더니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갔다.
A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노샘프턴셔 경찰이 조사한 결과 해당 남성은 경찰관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었고 경찰과 계약한 사설 업체 소속으로 일한 적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A씨가 신고하기 몇 개월 전 해당 업체에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민원 사건으로 최초 접수됐다가 경찰 사칭 범죄로 전환되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 노샘프턴셔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레스터셔 경찰이 사건 검토나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공소시효 6개월도 끝나가고 있었다.
A씨의 사건이 공론화되자 레스터셔 경찰은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 A씨에게 사과했다.
노샘프턴셔 경찰도 올해 2월이 되어서야 범죄 수사가 아닌 민원 사건으로 파악해 초동 조치를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A씨에게 서한으로 사과문을 보냈다.
경찰은 관련 사건 조사를 약속했지만 한 달 뒤에 해당 남성에게 전화 통화로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BBC는 전했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해당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경찰은 자택 방문이나 대면조사도 별도로 하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지 12개월이 지났던 시점이었다.
A씨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고 "여전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영국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신뢰도는 바닥 수준인데다 런던경찰청(MPS)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 경제사회연구위원회 의뢰로 지난달 발표된 경찰 신뢰도 여론 조사에서는 10명 가운데 4명만이 경찰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여론이 악화한 데는 현직 경찰이었던 웨인 쿠전스(51)의 여성 납치 살인 사건 영향이 컸다. 그는 지난 2021년 3월 3일 귀가하던 30대 여성 사라 에버라드(사망 당시 33세)에게 자신의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코로나 거리두기 규정을 어겼다'는 거짓 이유를 들어 체포했다. 이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납치,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체 납치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0월 데이비드 캐릭(49)도 자신의 경찰관 지위를 과시하면서 약 20년간 12명을 상대로 강간, 불법감금 등 49차례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해 앤디 쿡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 감찰국장은 "경찰에 대한 대중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공공안전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감찰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 고위직 채용 과정에도 개입할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tigeraugen.cho@gmail.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