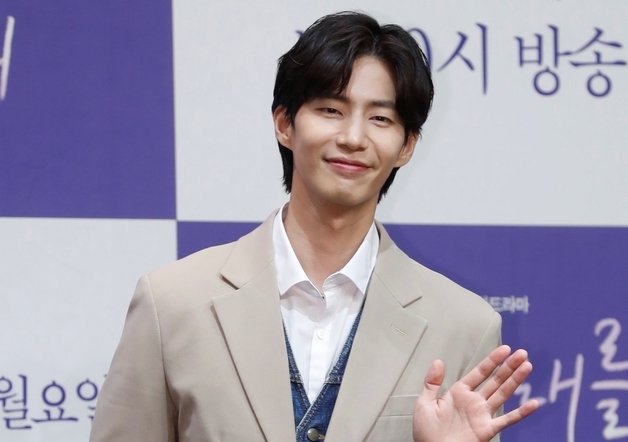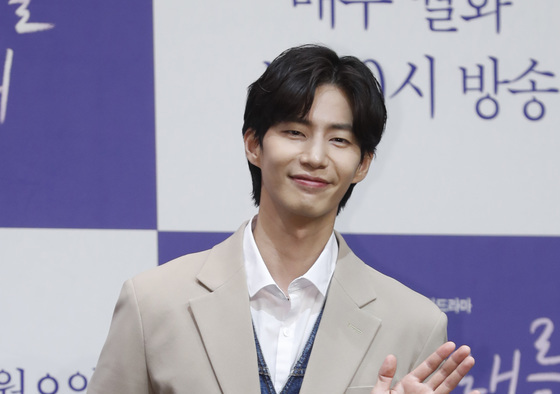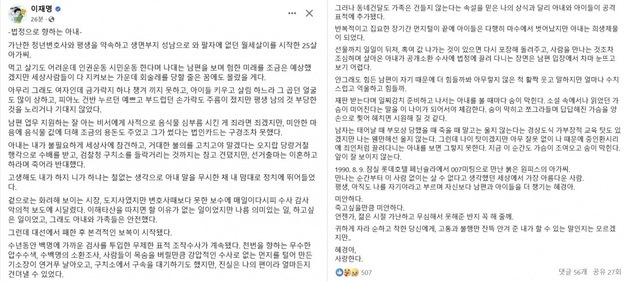걱정했던 바로 그 날씨…선선함 사라진 파리, 미친 듯 덥다 [파리에서]
공식발표 "최고 기온 35도"…체감 온도는 40도
대중교통 에어컨 미작동, 그래도 경기장 '북적'
- 문대현 기자
(파리=뉴스1) 문대현 기자 = "한국을 떠나기 전에 걱정했던 바로 그 파리 날씨다. 정말 미친 듯이 덥다"
2024 파리 올림픽의 막이 오른 지 닷새가 지난 현재, 파리는 그 어떤 수식어도 부족할 만큼 무덥다.
주축 선수들과 취재진이 파리에 도착한 23일 무렵의 날씨는 지금과 달랐다. 한낮에도 그리 더운 느낌이 없었고 심지어 아침과 밤에는 쌀쌀하기까지 했다.
이런 날씨는 며칠간 지속됐다. 개회식 당일에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로 선수들의 감기가 걱정될 정도였다. 일각에선 대회 조직위원회가 왜 선수촌에 에어컨을 들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며칠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개회식 다음 날 비가 그친 뒤 햇살이 내리쬐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움이 닥쳤다.
29일 보르도와 툴루즈 등 프랑스 남부 39개 지역에 4단계 경보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의 주황색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서 더위가 덮치기 시작했다. 30일에는 파리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다.
햇빛을 피해 음지에 있을 때는 그나마 낫지만 양지로 나오면 그야말로 '폭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파리보다 남쪽 지방인 샤토루에 위치한 CNTS 사격장은 물론이고 야외 양궁 경기가 열린 파리 중심부의 레쟁발리드도 마찬가지였다. 남자 양궁 단체전이 열렸던 30일에는 선수는 물론, 관중들 대다수가 더위에 혀를 내둘렀다.
설상가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파리 내 대중교통에는 냉방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람들의 불편함은 더욱 컸다.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기분 좋던 선선함은 없어졌으나 올림픽 흥행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다.
30일에는 평일 이른 시간부터 핸드볼, 탁구, 펜싱 등 여러 종목에 많은 관중이 들어찼다.
올림픽을 즐기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경기장 주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열을 식히거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맥주를 마시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갈증을 해소했다.
현지시간 오후 6시,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시내 중심부로 향하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 흑인 청년에게 '이렇게 더운데 왜 버스에 에어컨이 없냐'고 묻자 "파리는 원래 이런 도시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날씨가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마 며칠 덥다가 또 선선한 날씨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이었다. 그러나 여유롭던 말과 달리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15분가량 찜통 버스를 버틴 그는 목적지에서 내리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더니 인근 카페로 들어갔다.
eggod61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