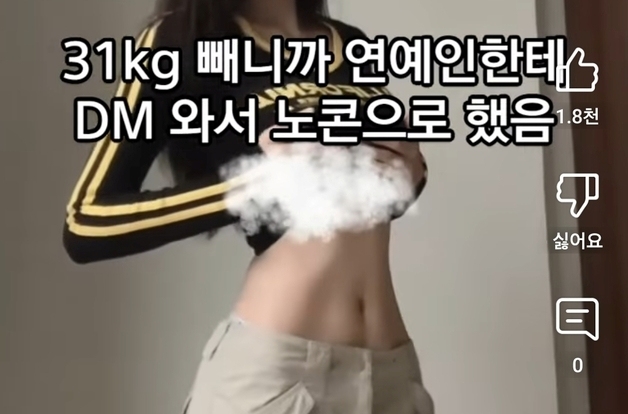김인식·김응용·김성근은 실패했는데…김경문과 한화의 궁합은
'야구 3金' 마지막 프로팀이 한화…결과는 실패
'리빌딩 종료' 선언 한화, 다시 '명장'에 기대
- 권혁준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인식, 김응용, 김성근 등 '야구 3金'은 모두 실패했다. 이번엔 또 다른 명장 김경문 감독이 한화 이글스의 구원에 나선다.
한화는 2일 밤 삼성 라이온즈전을 마친 뒤 김경문 감독의 선임을 발표했다. 김 감독은 3년 총액 20억원에 한화와 계약, 2026년까지 지휘봉을 잡는다.
김경문 감독은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를 거친 감독이다. 우승은 한 번도 없었지만 두산과 NC 모두 김 감독 재임 시절 '강팀'의 대열에 올라섰다. 특히 '제 9구단' NC의 지휘봉을 잡아 빠르게 끌어올린 것이 높게 평가받는다.
올 시즌을 앞두고 류현진의 컴백, 안치홍의 영입 등으로 '리빌딩 종료'를 선언했던 한화는 4월 이후 급격히 내려앉으며 현재 8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시즌이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웠고 그 적임자로 김경문 감독을 선택했다.
돌이켜보면 한화는 명장이 몸을 담은 적이 많았다. 초창기 김영덕 감독을 시작으로 강병철, 이광환 등 '우승 감독'이 한화 지휘봉을 잡았다.
2000년대 이후로는 소위 '야구 3金'으로 불리는 거장들이 줄줄이 한화를 맡았다. '국민 감독' 김인식, 'KBO 역대 최다 우승 감독' 김응용, '야신' 김성근이 차례로 한화를 지도했다.
하지만 '3金' 중 누구도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씁쓸하게 자리를 물러나야 했다.
김인식 감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시즌 간 한화 사령탑을 맡았다. 이 기간 포스트시즌 진출 3회에 2006년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다른 두 감독보다 성과는 좋았다.
하지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감독을 맡은 뒤 치른 2009시즌, 한화는 꼴찌로 추락했고 김인식 감독과의 인연도 거기까지였다. 한화의 '꼴찌 이미지'가 심어진 것은 사실상 이때부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한대화 감독을 거쳐 2013년 김응용 감독이 한화 지휘봉을 잡았다. 해태 타이거즈의 왕조를 구축하고,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 한을 풀어준 '명장'이었다.
하지만 칠순이 넘은 노장은 약한 전력의 한화를 구하지 못했다. 계약 기간 2년(2013~2014년) 모두 꼴찌를 면하지 못했고, 특히 신생팀 NC보다도 못한 성적으로 사상 첫 '9위'의 수모를 당했다. 당연히 재계약은 없었다.
김응용 감독의 뒤를 이은 건 '야신' 김성근 감독이었다.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의 왕조를 구축한 인물이자, 약팀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야신'도 한화에서의 마지막은 씁쓸했다. 2015년 6위, 2016년 7위로 '가을야구'를 가지 못했고, 급기야 2017년엔 시즌 도중 프런트와 마찰을 빚으며 물러났다. '3金' 중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유일한 사례다.
세 감독은 한화에서의 커리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KBO리그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많은 나이도 걸림돌이었지만, 한화에서 '실패'를 맛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한화는 김성근 감독 이후 '프랜차이즈' 출신의 한용덕, 구단 사상 최초 외국인 사령탑인 카를로스 수베로, 2군 감독 출신의 최원호를 차례로 감독에 앉혔다. 젊은 감각과 함께 변화를 꾀하며 구단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번번이 결과가 신통치 않자 다시 '명장' 김경문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김 감독은 만 66세로 이전까지 최고령이던 이강철 KT 위즈 감독(58)보다도 8살이 많다. 2018년 NC 감독에서 물러난 이후 6년의 현장 공백도 있었다.
한화는 김 감독 선임을 결정한 이후 "어수선한 선수단을 수습하고 구단이 목표한 바를 이뤄줄 최적의 역량을 보유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그룹 차원에서 '내정'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험이 많고, 지금껏 보여준 성과가 뚜렷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金' 이후 다시 '명장'을 감독으로 모신 한화, 6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온 김경문 감독의 동행은 성공적인 '승부수'로 귀결될 수 있을까.
starbury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