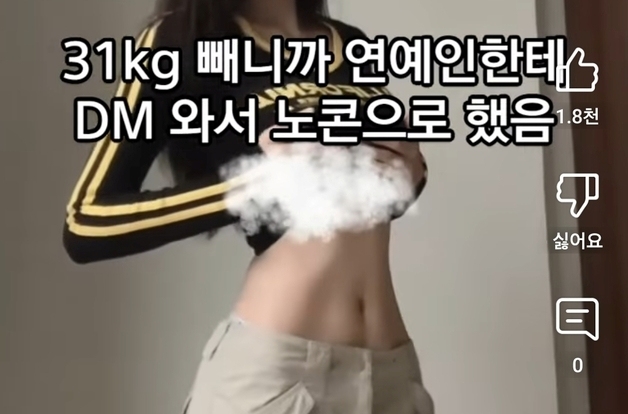'4년간의 사투 끝'…코로나19 최전선 '선별진료소', 오늘 운영 종료
2020년 1월부터 4년간 PCR 검사 1억3100만건
"'고생한다' 격려 가장 기억에 남아…국민 모두 힘 합쳐 극복"
- 천선휴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기성 기자 = "힘들었냐고요? 두렵기도 했고 혼란스러웠고 힘들었죠. 그래도 감염병 전파 예방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재난의료총괄팀에서 근무하는 김한얼 간호사는 선별진료소가 31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3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20일 문을 열어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던 선별진료소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지난 4년간 선별진료소 506개소에서 시행한 PCR 진단 검사만 1억3100만1000건.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진행 중이고 아직 자취를 감추지 않았음에도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 건 지난 5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뒤로 미뤄놨던 상시 감염병 관리나 국민들의 건강증진 역할에 힘을 써야겠다는 판단에서다.
김 간호사는 "이제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니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한동안 근무했던 장소가 없어져 조금 허한 느낌이 든다"며 "아직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를 떠올리면 많은 기억들이 스쳐간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간호사는 1년6개월간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득세하던 2022년 초에는 하루 최대 200명이 넘는 검사자를 받아냈다. 그중 확진 건수는 절반에 달할 정도로 매일 많은 환자가 쏟아졌다.
김 간호사는 "몰려드는 검진자들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중 얼마나 코로나 확진이 나올지, 나 또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지'하는 두려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매일 사람들로 넘쳐나던 선별진료소도 이젠 한산해졌다. 찾아오는 검진자도 많이 줄었다. 실제로 지난 28일 취재진이 찾은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행정요원과 검체 인력 등 5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1시간 동안 검사를 하러 온 사람은 3명뿐이었다. 이곳은 오미크론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2년에 하루에만 2000여명이 찾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행정요원으로 일한 최미경씨(59)는 "선별진료소는 9시에 문을 여는데 그쯤이면 이미 100여명의 검사자들이 보건소를 빙 둘러쌌다"며 "의료진이 몰려드는 검사자들을 맞이하려면 고무장갑을 낀 채로 계속 서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휴식도 하지 못하고 하루종일 팔을 내놓고 고생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이 입고 있는 방역복은 바이러스를 막는 고마운 방탄복이었지만 두꺼운 비닐로 온몸을 무장하다 보니 그 갑갑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인천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2년8개월간 일하고 있는 주재훈 간호사는 "두꺼운 비닐 방역복을 입다 보니 땀 배출이 안 돼 한겨울에도 옷을 벗어 짜면 땀이 한바가지씩 나왔다"며 "겨울에도 이 정도인데 여름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진선미 노원구 보건소장도 "한여름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며 "아이스팩, 아이스 조끼, 아이스 목토시 등을 다 동원해봐도 한 시간이면 직원들이 탈진했다"고 떠올렸다.
이들을 또 괴롭힌 건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초기엔 어떤 병인지 몰라 겪었던 두려움, 검사를 하면서 감염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엄습했다.
최미경씨는 "처음엔 사람들이 열도 나고 눈이 붉고 쓰러지려 하기도 해 많이 무서웠다"면서 "오미크론이 유행하던 지난해에는 장갑을 끼고 페이스 실드를 다 썼는데도 진료소 대부분 인력이 코로나에 감염돼 손이 떨릴 정도로 공포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진선미 노원구 보건소장은 "신종감염병은 초기엔 치료제도 백신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직원들도 의료인이라지만 사람이다 보니 겁먹는 건 마찬가지"라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 훈련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이들은 방역복으로 인한 고통,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이 더 컸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주재훈 간호사는 "병원 선별진료소는 의료 인력이 한정돼 있고 응급실과 같이 운영하다 보니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주로 대응했는데 경증이나 단순 검사를 원하는 분들의 원성이 컸고 욕설을 하는 분들도 있어 참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미경씨는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가 다가오면 입구 안내 담당 요원이 3분에 2명꼴로 검사를 받는 것을 감안해 대기인원을 잘랐다"며 "그러면 '왜 나는 검사를 못하게 하냐'고 난리가 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이곳에서 버틸 수 있던 이유도 검사자들, 바로 국민들이었다.
김한얼 간호사는 "방역복을 입고 답답함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중에 검진자들이 '고생한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이 됐다"며 "아직도 그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주재훈 간호사는 "추운 날씨에도 왜 이리 오래 걸리냐며 투정하지 않고 의료진을 응원해주며 핫팩을 쥐여주시던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팬데믹은 국민이 함께 극복했다. 지금처럼 힘을 합친다면 무엇이든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노원구 보건소장은 "초기에는 보건소가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 대응기간이 길어지면서 전 국민이 최전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 4년을 지나면서 보건의료행정이 절정을 이뤘고 지역의료기관, 지자체, 국민의 자원봉사가 어우러져 이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