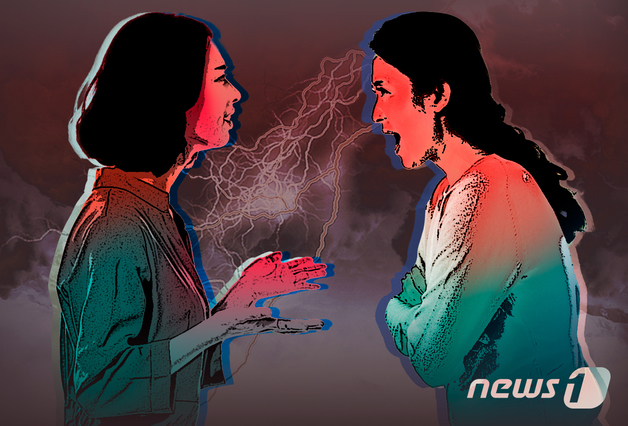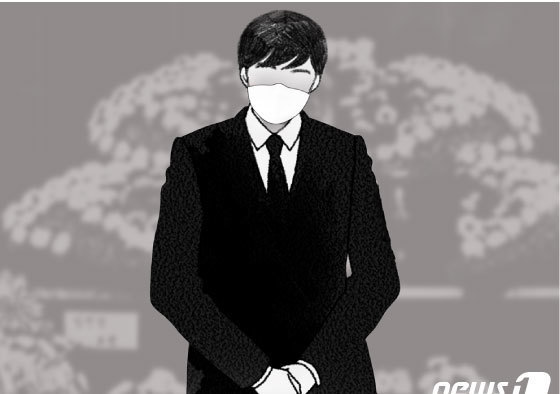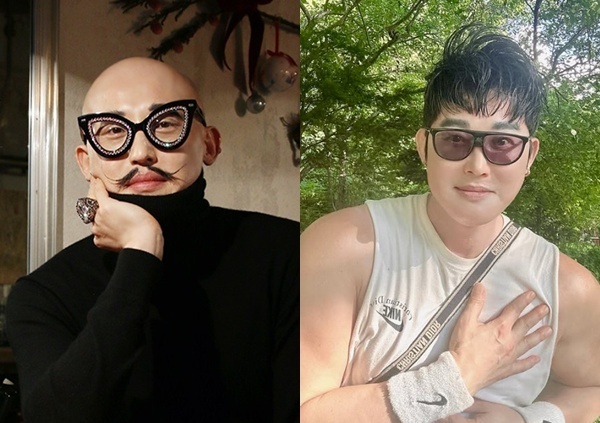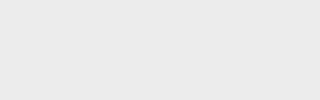
싱크홀, 반복조사로 찾아낸다…서울 조사 구간 10배 확대(종합)
취약구간 특별점검 500㎞→5000㎞로…2~4회 반복 조사
도로만 하던 정기검사에 '보도' 포함…5년 단위 전수조사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언주역, 청담역 등에 크고 작은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하는 데 따라 내년부터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금의 10배인 5000㎞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연평균 250㎞ 구간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왔으나 올해 이를 500㎞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지반침하 우려 구간 1850㎞를 선정하고 해당 구간을 2~4회 반복 조사해 연 5000㎞를 점검한다.
특별점검은 매년 시내 지반침하 우려 차도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별점검 대상인 '지반침하 우려구간'은 집중호우 시 침수구간, 노후 상·하수관, 지하철역, 침하 이력이 있는 지역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구간을 반복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워낙 지하에 기반시설이 많다 보니 상수도 등이 터지는 경우 심층부에 있던 공동(빈 공간)이 위로 점점 확장하는 경우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땅꺼짐 요인이 많다"며 "결국 반복적으로 조사를 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실제 차량형 GPR(지표 투과 레이더) 조사장비로 공동을 점검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차량형 GPR은 현재로서 외부에서 지하 땅꺼짐을 빠르게 스캔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다.
다만 지표로부터 2m까지 스캔이 가능해 심층부의 공동 등은 탐지할 수 없다.
버스가 시속 2~30㎞의 속도로 움직이자 버스 내 모니터에는 4개의 분할 화면이 떴다.
최상단에는 육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노면 촬영 영상'이 떴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도로의 아스팔트와 맨홀 등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노면 영상 아래로는 '평단면' 영상, '횡단면' 영상, '종단면' 영상 등 지표를 세 가지 각도에서 분석한 투과 영상이 표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개 화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3개 화면으로 공동 여부를 종합 판단하고, 3개 화면으로도 어려운 경우 아날로그 수신파형도 확인한다"며 "공동은 평단면 영상에서는 흐린 타원형, 횡단면과 종단면 영상에서는 산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차가 빠른 속도로 지표를 지나가는 만큼 서울시는 이후 촬영된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정밀 분석도 거친다.
공동으로 의심되는 지점이 발견되면 천공기와 내시경 등 장비를 동원해 공동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공동 대다수는 마치 시멘트를 부어넣듯 '채움제'로 빈 공간을 메꾼다"며 "규모가 작고 굴착에 따른 포장 파손 등 피해가 예상될 경우 채움제를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 매설물이 있거나 공동 크기가 크면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굴착에 들어간다"며 "굴착으로 근본적 원인 인자를 제거하고 복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별점검을 위한 전담인력과 장비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탐사 전담 전문인력은 3명에서 6명으로, 차량형 GPR 조사장비는 3대에서 5대로 확충한다.
특별점검 외에 서울시내 차도 전체를 5년에 걸쳐 빠짐없이 1번 훑는 '정기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다. 매해 조금씩 5년에 걸쳐 모든 차도를 조사한다.
이번 3회차 전수조사(2023~2027년)부터 기존 차도(6863㎞)에 보도(4093㎞)를 더해 총 1만956㎞의 보·차도에 대해 정기 점검을 한다. 기존에는 차도(6863㎞)만 조사했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땅속의 빈 공간 공동은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신속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