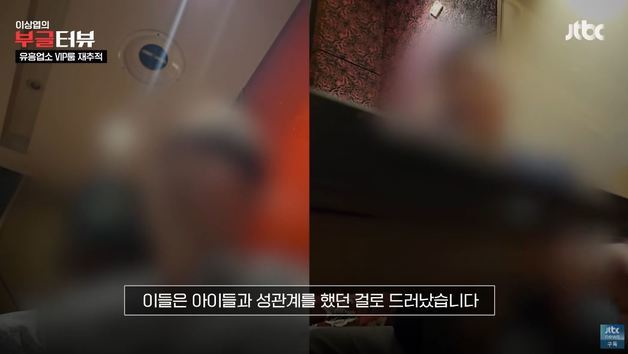독도 관광·연구는 '상륙작전'…30년째 운에 맡기며 '답보상태'
1990년 의용수비대 건의…박근혜 정부때 추진되다 '보류'
20억원 편성됐으나 매번 '불용처리'…공항 개항시 불편 늘 듯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울릉=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독도 방파제 설치가 30년째 제자리걸음 이다. 독도 환경·생태 연구 등도 '운'에 기대고 있다. 2026년 울릉공항 개항으로 울릉도·독도 탐방객이 연 10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독도 상륙 준비는 요원하다.
지난달 25~26일 환경부 출입기자단의 독도·울릉도 기후·환경·생태 취재는 독도 입도(入島) 불허로 울릉도에 국한됐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 남한권 울릉군수,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이 동행했으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파도 때문이다. 기상청 방재 기상정보에 따르면 이날 독도 인근(울릉 북동) 파도는 최고 3m를 넘겨 전 해상에서 가장 높았다.
일반적인 항구는 파도가 쳐도 접안이 가능하다. 파고를 눌러줄 방파제가 있어서다. 그렇지만 독도 접안 장소에는 방파제가 없다. 출렁거리는 동해 물결을 고스란히 안고 접안을 시도해야 하므로 물결이 높을 때는 배 파손의 위험과 인명 사고 우려가 있다.
10년이 넘었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1년 독도 방문 당시 취재는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신고 시간인 90분을 채우지 못하고 급박하게 끝났다. 파도가 높았고, 바다 안개가 들어차면서 안전상 후퇴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취재 중 만난 울릉군민은 입을 모아 "관광과 독도 수호, 애국심 고양 등을 위해서 방파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도 방파제는 학계와 경북 정치권, 울릉군민의 염원이다. 1990년대 독도 의용수비대가 이수성 전 국무총리에게 훈장을 받을 때부터 방파제 설치 건의는 이어졌다.
민간 차원에서는 나라사랑의식개혁본부가 '독도 방파제 건립 기금'을 마련하겠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국민회의 총재), 고 이건희 삼성 회장, 고 김수환 추기경 등의 애장품을 걸고 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독도에는 1997년 길이 80m의 선박 접안 시설만 설치됐고, 이후 태풍 등 위험 기상 상황에 다소간 보수만 됐을 뿐 방파제는 1m도 만들어지지 못했다.
방파제 등 독도입도지원시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예산이 편성돼 추진됐지만 결국 보류됐다. 2020년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할퀴며 접안 시설마저 파손됐다. 이후 복원은 접안 시설 일부에만 그쳤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정부에 지속해서 방파제 등을 요구했으나 지난해까지 번번이 제외됐다. 입도지원센터는 국비 20억 원이 편성됐다가 불용 처리되는 상황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한 연구예산과 독도박물관 소장유물 처리 예산도 마련되지 못했다.
2026년 울릉공항 개항에 따라 울릉도 가는 길은 현재 최대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탐방객 수는 현재 40만 명 수준에서 100만 명대로 늘 것으로 울릉군은 기대하고 있다.
덩달아 독도 방문 희망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독도 상륙은 여전히 '파도가 잔잔하기를 바라는 기도' 밖에 할 게 없다.
울릉도에서 만난 한 국립대 지질학자는 "연구 주제로 독도를 설정하는 건 극소수 국립 연구기관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독도 연구) 기회가 된다면 보다 폭넓게 독도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