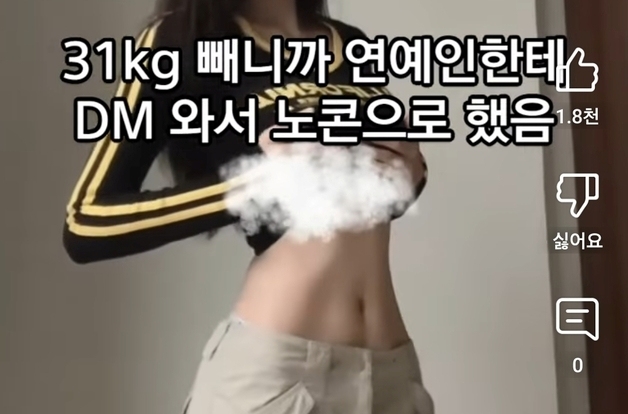美, CIA 출신 한국계 기소 이유는…안보 위협에 '정보 활동' 단속
안보 분야 '비법적' 정보 활동 통제…타국에도 '메시지'
일각선 美 지한파 학자 양성 위축 우려도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중앙정보국(CIA) 대북 정보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된 것은 미국이 '정보 활동'의 법적 권한과 범위에 명확한 선을 그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들을 만나 '비공개 정보'를 건넸다.
그는 2022년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미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메모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 검찰은 정보 제공 대가로 테리 연구원이 3400달러(약 4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2800달러 상당의 '돌체 앤 가바나' 코트 등을 비롯해 약 3만 7000달러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요원으로 지목된 이들이 테리 연구원을 위해 명품 가방을 사는 장면, 그리고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소장에 담았다.
미국은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FARA)에 따라 외국 정부나 정당, 정책 등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 즉 '로비스트'는 법무부에 신고해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2016~2022년 사이 최소 세 차례 의회 증언을 위해 선서하는 과정에서 FARA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테리 연구원과 우리 국정원 요원 간 첫 교류는 2013년부터이다. 그가 CIA를 떠난 지 5년이 되는 시점이다. 한 특정 국정원 요원과는 2016년까지 지속해서 교류해 오기도 했다. 미 수사 당국은 접촉 초기부터 테리 연구원의 동선과 대화 내용 등을 계속해서 파악해 왔다. 그의 활동을 수년간 주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테리 연구원은 현재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며 테리 연구원이 의혹이 불거진 시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미 검찰의 테리 연구원 기소 시점을 두고 외교가 일각에선 한국에 대한 우회적 경고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는 미국이 자국 안보 이익이 침해됐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정보·외교 당국에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한미 간 소통·협력이 어느 정부 때보다 굳건한 가운데 이번 조치를 한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위협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로비스트 시장에 대한 단속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한미관계가 굉장히 좋다"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려면 일종의 '희생양'을 통하지 않더라도 외교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미국의 '속내'가 무엇이든 이번 사례는 향후 한미 정부를 비롯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교환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자명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이번 사례와 관련해 "외국대리인등록법 기소 보도와 관련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