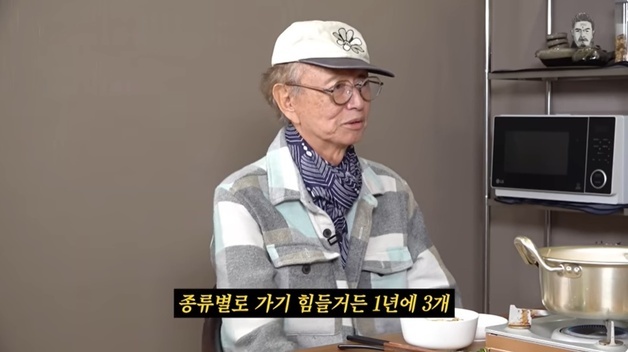'여권의 구원투수'서 한달도 안돼 사퇴압박…한동훈 거취 결론은
韓 '선민후사' 강조하며 대통령실 사퇴 요구 거절
여권 "명분은 한동훈 쪽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야" 의견 분분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권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퇴의 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던 그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과 충돌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사퇴론이 불거진 후 첫 출근길인 22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이 가진 정치적 입지를 고려할 때 중도 하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은 '마이웨이'를 외치며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를 더 세게 밀어붙이거나, 지난해 '연판장 사태'처럼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경우 불명예 하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총선 승리'라는 절박한 과제 속에서 당내 여론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명분을 갖고 있다고 보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져 한 위원장이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실제로 전날 단톡방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상 공개 저격한 이용 의원의 글에 호응한 의원은 2~3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원들이 여론 지지도가 높고 공천권을 쥔 한 위원장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선민후사(先民後私·개인과 본인이 소속된 당의 이익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를 언급하며 사퇴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더한다. 당 지도부 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접어줘야 하지 않겠나"며 "몸을 낮추기보다는 한 위원장이 정면돌파하는 방향으로 가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한 위원장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당의 대응과 관련해 본인이 명분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몸을 낮출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며칠 후 나올 여론조사에서 누가 옳은지 결과가 나올텐데 그럼 명분 싸움에서 끝난다"고 했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KBS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단톡방에 올려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정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한 위원장이 일보후퇴하고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그는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나마 여권에 초래될 상처의 크기를 작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 중도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보다 높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선거를 위해서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세게 몰아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