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가 '흑백 요리사' 안성재에 꽂힌 진짜 이유[이승환의 노캡]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 심사평이 던지는 시사점
엄선된 작품 같은 요리로 '맛의 전시회' 여는 셰프들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고급 정찬'을 의미하는 '파인 다이닝'(fine dining) 레스토랑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21년 겨울이었다. 당시 여자 친구였던 아내에게 청혼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나와 아내는 현대미술관 같은 레스토랑 복도를 지나 순백의 천을 덮은 원형 테이블 앞에 앉았다.
레스토랑의 공기는 우리를 진중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목소리 톤을 낮추며 기품과 매너를 장착하려 했다. 이윽고 녹색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했다는 이탈리아·한식 퓨전 요리들이 하나씩 펼쳐졌다. 대형 캔버스 정중앙에 점 하나를 그린 미니멀리즘 예술을 떠올리게 하는 요리였다. 반듯하게 머리를 손질한 직원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조곤조곤 음식을 설명했고 우리는 일단 고개를 끄덕이고 봤다.
그날의 기억은 이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다시 방문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기념일 아니면 올 곳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인스타그램 허세용 식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보여주기에 몰입하거나 부유한 이들을 타깃 삼아 소량의 음식을 비싼 가격에 팔아 마진율을 극대화하는 곳이라고 지레짐작했다. 아무리 만석을 기록했어도 엄선된 재료비용과 인건비 부담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파인 다이닝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제부터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예상했을 것이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얘기다. 역대급 '출연진'이라고 호평받을 만큼 국내외 정상급 셰프 100여 명이 '흑백요리사'에 등장한다. 이 중에서도 백미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안성재 셰프다. 그는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유일의 미쉐린(미슐랭) 3스타 셰프로 국내 파인 다이닝 업계에서 전설로 꼽히는 인물이다.
안 셰프의 심사평을 확인하면서 '파인 다이닝은 허세용'이라는 내 생각이 상당 부분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깨달았다. 예컨대 안 셰프는 이탈리아의 남부 지방 나폴리를 표현한 생면 파스타와 감자 요리의 맛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요리에 얹힌 식용 꽃이 문제였다. 안 셰프는 "전혀 필요 없는 재료인데 꽃을 얹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쓴소리했다. 식용 꽃이 음식 맛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허세용'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았다.
아무리 캐비어나 트뤼프가 진귀하고 호화로운 재료여도, 맛의 균형(셰프들 표현으론 '발란스')을 무너뜨리며 사용하는 것에 격분하는 셰프가 많다고 한다. 겉멋과 허세보다 음식의 본질인 맛에 집중해 차별화하고 절정의 풍미를 구현해야 한다는 소신에서다. 재료를 재해석하고 기교보다 절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파인 다이닝 요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확산한 미니멀리즘 예술과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셰프들은 요리를 단순히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고객의 혀 안에서 격조 높은 전시회를 연다는 자세로 요리에 임한다. 고객이 미각을 통해 상아탑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다.
'전복 타코'가 대표 작품인 안 셰프의 철학은 그가 유행시킨 '이븐'(even·고르게)이란 표현처럼 균형을 근본으로 삼는다. 글 쓰는 사람에게도 시사점을 던지는 대목이다. 글의 흐름이나 맥락, 주제와 맞지 않은 원색적이고 현학적인 표현을 썼다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 절제보다 기교에 의존한 결과다. 매일 글 쓰는 기자도, 전업 작가인 소설가나 시인도, 지식수준이 높은 학자들도 예상외로 이런 우를 자주 범한다.
이런 글은 한시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지만 눈 밝은 독자나 동료 글쟁이들을 속이지 못한다. 이쯤에서 "완성도 없는 요리의 테크닉은 테크닉이 아니다"는 안 셰프의 소신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글도 기교와 수사만으로 독자에게 울림을 주지 못한다. 오래 기억에 남은 글은 대체로 표현이 정제되고 메시지가 명료한 글이다.
'흑백요리사'의 클라이맥스는 안 셰프가 에드워드 리의 요리를 평가할 때 이르렀다. 한국계 미국인인 에드워드 리는 '미슐랭 스타'를 총 15개까지 확보했던 고든 램지와 동급으로 평가받는 셰프이다. 에드워드 리는 생참치를 재해석한 비빔밥을 내놓았는데 자신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표현하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숟가락으로 비벼 먹는 전통 비빔밥과 달리 칼과 포크로 잘라 먹어야 하는 요리였다. 안 셰프는 전달하려는 의도가 뚜렷하지 않고 비벼 먹어야 하는 비빔밥의 본질과 엇물린다며 요리 거장 리에게 낮은 점수를 줬다. 안 셰프의 이 같은 평은 만점에 가까운 97점을 준 백종원과 대비되며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안 셰프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한가지만큼은 인정할 것이다. 그의 심사 기준과 원칙이 일관됐다는 점을 말이다. 한 누리꾼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가 안 셰프를 보고 배워야 한다"는 기사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안 셰프의 심사평에 몰입한 나는 이 글의 퇴고를 거듭하면서 유심히 살펴봤다. 이 칼럼에서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한지, 기교만 부린 것은 아닌지, 균형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글이 '이븐'하게 무르익었는지… 심사는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준 <뉴스1> 독자들의 몫이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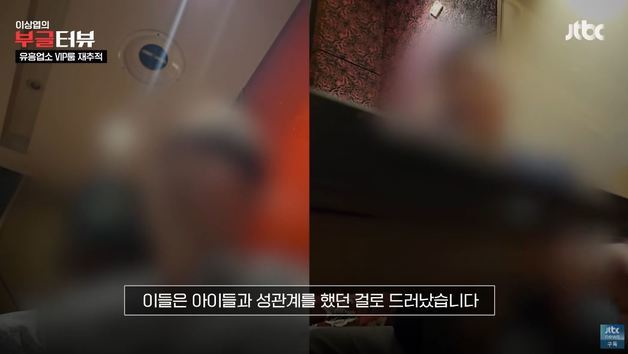









편집자주 ...신조어 No cap(노캡)은 '진심이야'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캡은 '거짓말'을 뜻하는 은어여서 노캡은 '거짓말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요. 칼럼 이름에 걸맞게 진심을 다해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