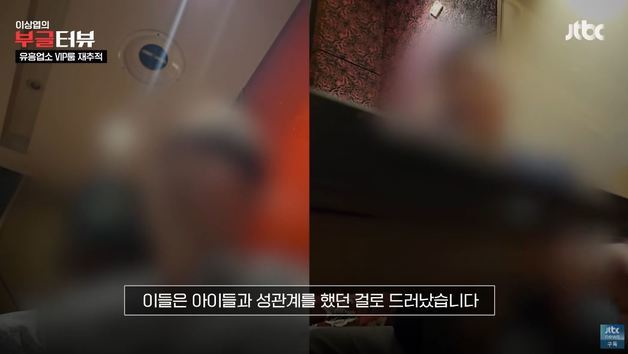박현우 시인 '멀어지는 것들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다'시집 출간
시인의 연민과 성찰이 내 안의 강으로 흐르는 관조의 미학
- 조영석 기자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박현우 시인의 '멀어지는 것들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다' 시집이 '문학들 시인선'으로 출간됐다. 첫 시집 '달이 따라오더니 내 등을 두드리곤 했다'에 이어 4년 만에 두 번 째 시집을 펴냈다.
'생각의 자리' '꽃의 이면' '멀어지는 것들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러고도 한동안' 등 네 다발로 나뉜 87편의 시가 실렸다.
이번 '멀어지는 것들은...'에 실린 시들은 고희(古稀)를 앞둔 시인의 시선이 편마다 낮은 선율로 맑게 흐른다. 하지만 시선은 정의(定義)보다는 적당한 관조의 거리에서 넌지시 독자의 소매를 끈다.
'옆집 원룸 아주머니는/ 꽤나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하다는 반려견을/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시킨다/ 한 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쉬엄쉬엄 가는 개의 길을 따른다/ 아저씨 보내고 함께한 정이/ 배설물 치우는 일이라며/ 까맣게 탄 듯한 속마음 비치더니/ 휴지 몇 장 꺼낸다/ 눈발 그친/ 짱짱한 겨울 아침에.' 그의 시 '속마음'의 전문이다.
'늙은 개'를 산책시키다 배설물을 치우며 '먼저 간 영감'을 생각하는 아주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린 시다. 시인은 다만 '짱짱한 겨울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서사할 뿐이다. 정의의 깊이와 색깔은 독자의 개별적 몫으로 남겨 놓았다.
그는 또 '문득'이라는 시에서 '눈에 밟히는 것들은/ 마음에 남는 법/ 밤새 뒤척인 흔적들 널브러진 방/ 쓸고 닦다 나를 돌아보면/ 손바닥에 홀로 남던 부끄럼들// 뒤집힌 뻘물이/ 바다를 살찌우는 것이라 끄덕인/ 외딴 섬들이 다가오기도 하여/ 한 물에 든 희로애락까지/ 휑거야 할 시간이지만// 짜낸 것만큼 얼룩진 낯선 시선들 있어/ 비워야 빛나는 것들 주무르며/ 마음에도 걸레 하나 챙겨둘 일이다.'고 했다.
살다보면 부끄러운 일도 마음에 남게 되는 법이니 '마음을 닦는 걸레'하나 쯤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양심 좀 지키고 살라'고 말하기에 앞서 자신의 부끄럼을 먼저 생각하는 시인의 감성이 아리다.
시들을 읽다보면 여름날의 마른 대지를 적시는 강물처럼 시인의 연민과 성찰이 내 안의 강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임동학 시인은 "시인의 이번 시집을 지배하는 기본 기분은 '고독'이다. 하지만 그의 고독은 자연적이고 공동체적인 향수로 만족하지 않는다. 주어진 사회와 길항작용을 하면서 그것에 활력을 부여하는 일종의 원형으로 대사회적이고 현재적인, 이른바 '의로운 고독'으로 이어진다"고 서평에 썼다.
박현우 시인은 전남 진도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그만 두고, 시를 베개 삼아 살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이사를 지냈고, 부인 이효복과 부부 시인이다.
kanjo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