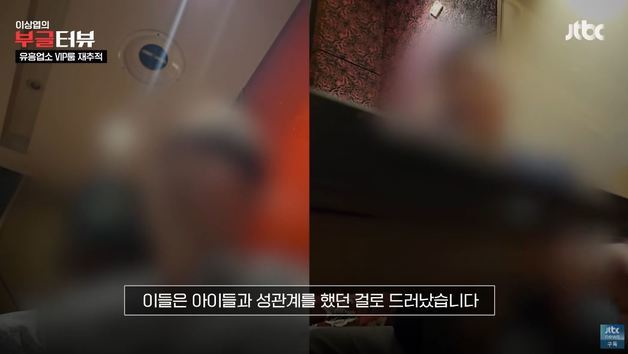[신용석레인저가떴다] 땅끝의 끝산…평평한 두륜봉에 서면 광활한 다도해
두륜산 오심재~가련봉~대흥사 9㎞…가을이 가장 오래 머물다 가는 산
초의선사가 김정희·정약용과 교류한 대흥사…만일암 절터 천년수 기품 '압도'
- 신용석 기자
(서울=뉴스1) 신용석 기자 =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저무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단풍이 매달려 있을 국토의 끝 산을 간다. 해남의 두륜산이다. 두륜산(頭輪山)은 백두산의 ‘두’자와 중국의 전설적인 산인 곤륜산의 ‘륜’자를 딴 이름이라는 설이 있고, 산이 둥그스럼하게 솟은 모습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설이 있다. 큰 산이란 의미의 대둔산(大芚山)으로도 불렀다.
그런데 기자는 좀 다른 생각이다. 이 산을 처음 보았을 때 무릎을 탁 치며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 했었다. 대흥사 입구에서 보면 산 정상부를 이루는 고계봉과 노승봉·가련봉이 두 개의 바퀴(輪)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옆의 두륜봉은 수레바퀴를 엎어 놓은 것처럼 둘레가 둥글고 위가 평평하다. 그래서 두륜산 아닐까.
두륜산에 오르면 광활한 다도해 바다 멀리 한라산까지 보이고, 산 아래에는 1500년 역사의 대흥사가 자리하고 있다. 대흥사에는 다성(茶聖) 초의선사가 다산(茶山) 정약용, 추사(秋史) 김정희와 교우한 스토리가 남아있고, 호국불교의 리더였던 서산대사를 기리는 사당이 있다.
조선 후기의 학자 홍석주가 말했다. “두륜산 정상에서 바다를 보니 이전에 보았던 것은 바다가 아니었고, 산 밑에서 대흥사를 보니 전에 본 절은 절이 아니었다!” 라고. 그런 두륜산을 간다.
◇ 오소재~오심재~가련봉 2.6㎞ "스님 머리처럼 생긴 노승봉, 연꽃 봉오리처럼 생긴 가련봉에서 광활한 세상을 조망"
두륜산에 다가서며 남도의 전형적인 가을풍경을 통과한다. 논도 밭도 비어있는 들판은 황톳빛에 잠겨있고, 물 마른 도랑에는 키 큰 갈대와 작은 억새들이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다. 마을 언저리엔 커다란 느티나무가 빈 가지로 우산 같은 동그라미를 만들었고, 가깝게 붙어 웅크리고 있는 집들 사이로 교회의 탑이 도드라져 있다. 동네는 빈 마을처럼 조용한데, 수확을 다 끝내고 느긋한 낮잠을 자는 모양이다.
멀리서 보았을 때 거의 누워있던 두륜산이 다가설수록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오소재(烏巢峙) 주차장에 도착한다. 두륜산 정상에 가장 빠르고 쉽게 올라설 수 있는 길목이다. 잿빛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가랑비가 추적추적 떨어진다. 우중 산행이 나쁘진 않지만 사진 찍을 일이 걱정이다.
등산로 초입의 오솔길에 낙엽들이 바삭거리다가 점점 비에 젖어 소리를 낮춘다. 부드러운 오르막이지만 길이 길어지자 이마에 땀이 맺히고 머리카락이 젖는다. 우비를 입고 가던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차라리 비를 맞겠다고 비닐을 벗는다.
40분쯤 걸어 올라선 오심재는 시골학교 운동장처럼 넓고 노랗다. 운동경기에서 ‘잘못 판정’하는 것을 오심이라 하는데, 이 고개의 이름은 ‘정확하게 판정’하는 오심(悟心/깨달음)이다. 여기까지만 와도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는지, 빗방울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 점심 먹는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다.
오심재까지는 워밍업하는 길이었고, 상투처럼 뾰족하게 생긴 노승봉까지는 가파른 오르막이다. 돌계단 옆으로 진달래가 빽빽하다. 지금은 뼈만 앙상하지만 봄에 물이 오르면 분홍 꽃잎들이 흐드러질 것이다. 오르막 중간에 길에서 살짝 비켜나 있는 흔들바위에 들린다. 설악산 흔들바위가 생각나는 ‘미니 흔들바위’다. 올라오는 사람마다 한 번씩 흔들어 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좋다. 산 아래 대흥사가 반듯하게 보이고, 산너울 너머로 다도해가 호수처럼 떠 있다.
다시 가파른 흙길을 오르면 헬기장 언덕이 나오고, 여기부터는 더욱 가파른 암릉이다. 예전에 바윗길을 기어오를 때 썼던 철제 발판과 쇠사슬 옆으로 지금은 계단이 설치되어 편하게 오른다. 계단 끝의 정상 직전에 설치된 쇠줄을 힘껏 당겨 올라서니 노승봉이다.
노승봉(老僧峰/685m)은 이름처럼 스님의 머리와 닮았다. 나무 없이 반들반들한 암반이다. 손바닥만 한 정상석 밑은 아찔한 벼랑인데 센 바람이 훅 불어오니 사람들이 휘청거린다. 무사히 사진을 찍으려면 다리에 힘을 주어야 한다.
산과 들판과 바다를 내려다 본다. 자욱한 안개 밑으로 내리 깔린 풍경이라 담담하고 담백하다. 가까운 산들은 벌겋고, 먼 산들은 푸르다. 바둑판 같은 들판은 누렇고, 조약돌 같은 마을은 하얗다. 바다는 옅은 남색이고 섬들은 청색이다.
지척에 있는 건너편 바위봉우리가 꽃봉오리처럼 피어 있다. 두륜산의 정상인 가련봉이다. 짧은 내리막을 걸어 암릉의 허리를 돌아 가련봉에 오른다. 오소재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반쯤 걸렸다.
가련봉(703m)은 부처(迦)의 연꽃(蓮)처럼 생긴 봉우리란 뜻이다. 기자에게는 가련하게 보인다. 높이만 조금 높을 뿐, 인근의 노승봉과 두륜봉에 비해 정상의 생김새가 옹색하고, 쪼그마한 정상석은 더욱 가련하게 보인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안개가 엷어지며 시야가 트인다. 동쪽으로 황톳빛 벌판 끝에 강진만 바다가 기다란 호수처럼 박혀있고, 남쪽으로 여러 섬이 군함처럼 떠있다. 북쪽으로는 저 멀리 첩첩한 산들이 가느다랗게 늘어서 있다. 북서쪽으로 살짝 높은 곳이 무등산인지, 중간은 월출산인지, 그 뒤에 어렴풋한 선은 지리산인지 대충 가늠해 본다. 다시 구름이 몰려와 빠르게 흩날리며 시야를 가린다.
◇ 가련봉~두륜봉~대흥사~집단시설지구 6.4㎞ "천년 느티나무, 천년 사찰, 천년 숲길에서 깊은 사색을 하다"
쉽게 올라섰던 가련봉인데, 내려서는 길은 암팡지다. 깎아지른 벼랑으로 가파른 계단을 냈고, 암릉에 박은 쇠발판을 딛고 쇠고리를 잡아당기며 짧은 스릴을 맛보는 지점도 있다. 20분쯤 내려서면 조릿대와 억새가 빽빽한 만일재다.
만일재 밑에 있는 천년수(千年樹)를 보기 위해 200m를 내려선다. 해를 붙잡아 지지않게 하겠다는 이름뜻을 가진 만일암(挽日庵) 절터에, 5층 석탑 하나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로 떨어져서 외롭게 서있다. 공곡유란(空谷幽蘭), 깊은 골짜기에서 나홀로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난초처럼, 고고한 기품이 외로움을 압도하는 분위기다. 손을 대보니 돌탑에서도, 노목에서도 따듯한 온기가 느껴진다. 1200년 된 느티나무의 검은 껍질에 이끼가 끼고, 거기에서 1년생 일엽초가 초록초록하게 자라고 있다.
다시 만일재로 올라가 두륜봉으로 오른다. 거대한 바위산의 허리를 돌아, 두 개의 바위 사이에 꽈배기처럼 연결된 ‘돌 구름다리’를 통과하면 곧 두륜봉이다. 정상석에 이렇게 쓰여있다. “산은 오르되 이름은 없고/ 천년을 기리는 마음으로/ 젊은 피땀으로 세웠다/ 해남 사랑 청년회.”
이제 두륜산 정상에서 마지막 풍경을 본다. 지나온 가련봉의 뾰족한 봉우리가 하늘로 쏘아 올려질 듯하고, 산 아래 너른 벌판이 바다로 마구 달려들어 가는 역동적인 풍경을 가슴에 담는다. 올망졸망한 섬들 너머로 하얀 수평선 끝의 안개를 걷어내면 한라산이 톡 솟아있을 것이다. 마음의 풍경을 그려본다.
하산길은 가파르다. 기다란 계단 끝에 기다란 너덜 길이 온통 갈색 노랑 빨강 낙엽들로 소복하다. “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며 끝까지 나뭇가지를 부둥켜안고 있는 갈참나무와 당단풍나무의 오그라진 가랑잎들이 허공에서 펄럭댄다. 비는 그쳤지만, 빗물을 머금은 조릿대 잎들이 내가 지나갈 때마다 물을 털어내 바지가 다 젖었다. 기분 좋은 축축함? 이런 느낌을 즐기며 30분쯤 내려서면 진불암(眞佛庵)이다. 절이라기보다는 공부방처럼 생긴 아담한 절집 옆에 400년 된 붉가시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고, 그 아래에서 예쁜 소녀가 험악하게 생긴 검정 개를 순하게 다루고 있는 풍경이 너무 평화스럽다.
짧은 아스팔트 길과 기다란 오솔길을 30분쯤 걸어 대흥사 경내로 들어선다. 첫 번째 마주하는 전각들은 서산대사를 기리는 표충사(表忠祠)다. 대사가 서산(묘향산)에서 임종을 맞으며 자신의 옷과 밥그릇을 대흥사에 보관시키라고 유언을 했다. 두륜산이 그만큼 기운이 좋고 안전한 곳이라는 이유를 붙였다.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서산대사의 유품이 이곳에 보관됨으로써 대흥사(大興寺)는 국가의 ‘특혜’를 받아 이름처럼 큰 사찰로 발전했을 것이다.
대흥사에는 조선시대의 명필 김정희와 이광사, 그리고 정조대왕의 글씨가 걸려 있고, 산세와 어우러진 전각들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깊다. 대흥사는 “차를 마시며 진리를 깨닫는다”는 다성(茶聖) 초의선사(草衣禪師)의 절이다. 인근의 강진에서 18년 간 유배를 당했던 정약용이 스님이 준 차를 마시며 울분을 삭이고 외로움을 달래며 글을 썼다고 한다. 그의 호가 다산(茶山)이다.
대흥사 일주문 입구에 있는 유선관(遊仙館)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었는데, 어느새 리모델링을 해서 한옥호텔로 변신해버렸다. 1913년에 지었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의 아담하고 소박했던 정원, 반질반질하게 빛나던 툇마루, 그리고 한 상 가득했던 남도의 ‘집밥’을 추억한다.
대흥사에서 주차장까지 10리 숲길을 걷는다. 아홉 번 굽이지는 길에 아름다운 숲이 있다고 해서 구림구곡(九林九曲)이라 했고, 지금은 ‘땅끝 천년 숲길’이라 부른다. 쭉쭉 뻗어오른 소나무와 편백나무가 푸릇푸릇한 가운데, 낙엽지는 단풍나무와 왕벗나무가 가을가을한 숲의 터널이 계곡 옆으로 쭈욱 이어져 있다.
두륜산 대흥사, 이곳의 주소는 장춘동(長春洞)이다. 봄이 긴 고장이란 뜻이다. 계절도 그렇지만, 삶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말하는 ‘봄날’이 이곳에 있다. 그러니 두륜산은 끝이 아니라, 봄처럼 다시 시작하는 산이다. 여행가 한비야는 땅끝에서 한반도 종주를 시작하며 이렇게 썼다. “끝이라니, 나에게는 설렘으로 가득 찬 시작이다!”
무언가를 정리하든 새로 시작하든, 두륜산에 올라 광활한 산과 벌판과 바다를 내려다보며 꿈과 용기를 내기 바란다. 천년 숲길을 걷거나, 대흥사를 산책하거나,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氣)를 얻고 사색이 되는 곳, 이곳은 해남의 땅끝 두륜산이다.
stone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