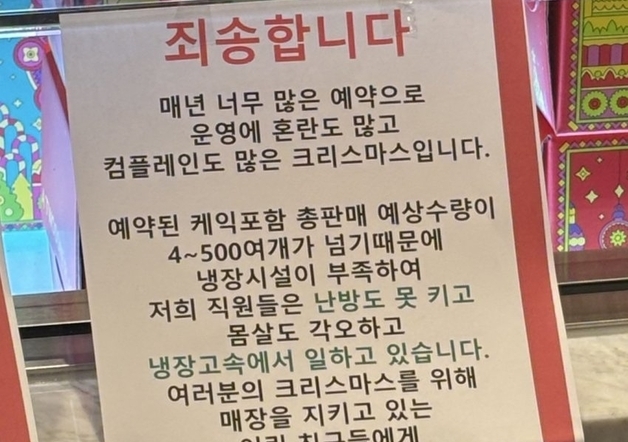[신용석레인저가떴다] 세월의 나이테인가, 적벽강…연보랏빛 꽃 향연, 변산향유
변산반도국립공원② 변산해수욕장-격포-솔섬 22㎞ 정겨운 '마실길'
채석강 걸으니 7천만년 전 공룡 된 기분…아기 손만한 솔섬 '노을 명소'
- 신용석 기자
(서울=뉴스1) 신용석 기자 = 변산(邊山)은 육지의 가장자리(邊)에 있는 산이다. 지난번에 둥글둥글한 산이 겹쳐있는 내변산과 내소사를 다녀왔으니, 이번에 ‘진짜 가장자리’인 외변산 바닷가를 가야 변산을 제대로 다녀오는 것이다. 외변산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쪽저쪽의 풍경과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삶의 방식도, 사람들의 사연과 이야깃거리도 많다. 그래서일까, 외변산의 가장자리를 걷는 길의 이름이 마실길이다.
마실은 이웃사람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정보도 주고받고, 음식도 먹으며 즐겁게 지내는 ‘일’이다. 어릴 때 고향의 어른들은 툭하면 “마실을 간다”며 집을 비웠다. 단순히 “놀러 간다”는 의미를 넘어, 반드시 해야 하는 사회활동으로 여겼다.
변산 마실길은 북쪽의 새만금홍보관에서 남쪽의 줄포만 갯벌습지공원까지 바닷가의 마을과 마을을 이은 66㎞의 길이다. 구간의 특징에 따라 8코스로 구분했다. 기자는 1코스의 종점 부근인 변산해수욕장에서 4코스 종점 솔섬까지 약 22㎞의 길을 간다. 3코스에 외변산의 대표 명소인 적벽강과 채석강이 있다. 인터넷에서 물때표를 검색해 물이 빠져 있는 시간에 걷는 것이 여러 풍경을 보고 체험을 하기에 좋다.
◇ 변산해수욕장-적벽강-채석강 14.5㎞ “백사청송(白沙靑松) 해수욕장 끝에 7천만 년 전의 공룡시대 풍경”
변산해수욕장의 데크 전망대에 올라 하얀 백사장과 푸르스름한 바다, 멀리 흐릿한 고군산도를 바라본다. 잔뜩 움츠린 날씨와 바다안개에 가려 시야는 짧지만, 이 정도라도 가슴이 뻥 뚫린다. 주중이라 좀 썰렁한 백사장 옆으로 소로를 걸으며 갯그령, 통보리사초, 갯메꽃, 해당화 등의 모래식물을 만나고, 소나무 방풍림을 통과한다.
굵은 소나무 몇그루가 바람에 휘어져 자란다. 변산의 소나무는 변재(邊材)로 불릴 만큼 곧고 단단하여 궁궐을 짓는 재목으로 활용되었다. 그것까지는 좋았으나, 고려시대에 원나라가 일본 정벌을 하기 위한 전함(戰艦) 건조를 강요해서 많은 재목이 잘려나갔고, 일제강점기 때도 전쟁목적으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잘려나갔다. 미인박명(美人薄命)이다. 여기 휘어져서 징발되지 않은 소나무들이 변산소나무의 명가(名家)를 잇고 있다.
변산해수욕장을 지나면 곧 송포선착장이 나오고, 그 끝의 탐방로를 따라 얕으막한 동산에 오른다. 이곳은 예전에 해안경비를 서던 길이다. 녹슨 철조망에 소원을 적은 하얀 조개껍데기가 쭉 걸려 있다. 그래서 철조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하나도 없다. 이 오솔길의 바닷가 모서리에 데크 전망대가 있고 주변은 온통 샤스타데이지 꽃밭이다. 핫플(유명한 장소)로 이름 나 ‘액자뷰 샷’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이 많다.
철썩대는 파도소리를 듣고, 흐릿한 비린내를 맡으며, 펜션타운의 시멘트길도 걷는 해안길 끝에 고사포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인다. 고사포에 대포는 없다. 지형의 생김새가 북(鼓)을 치고 거문고 줄(絲)을 타는 명당이라 고사포(鼓絲浦)다.
고사포는 2㎞에 이르는 백사장 안쪽으로 소나무숲이 빼곡하게 들어찬 캠핑 명소다. 국립공원야영장이라 시설도 좋고 야영지 간격도 충분하고 가성비도 좋다. 이용객이 많아 성수기 주말에는 예약이 쉽지 않다. 국립공원공단의 예약시스템에서 매월 2회 오후 2시에 예약창이 열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경합을 벌인다. 주변에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도 있다.
고사포해수욕장 입구의 편의점 앞에 선 여행객들 주변에 괭이갈매기들이 몰려들었다. 새우깡을 먹기 위해서다. 한 봉지를 다 털고 여행객이 돌아서자, 갑자기 몇몇 괭이갈매기가 “꽉~꽉~”하며 괴성을 지른다. 더 달라는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사람음식을 주면 그 동물은 야생에서 살아나갈 생존력을 잃는다.
일부 블로그에 고사포에서 해루질을 즐겼다는 내용이 있다. 해루질은 밤에 물 빠진 갯벌에서 불빛을 비추어 어패류를 잡는 일이다. 재미로 하더라도 잡은 생물은 관찰만 하고 놓아주기 바란다. 해양생물들에 의해 갯벌생태계가 잘 유지되어야 그들에 의해 생명력 있는 갯벌과 깨끗한 백사장이 유지된다.
해안가를 더 걸어 하섬이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전망대에 선다. 작은 섬이 새우(鰕) 등어리 또는 연꽃(荷)같다 하여 하섬이다. 하섬과 육지 사이는 간조 때에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빠지는 날이 있다. 물 빠진 모래갯벌에서 지체하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종종 사고를 당하는 장소다. 예전에 하섬에 들어가 생태조사를 하던 국립공원연구자들이 연구의욕이 지나쳐 지체하다가 생사를 달리한 슬픈 장소이기도 하다.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해안도로에 세운 비석을 쓰다듬고, 다시 걷는다.
드디어, 바다 쪽으로 담장 같은 절벽이 쭉 뻗은 적벽강에 다가선다. 붉은색 절벽이 중국의 시인 소동파가 노닐던 적벽강(赤壁江)과 같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내가 본 적벽강은 절벽보다는 암반이 더 놀랍다. 넓고 납작한 판석이 수십 개의 층을 이룬 갯바닥, 금방 공사현장에서 버무린 듯한 자갈과 진흙 비빔층, 정성스럽게 빚어 올려 맨 위에 조개를 장식한 케이크층 등 신기한 지질지형이 널려있다.
기자는 마치 7000만년 전의 공룡이 된 기분으로 이 엄청난 지층을 걷는다. 구들장처럼 평편한 암반은 금방 물이 빠져 매끈하게 빛나고, 바다 쪽으로 거칠게 주름잡힌 갯바위에는 틈마다 굴, 홍합, 따개비 등의 어패류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미역줄기와 파래 비슷한 해조류도 출렁거리고 있다. 갯바위 끝에 줄지어 앉은 괭이갈매기들이 그 음식들에 손 대지 말라는 듯 나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공룡시대 영화세트’같은 적벽강의 기다란 모서리를 한참 돌아서 이제 채석강이 바라보이는 격포로 들어선다.
격포에서 1박을 하며 백합탕과 백합전, 백합초무침, 그리고 은박지에 싸서 구운 백합구이를 먹었다. 아침은 노란 바지락죽을 먹었다. 각종 해산물, 젓갈, 정식 등 변산의 맛을 골고루 보려면 몇날며칠을 보내야 한다.
◇ 채석강-상록해수욕장-솔섬 7.2㎞ “아기섬 솔섬에 서해안 최고의 낙조풍경”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파도 철썩이는 채석강(彩石江)에 나갔다. 중국의 시인 이태백이 강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중국의 채석강과 닮았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발음이 ‘책’과 비슷하고, 절벽의 퇴적층이 수만 권의 책을 쌓아둔 모습이라 책석강(冊石江)으로 불러도 좋을 지형이다.
손톱 높이의 한 층 한 층이 쌓여 수십 미터의 절벽이 되었으니 얼마나 장구한 세월에 걸친 퇴적이고, 호수 밑에서 잠자던 퇴적층이 솟아올랐다니 어떤 힘이 이 거대한 땅을 밀어올렸는지, 이후 현재의 깎이고 쪼개지고 구멍 난 겉면이 드러날 때까지 얼마나 모진 비바람과 파도에 시달렸을지 상상에 상상을 더해보지만, 상상되지 않는다.
채석강 절벽의 바위 틈틈에 박혀 자라는 저 풀이 혹시 변산향유 아닌지 카메라를 당겨본다. 내변산의 꽃이 변산바람꽃이라면 외변산의 꽃은 변산향유다. 변산바람꽃처럼 변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학명(Elsholtzia byeonsanensis)에 변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몸 전체에 향기로운 기름성분(香油)이 있고, 가을에 연보랏빛 꽃이 총총하게 핀다. 여기서 사라지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꽃이니 얼마나 귀한 보물꽃인가!
채석강을 뺑 둘러 나오면 격포항이다. 격포항의 채석강 반대편 절벽도 지질공원으로, 바다끝 절벽까지 기다란 교량-관찰로가 나 있다. 퇴적층을 설명하는 해설판을 들여다보지만, 내용이 어렵다. 의사끼리만 통하는 의학용어를 보는 것 같다. 한자와 영어를 순우리말로 옮겨 쉽게 해설해 주기 바란다.
고만고만한 배들이 빽빽히 정박한 선창가에 아침햇살이 비쳐 배도 빛나고 바다도 반짝거린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포장마차를 슬쩍 들여다보니 까무잡잡한 뱃사람과 노동자들이 식사 중이다. 큰 유리컵에 소주를 콸콸 부으면서.
격포항의 끝 해넘이공원에서 얕은 산의 임도를 넘어, ‘이순신장군 영화세트장’을 둘러보고, 궁항 방향으로 간다. 이 주변에 정확한 길 안내가 필요하다. 어떤 갈림길에 표지가 없어 해변으로 나가 높은 갯바위를 올라섰으나 군부대 철조망에 막혀 되돌아와야 했다.
궁항마을을 지나 상록해수욕장까지는, 바닷가를 내려다보는 풍경은 좋지만, 걷기에는 좀 지루한 아스팔트 도로다. 상록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유럽풍의 리조트 건물이 멋지다. 그 건물의 전면을 차지한 제빵점의 내부가 “맛있게” 들여다보인다. 지나가는 참새를 불러들이는 방앗간이다. 들어가보니 빵과 커피값은 착하지 않지만, 바다를 바라보는 테라스에서 멍 때리는 댓가로는 착한 값이다.
상록해수욕장 입구에 갯벌체험장이 있다. 장화, 호미, 바구니를 대여받고 세면장을 이용할 수 있다. 긴 백사장 끝에서 야산을 넘으면 작은 백사장(언포 해수욕장)이 나오고, 그 끝에 드디어 솔섬이 보인다. 솔섬에 다가서는 풍경은 이국적이다. 바다쪽은 파란 하늘과 노란 모래밭, 길에는 분홍 갯메꽃과 붉은 해당화, 육지쪽은 초록 나무들과 예쁜 펜션들, 그런 풍경의 끝에 인형의 섬같은 솔섬이 있다.
솔섬은 정말 손바닥만한 섬이다. ‘아기 섬’ 위에 10그루쯤 되는 소나무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은, 아기 강아지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모여있는 것처럼 평화롭고 따듯하다. 저렇게 낮은 섬에 태풍이 몰아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부터 든다.
솔섬은 그 뒤로 떨어지는 낙조와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으로, 낙조가 유명한 변산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뷰 포인트다. 마실길 4코스 종점인 이곳에서 걷기를 끝내고, 도로로 나가다 뒤돌아보니 솔섬은 바다에 띄운 분재다. 돛이라도 달아주면 어디론가 떠날 솔선(船)이다.
솔섬 남쪽으로 나머지 28㎞의 마실길은 아껴놓았다 걷기로 했다. 젓갈과 염전이 유명한 곰소항과 흰발농게를 볼 수 있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이 그곳에 있다. ‘바다 마실’ 삼아서 섬마을 풍경이 많이 남아있는 위도도 가보아야 한다. 위도는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이상향으로 삼은 율도국으로 알려져 있다. 격포항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려 도착하면 섬을 일주하는 버스투어도 있고, 바다와 섬을 조망하는 산행코스도 여러 개 있다.
변산 마실길은 서해랑길, 국립공원 탐방로, 국가지질공원의 지오트레일과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길은 같은데, 길의 종류에 따라 안내판과 이정표가 가지각색이고, 중복도 많으며, 관리를 더 잘해야 할 장소도 있다. 하나의 기관이 관리하는 것처럼 잘 정리된 트레일로 운영되기 바란다.
동해의 해파랑길(750㎞), 남해의 남파랑길(1470㎞), 서해의 서해랑길(1800㎞), 그리고 DMZ길을 곧 추가하여 국토의 가장자리를 완전히 연결하는 4500㎞의 코리아둘레길이 완성된다고 한다. 각 지자체들이 열띤 고객유치 경쟁을 할 것이다.
마실길은 고향의 길이다. 큰 관광시설이나 화려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소소한 풍경과 향토적인 문화, 집밥 같은 음식과 정성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기 바란다. 그 이름도 정겨운 변산 마실길이 가장 가고픈 둘레길로 이름나기를 기대한다.
stone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