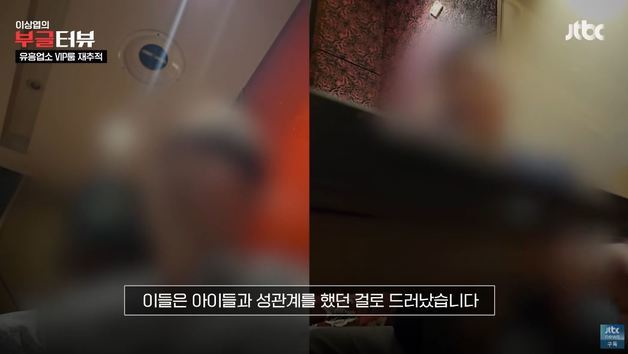학고재, 엄정순·딩이·시오타 한중일 3인전…'잃어버린 줄 알았어!'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 기획…10월 5일까지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학고재는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을 맞아 오는 10월 5일까지 전관에서 한국 작가 엄정순, 중국 작가 딩 이, 일본 작가 시오타 치하루가 참여하는 '잃어버린 줄 알았어!'를 개최한다.
전시는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자 미술이론가인 이용우 중국 상하이 통지대 교수와 왕리인 독립 큐레이터가 공동 기획했다.
세 작가의 공통점은 인간이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매우 암시적이지만 도피할 수 없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실천을 주제로 한다는 점이다.
딩 이는 1986년부터 수학적 기호를 연상케 하는 십자(+)와 격자(x)를 표현 매체로 설정해 중국 현대미술사에서 기하학적 추상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문화혁명 이후 1980년대부터 급속하게 등장한 아방가르드 운동의 실천적 1세대에 해당하는 그는 당시 신세대 현대미술가들이 문호 개방과 더불어 서구 현대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거나, 반대로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다시 들여다보고 '중국성'을 재발견하는 데 집중한 것과 달리 둘 다에 거리를 뒀다.
오히려 모두가 더 크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설 때 딩 이는 하찮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수학기호와 같은 '+'와 'x'를 활용해 추상회화를 시작했다. 모두가 거대한 '의미'를 찾던 시대에 '무의미'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역설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시오타 치하루는 1996년부터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퍼포먼스와 실을 사용하는 작업을 했다.
붉은색, 검은색, 흰색 등의 실이나 호스를 활용하는 그의 설치작품은 작품이 놓이는 공간에 대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실을 활용한 그의 설치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품들은 열쇠, 창틀, 헌 옷, 신발, 보트, 여행 가방, 플라스틱 튜브와 같은 일상적이면서 예술가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기억과 연결된 구체적 물건들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색상과 소재는 중요한 암시적 요소이며, 이런 소품들 가운데는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 피 색깔의 실이나 소품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
엄정순은 관람객에게 작품을 만질 수 있도록 권유하면서 자신이 설정한 주제로 참여를 유도한다. 가령 시각장애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지도록 해 코끼리를 보게 하는 식이다.
예술이 소수자들을 돕고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성은 절대적이며,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또한 예술의 사회적 동의나 참여와 관계있다.
엄정순이 자주 언급하는 사회적 포용성이란 관용이나 양보와 같은 겸양의 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약자와 그들의 삶과 연결된 제도적 장치와 참여의 문제이다.
그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소수자들의 세계를 위해 행하는 예술적 실천이나 전문적 연구는 가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인 셈이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