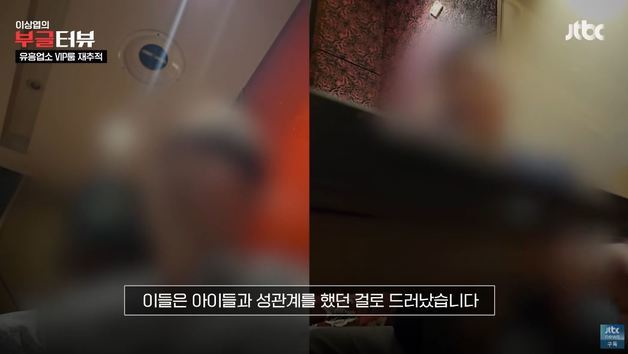[임용한의 역사 크루즈] '댐 버스터'와 가이 깁슨 그리고 혐오
물수제비 폭탄
(서울=뉴스1) 임용한 KJ인문경영연구원 대표 = 필자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다. 당시 나는 역사책을 좋아해서 구할 수 있는 이야기책은 다 찾아서 읽었다. 당시에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도 아마도 발간되지 않았던 시대였다.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이 없어서 역사소설도 마다하지 않고 역사를 소재로 한 책은 구할 수 있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수십 권짜리 시리즈물을 발견했는데, 2차세계대전의 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였다. 그중에 1943년 5월16일, 영국 공군의 루르 지역 댐 공습을 다룬 이야기도 있었다.
루르 지역은 독일 최대의 공업지역이다. 당연히 연합군 공습의 제1목표였다. 댐은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했다. 댐을 파괴하여 전력 생산을 끊고, 홍수를 일으키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댐을 파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단 일반 폭탄은 댐을 맞히기도 어렵고 맞힌다고 해도 댐의 좁은 상층부를 때릴 뿐이다. 괜찮은 방법은 어뢰였다. 댐이 중간, 하단에 구멍을 내면 구멍으로 물이 터져 나오면 댐이 붕괴한다. 하지만 독일도 이런 방법을 예상해서 호수에 그물을 쳐 두었다.
이때 반스 윌리스라는 도전적인 항공 엔지니어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낸다. 원통형 폭탄을 만들어 물수제비 놀이 하듯이 수면에 떨어트린다. 그러면 원통 폭탄이 통통 튀면서 그물을 건너뛴다. 댐 벽에 부딪혀 가라앉아서 일정 수압이 되면 폭발한다.
이 폭탄을 도약폭탄이라고 했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물수제비 놀이도 손에 꼭 맞고 무게도 적당한 납작한 돌을 고르고, 적절한 각도와 힘으로 던져야 제대로 튄다. 폭격기에서 폭탄을 던져 튀게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만화 같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것은 생략한다. 영국 공군은 이 폭탄을 던질 엘리트 승무원을 선발하고 훈련했다. 3월에 이 특수임무를 위해 617 항공대대를 조직하고 승무원을 편성했다. 대장은 24세의 가이 깁슨 중령으로 당시 24세의 잘생긴 젊은이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발한 작전은 성공한다. 19대의 폭격기가 출동해 8대가 추락했지만 댐 2개를 폭파했고, 하나에 경미한 손상을 입혔다. 이 이야기는 1955년 '댐 버스터'(The Dam Busters)란 이름의 영화로도 제작되는 등, 인기 있는 전쟁 다큐멘터리 소재가 됐다.
다시 필자의 추억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가 너무 기발해서 책을 읽은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때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단 한 명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친했던 친구들이 내게 화를 내기까지 했다. "네가 이렇게 뻥이 심한 녀석인 줄 몰랐다." 또 다른 친우들은 도와줄 수는 없고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식 밖의 이야기는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 '자신의 얄팍한 지식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 이런 자세만 견지해도 보통 이상의 인재가 될 수 있다.'
그 후에 영화 '댐 버스터'가 TV에서 방영되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펄쩍펄쩍 뛰었다. 그 친구들에게 당장 뛰어가서 말해주고 싶었지만,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중학교 친구들과는 다 헤어져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교훈과 강인함을 주었기에 그 친구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댐 버스터' 관련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작전 성공 후에 깁슨 중령은 영웅이 되었고, 617항공대대는 댐버스터라는 별명을 얻었다. 영웅이 된 깁슨은 전쟁 중인 1944년에 개전초부터 그때까지 폭격기 조종사로서의 전투 경험을 잡지에 연재했다. 이 책은 1946년에 출간되었는데, 약 80년 만에 한국 서점에 등장한 것이다.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당장 사서 단숨에 읽었다.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 좀 의아했는데, 댐 버스터 작전에 한정된 회고록이 아니었다. 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부터 44년까지 깁슨 중령은 170회가 넘는 폭격임무를 수행했다. 그가 겪은 무수한 작전, 자신과 동료들의 애환, 폭격 전술, 공중전의 요령까지 그의 전쟁 경험을 집대성한 회고록이었다. 댐 버스터 작전 이야기는 10%도 되지 않았다.
준비 안 된 전쟁
이제 물수제비 폭탄은 잊고, 새로운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 2차 세계대전사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은 영국의 대표적인 폭격기라고 하면 4발 엔진의 랭커스터나 모스키토를 떠올릴 것이다. 전쟁 영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진짜 폭격기 랭커스터가 실전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42년이 되어서였다. 개전 초에 영국 공군의 주력 폭격기는 이름도 낯선 햄덴(Hampden)이었다.
전투기에 폭격기 머리만 잘라 붙인 듯한 이 가냘픈 폭격기는 2차세계 대전이란 거대한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 최대 적재 중량은 간신히 1톤이었다. 랭커스터의 1/3이다.
당시 폭격기의 명중률은 형편없었다. 그것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명중률이 과연 몇 %일까? 다시 말하면 지상에 어떤 크기의 목표물이 있다고 할 때, 그 목표물에 유효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헴덴 몇 대가 몇 발의 폭탄을 어떤 고도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밀도로 떨어트려야 하는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
이 질문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목표물의 종류가 무수히 많다. 공장, 철도, 터널, 전함, 포대, 비행장, 무기고, 다리, 정유탱크, 크기도 다양하고, 파괴 방법도 가지가지다. 여기에 구름과 안개, 바람, 적의 전투기와 대공포, 기체 고장이 방해를 한다. 폭탄을 떨어트리는 방법도 폭격수가 손으로 걸쇠를 제거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1초만 지체해도 폭탄은 목표에서 한참 벗어난다.
깁슨의 회고에 의하면 개전 초에 공군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폭격기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조차도 몰랐다. 다음 질문은 더 진지하고 구체적이다. 고공폭격을 하면 폭격기의 희생이 줄어든다. 그러나 명중률은 형편없어진다. 저공폭격을 하면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희생이 급증한다. 전쟁이라는 큰 틀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전쟁을 끝내기에 유리한가? 다시 말하면 적의 목표물이 남김없이 파괴되는 시점과 아군 폭격기나 조종사가 전멸하는 시점이 고공폭격이냐 저공폭격이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똑같은 질문이 주간 폭격과 야간 폭격의 딜레마에도 적용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이 질문에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 실은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도 답이 없었다. 이런 사정은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안 해본 나라도 아니다. 1차 세계 대전의 경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을 대비한다는 건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중지할 수도, 답을 내려는 노력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 계속되었다. 치열한 전쟁, 매번 10%는 돌아오지 못하는 출격은 매번이 도전이었고 실험이었다. 깁슨이 처음 소속했던 비행대는 1년이 지나자 깁슨 한 명만 남았다. 약간의 생존자는 적지에 추락해서 포로수용소에 갇힌 승무원들이었다.
무의미한 죽음이었을까? 아니다. 전쟁은 이토록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불확실한 성과를 한 땀 한 땀 쌓아가는 피의 작업이다. 게임체인저, 이 한 번으로 끝낸다? 이런 건 없다. 댐 버스터도 그런 초인적인 노력과 희생을 했지만 성과는 3개월의 정전이었다. 물론 그 3개월의 정전이 독일군의 전쟁 수행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종전을 몇 시간, 몇 분이나 앞당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방구석 여포들에게 말하고 싶다
깁슨이 런던으로 휴가를 갔다. 갑자기 공습이 시작되어 방공호로 갔다. 그때 어떤 여인이 소리쳤다. "당신 전선에서 싸우지 않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깁슨은 방공호를 포기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거리를 걸었다. 방공호로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았다. 그는 수백 번의 사선을 넘었고, 83비행대의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종사들은 임무에서 귀환하면 맥주바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곤 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찬다. "전쟁 중에 뭐 하는 짓들이야!" 그들 대부분의 생명이 이틀에서 1년이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았을까? 불사신 깁슨조차도 죽음의 덫을 피하지 못했다. 종전 직전에 그는 전사했다. 댐 공격에 참여했던 동료 승무원들도 거의 전사했다.
깁슨이 전쟁 중에도 이런 글을 잡지에 기고한 데는 자신과 동료들이 겪었던 이런 억울함도 원인이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판단하는 경향은 인류 공통의 특성인지도 모른다. 요즘 전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 혐오라고 한다. 혐오의 이유는 옆의 세상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사회가 다원화하고, 직업이 많아지고,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혐오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허해지려는 노력, 나의 상식 밖의 세계에 대한 태도 교육과 계몽이 더욱 절실하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뉴스1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yhkmyy@hanmail.ne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