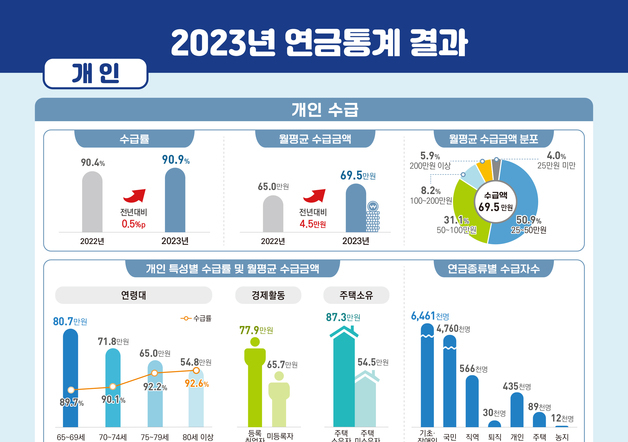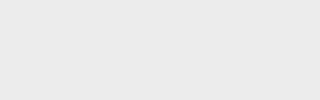
[전호제의 먹거리 이야기] '그 많던 대구는 어디로 갔을까'

(서울=뉴스1) 전호제 셰프 = 삼면이 바다지만 요즘 들어 시장에 가면 먹을 만한 생선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도 예전에 명태, 대구, 오징어, 고등어는 계절마다 적당한 가격에 나오곤 했다.
어릴 적 다니던 시장의 생선가게에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냉동 대구가 꽤 많았다. 대구를 주문하면 생선 장수는 반 꽁꽁 언 대구를 동그란 나무 도마에서 토막 내고 하얀 비닐에 한 번, 검은 비닐에 한 번 더 싸주곤 했다
대구매운탕은 살이 많았다. 커다란 결대로 부서지던 생선살은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어릴 때라 곤이와 간의 맛은 미처 즐기지 못했다.
미국 요리학교에 가서 내가 알던 대구가 훨씬 크고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걸 알았다. 우리에게는 먼 바다인 대서양에서 나오는 대구(Atlantic Cod)였다. 우리가 보는 대구보다 크기도 무게도 많이 나가는 대형 어종이다.
대구의 저장 방법은 다양했다. 소금에 절여 저장기간을 늘려 선원들의 식량으로 사용되기도, 염장 대신 머리를 자르고 통으로 건조하기도 했다.
특히 염장대구는 대구의 식감을 쫄깃하게 만들어 준다. 생대구는 익히면 바로 결대로 쉽게 부서지는 것과 다르다.
염장대구 맛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타파스로 맛볼 수 있었다. 한 입 거리 음식으로 누구나 가게 안에 들어가서 즐길 수 있었다. 좀 더 지방 느낌을 주고 식감이 있었다. 이때 대구를 좀 더 먹어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부드럽기만 한 대구는 소금 속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감칠맛과 식감이 좋아진다고 한다. 비유하자면 일반적인 돼지뒷다리가 오랜 염장숙성을 통해 고급 햄인 프로슈토로 변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염장대구를 즐기는 나라는 북대서양을 공유하는 나라들로 다양하다.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에서 각 지역의 기후에 맞게 가공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고가인 데다 수요가 적어 맛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주한노르웨이 대사관에서도 자국 음식을 매해 50㎏ 정도 저장한다고 대사 부인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기사를 읽었다.
대구를 둘러싼 분쟁은 상당히 격한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영국과 아이슬란드는 1950년대부터 1976년까지 대구를 포함한 어업권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을 대구전쟁(Cod War)라고 한다.
아이슬란드는 냉전 시절 러시아 영향력이 북대서양으로 통하는 관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구 어업을 위한 영유권을 지켜냈다.
아이슬란드는 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이후로 대서양대구는 이미 남획으로 어획량이 줄고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예전의 저장고는 기념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 많다고 한다.
덕분에 대구는 좀 더 비싼 생선이 되었다. 대구가 주었던 풍요는 한계에 이르렀다. 평화와 복지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북대서양에서 벌어진 분쟁을 보면 인간의 생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생각도 든다.
고단한 12월을 보내는 요즘 시원한 대구탕이 생각난다. 그나저나 그 많던 대구가 돌아오기나 할까 궁금해진다.
shef73@daum.ne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