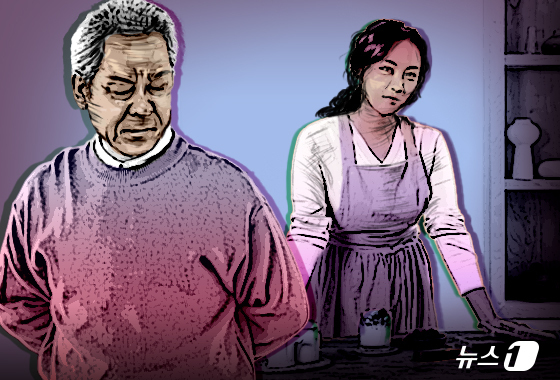국내 플랫폼 옥죄기 "이러다 해외 AI 속국된다"[손엄지의 IT살롱]
유럽·중국·미국 등 '데이터 주권' 확보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제정
글로벌 빅테크 AI에 종속…"국내 플랫폼사에 힘 실어줘야"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세종대왕 치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글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빌려 소통했다. 말과 글이 달라 뜻이 통하지 않으니 정인지는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넣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를 어여삐 여긴 세종대왕은 1443년 한글을 창제했다. 대부분의 글은 집단사회에서 사용하던 체계를 다듬어 발전했으나 한글만은 인위적으로 발명됐다. 배우기 쉽고 창제 원리가 과학적이다 보니 문맹퇴치사업에 기여한 개인(단체포함)에게 유네스코는 세종대왕 문해상을 준다.
지금은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대한 유산이지만 한글 탄생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중국 문물과 학문을 선진으로 여겼던 신하들 반대가 거셌다. 한자와 이질적인 소리글자는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지게 만들어 우리 문화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글 600년 역사는 원숙하고 고도화된 문화의 원천이 되며 말과 글이 통해야 뜻을 펼 수 있다는 세종대왕 말이 맞음을 증명했다.
지금까지 한자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상상만 해도 속이 쓰리다. K-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제는 서구권에서도 한국어와 한글은 쿨한 문화의 아이콘이 됐다.
이제 정보기술(IT) 업계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인공지능(AI)이 미래 산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아 언어화하는 게 중요해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국 데이터가 다른 나라 기술에 종속되면 디지털 속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규제하는 데이터 보호 규제(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역시 2017년 네트워크 보안법을 통해 중국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020년 미국은 자국 클라우드 기업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클라우드법(CLOUD Act)을 제정했다.
세계 각국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뒤처진다.
중국의 한자가 최고라며 상소문을 올렸던 신하들처럼 해외 빅테크 기술력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지원하고 있다. 반면 이들을 견제하고 국산 기술을 잉태해야할 국내 플랫폼 기업은 규제 늪에 빠져있다.
디지털 언어 속국 위기에 몰린 현재 상황을 본다면 세종대왕께서도 노할 일이다.
유튜브 뮤직, 넷플릭스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국내 이용자들의 취향 정보를 쓸어가고 있다. 내수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AI 생태계가 무르익으려면 디지털 주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호소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귀를 막고 있다.
뉴스 유통과 기업 독·과점을 견제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내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차별이 오히려 해외 빅테크 기업 배만 물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다음달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디지털 안전관련 3법의 적용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관련 논의 결과가 나오면 플랫폼 기업의 사전규제는 더욱 강해진다.
범용 인공지능(AGI) 구현 얘기가 오가는데 국내 기업들은 기술에 써야할 힘을 불필요한 견제에 뺏기고 있다.
AI는 한 번 뒤처지면 전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게 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팔다리를 규제로 묶고 모든 기술의 뿌리가 글로벌 빅테크 AI 위에 만들어진다면 우리만의 디지털 언어를 가질 수 없다. 말과 글이 달라 뜻이 통하지 않는데도 한자를 음차하던 과거의 어려움을 디지털 시대에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AI 초격차 확보.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종속이 아닌 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플랫폼사에 힘을 실어 줄때다.
e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