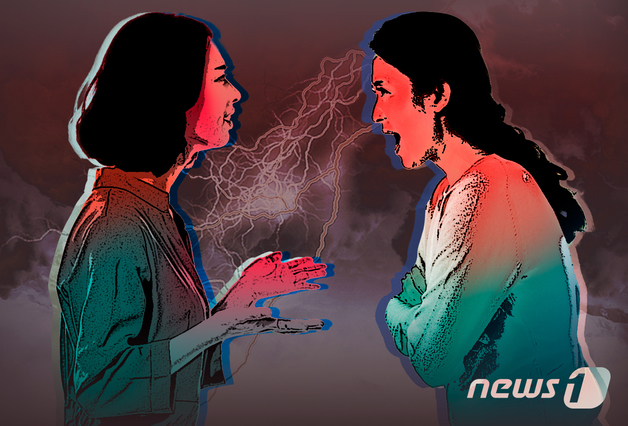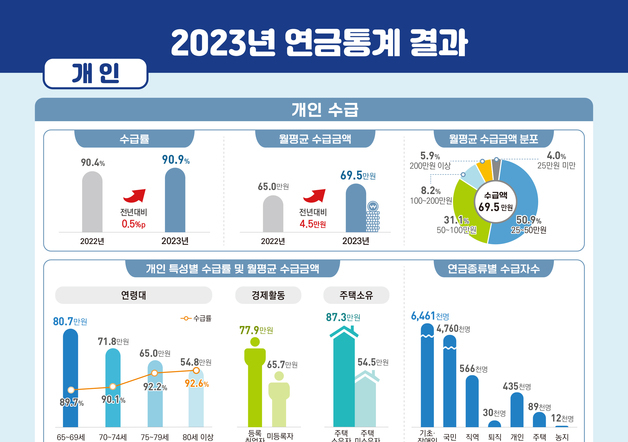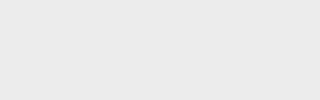
"모르는 사람만 줄세우기"…'선착순 룰' 깬 디지털 '원격줄서기'
매장 대기 서비스 '테이블링'…'원격 줄서기' 정보 격차
전문가 "격차 해소 위한 1:1 디지털 교육 활성화해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유명 국수집 앞, '줄서기'용 태블릿 기기는 24팀이 대기 중이라 안내했지만 가게 앞은 한산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렸다. 가게 앞에 도착해서야 대기 순번을 받은 10명 남짓의 중·장년층 손님들은 쌀쌀한 날씨에 연신 손을 부비며 1시간이 넘도록 차례를 기다렸다.
반면 매장 줄서기 애플리케이션(앱) '테이블링' 사용법에 익숙한 청년층 손님들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식당 안으로 입장했다. 이들은 앱의 '원격 줄서기' 기능을 이용해 미리 줄을 섰기 때문이다.

◇'원격 줄서기' 앱 테이블링…"아는 사람만 편해 씁쓸"
테이블링은 전국 각지 식당·카페 매장 앞 태블릿 기기와 앱을 통한 대기 등록 시스템을 제공한다. 올해 월간 순 이용자 수(MAU)가 95만명을 넘으며 작년 초 대비 25배 늘어났을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테이블링의 '원격 줄서기' 기능은 손님들이 식당 앞에 도착해 대기 명단을 접수할 필요 없이, 테이블링 앱으로 미리 대기 등록을 해둘 수 있는 서비스다. 원격 줄서기를 해놓으면 매장 앞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순번에 맞춰 가면 된다.
테이블링의 서비스는 업주들의 번거로움도 덜어준다. 사전 예약제가 아닌 당일 대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홀' 위주의 식당들에겐 직접 대기 명단을 관리하는 일도 수고스럽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27)는 "수기로 대기 명단을 작성할 때는 가게 앞에 나와 손님을 계속 부르거나 일일이 전화를 걸었어야 했는데, 앱이 대신 해주니 편하다"고 만족하는 의견을 전했다.
편리한 기능이지만 '디지털 취약 계층'에겐 불리한 기능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 줄서기가 당연하게 믿고있던 '선착순'의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맛집'을 방문하기 전 테이블링 앱을 반드시 확인한다는 송모씨(27·여)는 "처음 알고나서 굉장히 억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연히 매장 앞에서 등록하는 줄만 알았지, 집에서 편하게 원격으로 줄 서고 오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불편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50대 남성 김모씨는 "딸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라며 "모르는 사람은 그저 선착순만 믿으면서 기다리고, 아는 사람은 훨씬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중·장년층 중에 이 기능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원격 줄서기 앱뿐만 아니라 '캐치 테이블' 등 각종 예약 앱들도 성행하고 있다. 일부 매장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한 예약 방식만을 고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함께 디지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밀착 대면 디지털 교육 활성화해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교육 기관인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법에 대한 강좌를 제공한다. 2020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 복지관과 온라인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디지털배움터가 운영돼 서울에서만 7만4000명이 수업을 들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보다 '현장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디지털 서비스는 계속 새롭게 나올 것이고, 이런 흐름에 따라 개인이 제공받을 서비스도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면 취약 계층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낄 것"이라며 "지자체·센터 단위의 1대 1 밀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