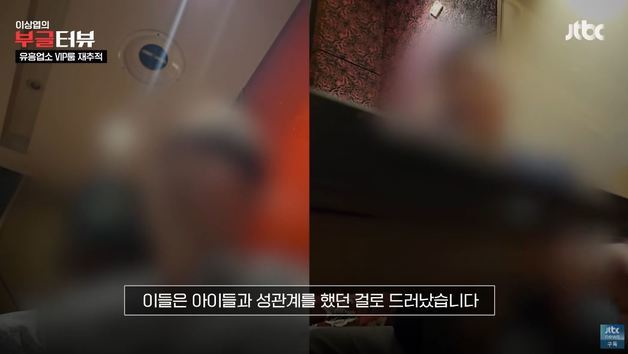'해학의 민족' 잡아먹은 '해악의 민족'…'인터넷 소통' 막은 악플문화
"악플, 문제 있지만 댓글 폐지는 극단적…댓글도 중요 정보"
전문가 "'악플과의 거리두기' 필요…악플러 강력 처벌해야"
- 정윤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요즘 기사는 댓글 기능이 막혀서 이런 댓글 못 보는데…."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가 연예 뉴스에 이어 스포츠 뉴스까지 댓글 기능을 잠정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댓글 기능을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악성 댓글(악플) 전쟁 전선을 연예 영역에 이어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했다. 선수들을 향한 일부 이용자의 악성 댓글 문제가 심각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이날부터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으며 네이버 역시 오는 27일부터 댓글 기능을 잠정 폐지한다.
이를 두고 '이참에 악플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악플러와 선플러 사이에서 양대 포털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해악의 민족'에 앞서 '해학의 민족'도 있는데
양대 포털에 댓글 기능이 도입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포털 다음에서 뉴스 댓글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는 2003년 3월이다.
당시 누리꾼들은 기사에 대해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엉덩이는 무겁지만 손가락은 누구보다 빠른이들에게 댓글 기능은 각광받았다. 학교나 놀이터, 직장이나 술자리에서만 가능했던 대화가 온라인으로도 넘어오면서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시 유행했던 댓글과 유행어 역시 '우왕ㅋ굳ㅋ', '헐', '지못미' 등 원글에 대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악의적 댓글도 존재했지만 존재감은 미미했다. 2005년 12월말까지 '악플'을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기사는 100여건에 불과했으며 기사의 주 내용은 악플의 개념·상황을 설명하거나 이를 극복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건강하게 소통했던 댓글 서비스는 비뚤어지고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는 해악의 민족이 등장하며 상처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됐다. 2005년 100여건에 불과하던 '악플' 관련 기사 건수는 2010년 3000여건을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1만 6000건으로 뛰었다.
때린 사람은 기억이 없지만 맞은 사람은 그 기억이 평생가기 마련. 남을 상처주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이들의 끄적임은 힘없고 여린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결국 가수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와 고(故) 구하라가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2019년 악플 내용이 담긴 기사 건수는 3만여건을 넘어섰다.
악플에 대한 개선 의견이 쏟아져 나오자 카카오는 악플을 향해 가장 먼저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연예뉴스에서 댓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우리도 가 보지 않은 길이라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자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올해 3월에는 네이버가, 7월에는 네이트가 연이어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10여년간 연예계에 몸담고 있는 연예인 A씨는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플(선의의 리플)도 많지만 악플이 눈에 띄는 만큼 댓글을 안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비스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도 중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술적 보강을 통해 댓글 본연의 기능인 '소통'에 주목,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고민 중이다. 네이버의 경우 앞서 5월 연예 기사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이모티콘 체계를 변경한 바있다. 이에 따라 기존 '화나요'가 사라지고 '응원해요', '놀랐어요' 등이 추가됐다. 이번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의 경우 연예 뉴스 처럼 이모티콘으로 갈음할지 등의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댓글이 중단되는 동안 기술적 해결책을 고도화하고 실효성이 담보되면 댓글 중단 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역시 지난 7일 "댓글 서비스를 자유롭게 소통하고 누군가를 응원하며,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폐지보단 방지를"…개인의 인식 개선이 우선
양대 포털은 서비스 폐지 보다는 악플 방지를 위해 힘써왔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욕설이나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이 달릴 수 없도록 조치한 것.
또 댓글 작성자의 이력을 공개하고 일정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댓글을 달 수 없게끔 하는 등 악플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띄어쓰기나 문자변형을 써서 교묘하게 시스템을 피해가는 악플러를 모두 걸러낼 수는 없는 만큼 잠정 중단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양 포털은 댓글 관련해 AI 필터링과 악성 댓글 제재 강화 등 기능·정책 면에서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앞서 실행해왔다"며 "댓글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역기능은 막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일부 악성 댓글로 인해 서비스가 폐지되는 것은 퇴보적인 현상"이라며 "악플러를 상대로 한 법적인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업계는 기술적 보강으로 건전한 공론의 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기능의 잠정적 폐지로 역기능이 사라지긴 했어도 순기능도 함께 사라졌다. 그렇다해서 순기능을 찾는 이용자들의 수요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해학과 비판의 기능을 갖췄던 댓글 기능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은 댓글 기능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 콘텐츠를 양산했다. 실제 유튜브에서 '댓글'을 검색해보면 댓글만 읽어볼 수 있는 콘텐츠가 수두룩하다.
다만 악플러 역시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주무대를 포털에서 개인 SNS계정으로 옮긴 후 이 곳으로 몰려가 키보드 뒤에 숨어 상처주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댓글 기능 잠정 폐지를 통해 개개인이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무 생각 없이 다는, 휘발성 있는 댓글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차원에서 '악플과의 거리두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100명 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64명이고 나머지는 아주 훌륭하거나,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인 만큼 악플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악플을 못달게 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생기는데, 불을 물이 막는 것 처럼 '선플달기'도 방법"이라며 "또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악플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역시 "댓글에서 또 다른 정보를 얻는 다는 점도 있지만 현재 개인을 향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은 도를 지나쳤다"며 "군중심리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만큼 플랫폼은 자체적인 정화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v_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