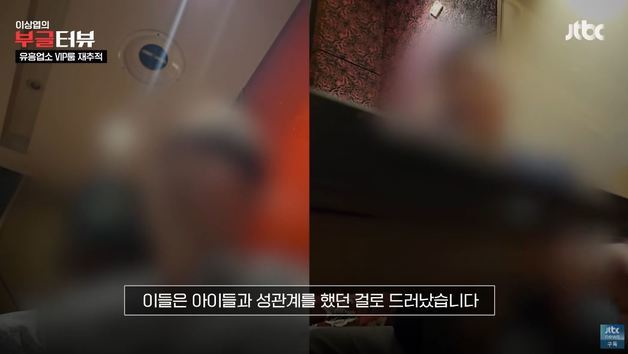"사용후 핵연료, 10만년간 땅에 묻을 안전한 방법 찾는다"
원자력연 KURT '방폐물 처분용기 부식·환경 영향' 연구
핵종 확산 흡착·저지하는 방벽 설계…심층 지하수 분석도
- 윤주영 기자
(대전=뉴스1) 윤주영 기자 =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가 포화하는 원전이 속출한다. 이를 대비해 사용후 핵연료를 지하에 묻어 10만 년 반감기 동안 보관한다는 '심층 처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찾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본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다.
심층 처분은 지하 암반을 방벽 삼아 사용후 핵연료가 발산하는 고열,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지상을 보호하는 게 목표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입증된 방식이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우리나라로선 시도해 보지 못한 방식이라 관련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120m 깊이로 실제 처분장보다는 작게 꾸려진 KURT는 이를 위한 실험실이다.
시설 내 터널을 따라 내려가자 연구원이 개발한 원통 모양의 처분 용기를 볼 수 있었다. 주철로 만든 용기 바깥을 부식에 강한 구리로 감싼 이중구조다. 오랜 시간 부식·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실제 매립할 때는 점토성 물질인 '벤토나이트'로 감싸고 그 위에 벤토나이트와 기타 암반을 섞어 만든 지붕 모양 보강재(뒤채움재)를 얹는다. 흡착성이 뛰어난 벤토나이트는 외부 지하수를 흡수, 용기 부식을 막는다.
김진섭 원자력연 책임연구원은 "유출된 핵종이 지하수에 녹아 중력을 거스르고 확산하더라도 방벽이 10만년간 이를 지연시키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 용기에 쓰일 다른 후보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도 볼 수 있었다. 520m 깊이까지 시추공을 뚫고 약 350개의 재료 시편을 내려보내 부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방벽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암반 균열, 지하수와의 상호작용도 확인해야 한다.
원자력연은 암반 균열의 위치 등을 탐색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시설 암반 곳곳에 일부러 균열을 내 충격으로 발생하는 탄성파(고주파)를 분석하는 것이다. 벽면 한쪽에는 탄성파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가 여러 개 꽂혀 있었다.
또 350m 깊이 지하수를 샘플링해 각종 화학적 상호작용도 실험 중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500m 깊이 지하수는 산소가 많이 녹아들지 않아 혐기성 미생물이 자라고 유속도 느리다"며 "이런 지하수가 벤토나이트 및 처분 용기랑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부산물이 생길지, 부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추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연은 처분 용기가 발산하는 100도 이상 고열이 환경에 미칠 영향도 실험할 예정이다. 확보한 기술은 향후 500m 깊이로 지어질 지하연구시설(URL)에서 한 번 더 검증을 거치고 고준위 방폐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26년 공사 착수를 목표로 올해 6월 부지 공모를 냈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