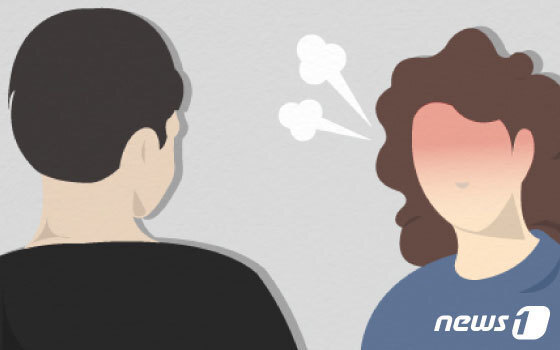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공통점은 '현장이 없다'[기자의눈]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CJ대한통운 본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CJ대한통운이 '검토 후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이번 2심을 계기로 택배·물류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하청·재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이 다시 불붙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랑봉투법 입법 취지를 법원이 또다시 인정해 준 셈이어서다.
노란봉투법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준비할 때만 해도 불법 파업 등을 저지른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법안 수정 과정에서 '노조법 개정안 2조'는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는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이 언급한 사용자의 개념을 입법화하는 내용이다. 중노위와 행정법원은 '원청(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경영계와 학계에서는 지배력·영향력 등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원청 기업을 폭넓게 사용자로 인정하면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시스템이 고도화한 현재의 산업 사회는 기업 대부분이 거미줄과 같은 N차 하청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상황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정상적인 사업영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며 영세기업 사업주들의 목을 옥죄이고 있다. 영세 사업주들은 "현장에서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치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사고의 책임을 업체 대표에게 떠넘기려고만 한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연결된 재판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겹친 택배대리점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 현장은 대리점별 택배기사 수,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로 1·2심 판결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현장의 갈등만을 촉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 입법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나가려면 현장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피고 경영계·학계의 우려를 들어야 할 때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