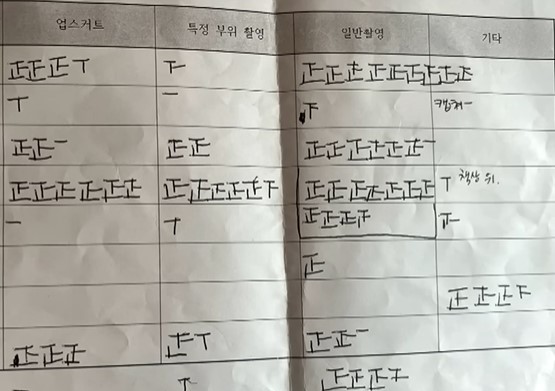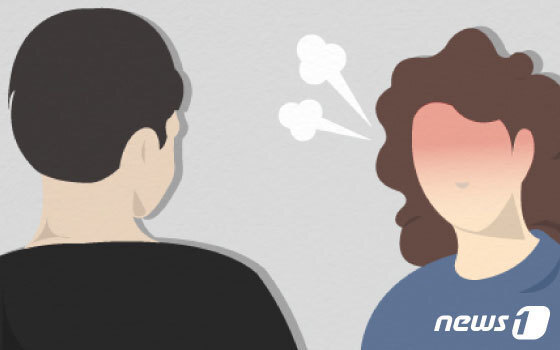"유럽과 다른 매력"…새로운 '미식 여행' 찾는다면 호주 깁스랜드로
'이민자의 나라' 답게 다양한 조리법·문화 혼합…호주만의 독특한 식문화 발달
비옥한 땅에서 만든 와인 매력 '흠뻑'…곳곳에 와이너리·양조장 위치
- 장도민 기자
(멜버른=뉴스1) 장도민 기자 = 고원 지역이면서 강과 바다, 호수, 습지, 숲 등 자연 모두 품고 있는 호주 빅토리아주 깁스랜드에선 유럽과 비슷하면서 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미식'은 가장 흔한 콘셉트다. 매월 수십, 수백만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해외 맛집을 찾아 떠나다보니 유럽이나 일본, 중국의 유명한 식당 중 한국인에게 소개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미식 여행은 떠나고 싶지만 누구나 가보고 맛봤을 법한 곳이 싫다면, 답은 '호주'가 될 수 있다.
호주의 대자연과 신선하고 풍부한 식재료가 '미식 여행지'에 최적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음식은 유럽과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재료 손질 방법부터 조리법까지 많은 점이 다르다.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이탈리아 음식인 알리오올리오 파스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마늘 위주인 것처럼 말이다.
그중에서도 호주 빅토리아주 남동해안지방인 깁스랜드(Gippsland)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아직 덜 알려진 '미식의 천국'으로 불린다.
◇"이민자의 나라답네"…한 코스에 담긴 이탈리아·프랑스·미국·중국
이민자의 나라인 호주 그 자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음식이다. 19세기부터 유럽과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의 음식 문화가 한 데 뒤섞이며 호주만의 독특한 식문화를 형성했다.
한 식당의 특정 코스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즐겨먹는 오소부코와 프랑스식 소스를 곁들인 감자요리, 중국 음식 특유의 향신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채소볶음이 담긴다. 이때 조리법은 정통 이탈리아 방식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 코스에 세계가 담긴 셈이다.
호주 빅토리아 주 멜버른에서 차로 3~4시간, 경비행기를 타고 약 45분정도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깁스랜드에선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어류를 날 것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통상적인 생각과 달리 깁스랜드에선 다양한 소스와 함께 회를 즐겨 먹는다. 페루식 날 생선 요리인 '세비체'를 여러 방식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맛 볼 수 있는 회와는 모양, 담음새, 곁들이는 식재료 등이 모두 달라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호주 셰프들은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세비체 이외에도 질 좋은 기름에 튀기거나 직화로 굽고, 와인에 졸이는 등 다양한 조리법에 호주의 식재료로 '향'을 첨가한다.
독특하면서도 거북하지 않은 이 향은 어떤 소금을 만들어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드니의 '모레나'(Morena)로 유명해진 페루 출신 알레한드로 사라비아 셰프의 멜버른 레스토랑에선 그의 노하우를 담은 소금을 따로 판매할 정도다.
다만 유럽이나 북미에서 즐겨 먹는 굴 요리는 호주에서도 날 것 그대로에 레몬즙이나 핫소스를 곁들이는 비슷한 조리법을 그대로 쓰기도 한다.
조리법과 식문화가 다양하다보니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터키식으로 먹을까?" "이탈리아 식으로 먹을까?" "미국식으로 할까?" 행복한 고민이 가능한 나라다.
◇술에 진심인 나라 '호주'
호주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만큼 여러종류의 술과 술 문화가 발달했다.
포도를 키우기 적합한 기후와 드넓은 대지에선 쉴새 없이 와인의 원재료가 생산되고 있고, 식탁에 오르며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다.
실례로 깁스랜드 메탕(Metung) 지역에서 멜버른으로 이동하면서 본 와이너리의 간판만 20여개였을 정도다.
호주에선 와인을 장기간 숙성하기보단 생산된지 4~5년 이내의 젊은 와인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호주 유명 레스토랑의 와인리스트에서는 유럽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종류·빈티지의 와인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녁 한 끼 식사에 곁들이는 와인이 비교적 젊다는 의미다.
호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품종은 샤르도네, 시라즈, 피로누아르다. 많은 와이너리들이 와인 체험과 함께 식사, 숙박까지 묶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보니 여행객이라면 한번쯤 경험해 볼만하다.
위스키나 진, 럼 등도 발달했다. 호주만의 독특한 식재료를 섞어 발효하는 여러 주류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맛과 향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깁스랜드 로크(Loch)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로크 브루어리(Loch Brewery and Distillery)에선 귤을 넣어 발효하는 숙성주와 볶은 커피를 보리·맥아와 함께 발효한 맥주 등 색다른 주류를 맛 볼 수 있다.
j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