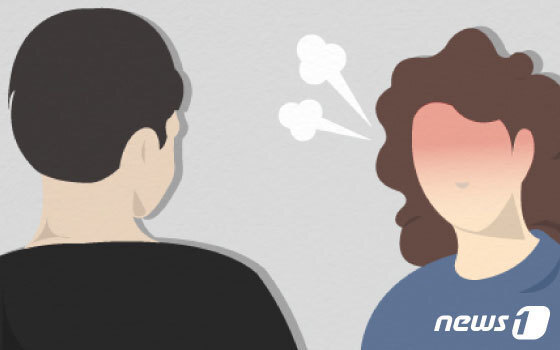[김화진 칼럼] ‘금융의 삼성전자’ 다시 생각해 볼 때

(서울=뉴스1)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금융상품의 하나로 할부판매를 든다. 할부판매는 금융상품이 발달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할부판매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1853년에 설립된 미국의 재봉틀회사 싱어(Singer)가 본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싱어는 뉴욕에서 설립되고 뉴저지의 엘리자베스에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은 본부가 테네시주 내슈빌 부근에 있다.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도 공장을 냈었다. 1908년 뉴욕 맨해튼에 47층짜리 사옥을 지었을 때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지금의 월드트레이드센터가 있는 구역이다.
당시 재봉틀은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수요자가 쉽게 구입할 수 없었다. 주로 현금거래를 하던 상관행 때문에 널리 판매되지도 못했다. 이를 할부판매 기법이 해결해 줌으로써 미국 여성들을 가사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다른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졌다. 더 중요한 것은 할부판매라는 금융상품이 재봉틀을 포함한 산업생산용 물건의 구매에 활용되어서 할부판매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못했을 생산을 촉발했다는 점이다. 재봉틀 자체의 생산 증가와 재봉틀을 사용한 제품(주로 의류)의 생산 증가다.
이렇게 금융혁신은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경제의 부가가치는 분배가 잘 되기만 하면 분쟁의 감소, 인권의 신장,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된다. 할부판매로 판매자에게 발생한 부담은 채권의 양도를 통해 경감될 수 있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채권의 증권화(Securitization)라는 또 다른 금융혁신을 통해 더 경감되었다.
‘메인스트리트’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역할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 옛날부터 그랬다. 자신들은 자동차를 만들고 공장을 지으면서 산업현장에서 땀을 흘리지만 금융계 사람들은 멋들어진 고급 옷을 입고 편안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남의 돈을 만지작거리는 것밖에 없는데 호화롭게 잘만 산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오고 공장이 문을 닫고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 결국 금융인들의 탐욕으로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생각은 정권을 바꾸기도 한다. 정말로 금융은 본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혁신의 동력도 되지 못할까?
기업의 혁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기술혁신, 조직혁신, 그리고 금융혁신이다. 구글 창업자 에릭 슈미트와 조너선 로젠버그는 고객이 뭔가를 요청할 때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혁신이 아니며 혁신은 고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기능성을 내포하고 ‘과격한’ 유용성을 구현하는 것이 혁신이다. 즉, 혁신은 새롭고 놀랄만하고 과격하게 유용한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업도 그런 혁신을 창출할 위력을 가지고 있다. 싱어 사례가 보여준다.
또 우리 인간들은 젊었을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가진 것은 많지 않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창출한 자본이 축적되어서 돈이 많아지지만 쓸 데는 줄어든다. 후자에서 전자로 자금이 흘러가게 해 주는 것도 금융의 역할이다. 젊은 인구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은 자본의 순기능을 보여준다. 로봇은 생산은 해도 자본을 축적하지는 않아서 금융 메커니즘에 도움이 안되고 그 측면에서는 인간을 따라오지 못한다.
한국의 제조업이 일제히 경쟁력을 잃어가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희망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 단계 높은 경제시스템으로 전환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금융산업의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금융업은 제조업처럼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처럼 국내 시장 국제화에 한계가 있는 지정학적 지위에서는 해외 진출 밖에는 답이 없다. 공장의 해외 진출이 아닌 사람과 소프트웨어의 해외 진출이다.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랜디스는 “금융업의 핵심은 성품과 신용으로 쌓은 인적 네트워크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약간의 이해다”라고 말했다. 금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건의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는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신용이다. 모든 금융상품은 계약서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물건은 사고팔지만 돈거래는 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의 대표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금융업의 국제화는 어렵다. 그 대신 그 장벽만 넘으면 훨씬 몸이 가볍고 빠르고 고부가가치다.
예전에 ‘금융의 삼성전자’가 화두였던 적이 있다. 삼성전자 같은 금융기관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급변하는 지정학이 한국의 제조업을 쉽게 두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대안으로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bsta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