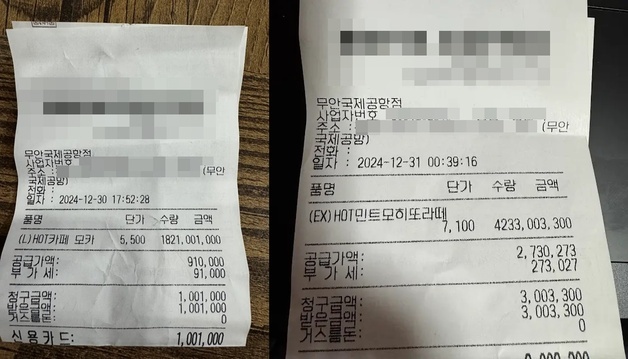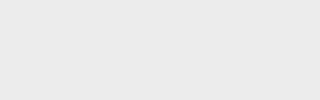
'글로벌 현안' 된 고려아연 분쟁…'중국·공급망' 키워드 조합 위력
美 석학 "中자본 포함된 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韓 정부 개입해야"
싱크탱크·정재계도 "공급망 차질"…98% 기관투자자 결정 '변수' 가능성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이 '국제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 자본을 포함하고 있는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첨단산업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면서 '중국'과 '공급망'이라는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를 동시에 건드렸기 때문이다. MBK의 공개매수 대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판단에 이러한 국내외 여론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2~4일 중 자사주 매입 또는 대항공개매수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최 회장은 외부 자금 조달 부담이 적은 자사주 매입을 우선 검토 중인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심리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자사주 매입과 대항공개매수 중 어느 쪽이 됐든 공개매수 마감일인 4일까지 팽팽한 '머니 게임'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가 33.1%를, 최윤범 회장은 현대차·한화·LG화학 등 우호세력을 합쳐 약 34%를 확보 중이다. 자사주(2.4%)를 제외한 기타주주(48.8%) 중 기관투자자 비중은 97.7%이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매수 가격과 함께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명을 달고 투자하는 입장이라 차익 실현만큼 '명분'도 중요한 의사 결정 요인이라는 것이다.
여론은 일단 고려아연 측이 앞서 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중국 매각설'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비철금속 세계 1위 업체의 중국 매각 또는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과 원자재 공급망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 정·재계는 물론 미국과 호주 등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세계적 권위자인 라피 아밋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뉴스1에 보낸 기고문에서 "중국의 대형 국부펀드가 유한책임 조합원(LP)에 포함돼 있는 MBK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데 대한 심각한 국가 안보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규제 당국이 즉시 개입해 거래의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밋 교수는 "MBK가 고려아연을 통제하면 이사회에 단기적 관점을 가져와 경영진을 교체하고 비용을 절감해 3~5년 내에 고려아연 지분을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 에너지 안보 분야 싱크탱크 SAFE는 최근 영풍·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시도를 '적대적 인수'로 규정하면서 "고려아연이 아연뿐 아니라 니켈 제련 기술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MBK의 인수 시도는 여러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고려아연을 "중국과 독립된 공급망을 구축하길 바라는 미국에 있어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면서 "회사가 중국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분쟁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김광일 MBK 부회장이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고 한 언급도 함께 다뤘다.
고려아연이 수소·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호주 정·재계도 이번 경영권 분쟁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 타운즈빌 기업협회는 "단기 수익을 좇는 사모펀드로 인해 사업 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 이목이 쏠리자 고려아연과 MBK 간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졌다. 고려아연은 WSJ 기사를 인용하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서구권과 각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MBK는 "기사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