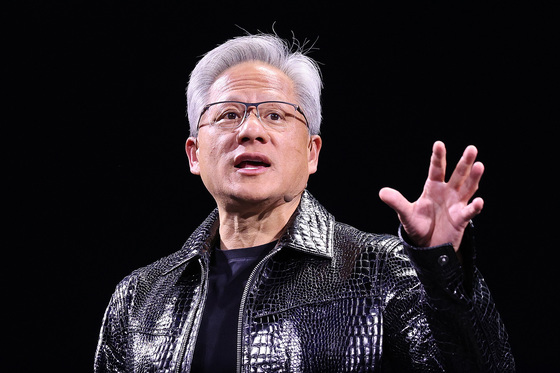'삼성 파운드리 제쳤다'는 인텔…도전받는 2위 삼성의 무기
인텔 파운드리·프로덕트 그룹 분리…작년 파운드리 매출 189억 달러
삼성, 캐파 우위 및 첨단 공정으로 대응…"외부 고객사 더욱 늘려야"
- 강태우 기자
(서울=뉴스1) 강태우 기자 =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점유율 10위권 밖이었던 인텔 파운드리가 새로운 회계방식을 통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단숨에 2위 자리에 안착했다. '이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인텔은 2일(현지 시각) 투자자 대상 웨비나(웹 세미나)에서 새로운 회계방식을 발표하며 이를 반영한 최근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손실)을 공개했다.
올해 인텔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그룹'과 제품 개발 및 설계를 맡는 '프로덕트 그룹'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회계도 사업 부문별로 나눠 집계하기로 했다.
바뀐 회계 기준으로 산출한 지난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189억1000만 달러(약 25조5758억 원)로 집계됐다. 작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이 133억 달러(17조9882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7조5000억 원가량 앞선 것이다.
특히 인텔은 올해 1.4 나노(㎚·10억분의 1m) 공정(18A) 양산을 예고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신들의 고객사임을 직접 언급했다. 거기에 펫 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공식 석상에서 잇달아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 달성' 목표를 강조하고 있어 삼성전자를 향한 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인텔보다 우위인 캐파(생산능력), 공정 기술을 앞세워 고객 수주를 늘리는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인텔에 대한 평가 관련 질문에 "특정 경쟁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판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삼성전자는 (인텔과 달리) 모바일 AP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텔 공세에 삼성전자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3나노 공정의 안정적인 생산과 함께 내년 2나노 공정 양산으로 고객사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GAA는 삼성전자가 최초 개발한 기술로 기존 핀펫(FinFET) 기술보다 반도체 전력 소모와 성능을 개선했다. GAA 2나노로 AI 칩 수주를 확대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이다.
최 사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3나노 2세대, 내년에는 2나노까지 준비 잘해서 고객사들이 만족하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객사를 밝힐 순 없지만 미국 중심의 선단 고객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상 매출로 인텔이 삼성전자를 앞서더라도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매출의 대부분(약 95%)은 자사의 PC용 CPU(중앙처리장치) 제조 등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작년 외부 고객사로부터 나온 인텔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9억5300만 달러(1조2889억 원)에 불과했다. 이를 의식해 겔싱어 CEO는 "2030년까지 외부 고객으로부터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달리 삼성전자의 내부, 외부 매출 규모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비교적 균형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파운드리는 내부의 시스템LSI는 물론 퀄컴, 테슬라 등 글로벌 고객사를 두고 있다.
또한 올해 말 가동이 예상되는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에서 캐나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의 AI 칩렛 반도체 '퀘이사'와 미국 AI 솔루션 혁신 기업 '그로크'의 4나노 AI 가속기 칩도 생산할 예정이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파운드리 사업의 본질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비즈니스로 내부 매출이 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삼성이 인텔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를 통해 매출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r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